冊 – 용서가 어려울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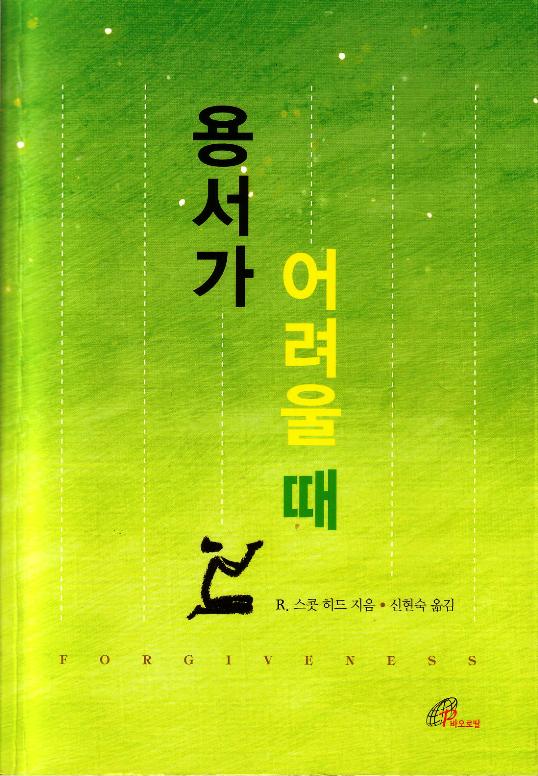 R. 스콧 허드 지음, 신현숙 옮김: ‘용서가 어려울 때’, 가볍고 쉽게 보이는 작은 책, 이미 예고 된 대로 아틀란타(도라빌) 순교자 성당을 방문하신 ‘바오로딸 수녀회’의 발랄한 수녀님들로부터 직접 ‘현찰’을 주고 산 책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수녀님들로 부터 산 책은 아마도 ‘사상 처음’일 듯해서 그것에서 나는 작은 보람을 느낀다.
R. 스콧 허드 지음, 신현숙 옮김: ‘용서가 어려울 때’, 가볍고 쉽게 보이는 작은 책, 이미 예고 된 대로 아틀란타(도라빌) 순교자 성당을 방문하신 ‘바오로딸 수녀회’의 발랄한 수녀님들로부터 직접 ‘현찰’을 주고 산 책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수녀님들로 부터 산 책은 아마도 ‘사상 처음’일 듯해서 그것에서 나는 작은 보람을 느낀다.
원서의 제목은 ‘Forgiveness: A Catholic Approach’ 로 되어있고 원저자의 이름은 R. Scott Hurd 로 나와있다. Copyright는 2011년의 원저자의 것이다. 한국어 번역판의 Copyright는 2015년, 최근 1판 10쇄 는 2018년, 그러니까 비교적 근래에 읽혀지는 ‘따끈따끈한’ 책인 듯 하다.
머리말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 워싱턴대교구의 대주교, 추기경 (Cardinal) Donald Wuerl 이 썼기에, 책은 비록 가볍게 보였어도, 내용은 비교적 신학적으로도 serious, heavyweight의 느낌을 준다.
내가 이 책에 ‘불현듯’ 손이 간 것은 몇 년 전에 겪었던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비롯되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두 ‘여자’들로부터 충격적으로 폭력성까지 느낀 일들, 그것도 ‘사랑의 집단, 성당’내에서 겪고 보니 그야말로 ‘망연자실 茫然自失’ 의 참담한 심정이었다. 한마디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라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우리도 ‘보통 사람’이 된 느낌도 없지 않았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주변에서 수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가 ‘온실’속에서 산 기분까지 들었다.
사건 초기의 충격이 사그라지면서 이제는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혔다. 일단 깊이 남은 (psychological) trauma는 세월이 해결할 듯하지만, 그 ‘두 인간들’을 앞으로 성당 공동체내에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필요이상으로 후유증이 오래 갈 듯 보였다. 이 ‘작은 책’을 사서 읽기 전까지 나는 “(1) 이성적인 정의 正義와 심판 (2) 이후 완전히 잊자! “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의나 심판이란 말이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간단하다. 두 ‘가해자’가 모두 ‘레지오 간부, 단원’들이기에 그들은 분명히 레지오의 선서규율 하에 놓인 상태였고 그것에 따라 심판을 하는 것, 이론적으로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린’후에야 의미 있는 화해나 용서가 가능한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하지만 이런 ‘심판’과정은 레지오 평의회의 ‘겁쟁이 심리’로 무산되었는데 나는 하나도 놀라지 않았다. 충분히 그들은 그런 용기가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귀찮아서, 무서워서, 소용이 없어서’ 라는 반응, 이것이 현재 레지오의 수준임을 누가 몰랐으랴?
다음 단계, ‘화해와 용서’는 글자를 보기도 무서울 정도로 몇 광년 떨어진 별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사건 이후 그 두 ‘가해자’들의 ‘전혀 부끄럼 없는 활보’를 가끔 보면서 가장 실용적인 대안은 ‘그저 잊자’ 라는 것 뿐이었다.
성경에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용서’란 말이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하게’ 느껴질까? 그들이 용서를 청하면 가능할 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로 실현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하!!! 그런데 이 ‘작은 책’에는 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용서를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지만 역시 어렵고도 어려운 주문을 받고 있기에 즐거운 독서는 절대로 아니다.
C. S. Lewis 는 “용서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누구나 생각하지만, 이는 자신에게 용서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일 뿐이다” 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진실인 모양이다. 아직도 아주 가끔 불현듯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것을 보면 2년이 지나간 지금도 나는 고통을 느끼는 듯하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상처받으며 산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고통을 준 상대를 용서하라고 한다. 그가 무슨 짓을 했든, 얼마나 여러 번 같은 짓을 반복했든, 사과를 하기는커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다시 만날 사람은 물론,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용서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과 고통을 준 당사자를 위해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이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용서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읽으면, 결국 이런 문제는 ‘하느님’ 까지 올라간다. 하느님을 위해서 용서를 하라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 괴로운 권고가 아닌가? 하지만 이런 표현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라는 뜻이 아닐까?
“용서가 치유의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최근 과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는 것이다.”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도 이롭다’… 이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주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작은 용서’를 한 후 느끼는 ‘치유의 힘’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큰 용서’에는 더 큰 편안함과 치유의 혜택이 있음은 짐작이 간다.
이 책은 분명히 ‘용서는 공평하지 않다, 그것은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힘이 드는 것이다. 이 불공평함과 일방적인 자비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결국은 ‘기도’ 밖에, 그것도 ‘끝까지 기도’, 로 귀착이 됨을 어찌 잊으랴? 문제는 어떻게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용서하게 해 달라고, 잊어버리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들이’ 먼저 용서를 청하며 다가온단 말인가?
이 책은 성서적, 신앙적, 영성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비교적 깊숙이 분석하고 해결책을 나누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행동’으로 나서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첫 걸음’을 띄는 것, 그것은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