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가 훨씬 넘어서야 비로소 ‘시’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에 대한 아주 고약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노래가사나 동요 아니면 아주 짧은 글을 보기 편하게 글로 나열한 것.. 기교적인 단어의 말 장난..그 정도였다.
나는 어린 학생시절에도 작문시간이 되면 시는 전혀 쓰지를 못했고 그걸 쓴다는 자체가 아주 우습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유일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어시험, 입시 같은 것에서 그게 가끔 나오는 것이었다. 특히 대학입시 때 국어시험에는 거의 시에 대한 문제가 나오곤 했다. 그때는 오직 정답을 찾는 ‘감’을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고작이었다. 나는 시가 아닌 산문에는 그런대로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놈’의 시를 이해 하는 데는 나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굳어져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거의 과학공상만화에만 매달리고 기계가 인간의 최고의 작품인 것처럼 인생을 준비하고 그렇게 산 편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주신 신의 선물, 예술적인 것들, 추상적인 것들, 형이상학적인 것들은 그저 안 보이는 것으로 매도하고 무시하곤 했다. 여자들과 어울리거나 사귈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정도로 이해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시인에 대한 나의 견해도 그렇게 좋지를 못하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글’을 쓰며 생활을 꾸려 나갈까 하는 것이 의아스러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Never say Never“.. 사람은 열두 번 변한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그리고 ‘나이’라는 big factor를 왜 몰랐을까? 나는 다만 그게 남보다 더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그것도 50년이나 걸린 것이다. 50이 넘어서 그 짧은 단어의 나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간단히 구체적인 것 보다, 짧고 추상적인 것이 멋있게 보이기 시작하고, 나에게 상상의 여유를 주는 것에 매료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첫 단계에 나는 무슨 시를 읽었는가? 거의 10년이 지나서 기억이 확실치는 않다. 하지만 짐작 하건 데 아마도 이것이 아니었을까? <<황동규 시선 삼남에 내리는 눈>> 이란 색갈이 바랜 오래된 시집이다.
이 시집은 거의 우연히 읽게 되었다. 왜 관심도 없는 시집에 손이 갔는지는 전혀 idea가 없다. 그래서 우연이 아닐까.. 아니면 요새 같은 생각이면 절대로 우연이 아닐 수도.. 이 시집은 사실 아내 연숙의 이화여대 대학원 영양학과 선배인 강명희씨(박사)가 연숙이를 1980년 6월 미국으로’먼저’ 보내면서 준 책이다. 그 사연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책의 표지 이면에 강명희씨의 자필로 적혀 있어서 알게 되었다.

사실 황동규 시인은 문외한인 나도 조금 보고 들은 바가 있었다. 미국유학을 목표로 공부하던 시절, 미국 유학생에 관한 기사는 열심히 보았을 것이다. 그 중에 황시인도 있었다.
그의 연보를 보면 영국유학 뒤에 Iowa주에서 유학을 한 모양이고 UC Berkeley 를 찾아가서 글을 쓴 것이 어느 잡지에 실렸던 것을 보았다. 그것이 전부다. 하지만 이미 이름을 들었으니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었다. 이 시집에서는 어느 특정한 시에 관심을 가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거부감 없이 전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조그만 사랑의 노래 — 황동규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가득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그 다음이 <<108편 사랑의 시>> 란 1974년 여성동아 12월호 부록이 있다. 이 책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된 것은 역시 십 몇 년이나 되었을까? 제목 그대로 108편의 한글로 쓰인 사랑의 시만 골라져서 실려있다.
이 시집에서 나는 정말 매혹적인, 사랑을 노래한 주옥 같은 시들을 접하게 되었다. 허영자 시인이 시를 고르고 그녀의 감상문을 일일이 적어 놓았다. 이것이 너무나 나에게는 도움이 되었다.
雪夜愁 — 구자운
눈 내리는 밤은
여자여 잠이 드렴
이끼 슬은 팔 다리의 언저리를 묻어
사랑의 눈물의 눈이 내리면
새로운 맑은 숨은 살아 오리
꿈을 꾸며 노래하는
후미진 조용한 물이랑에 실리어
애달픔은 연신 희살짓는다
어루만지는 아늑한 팔뚝에서
나른히 쉬는 외로운 오릇한 목숨
여자여 눈 내리는 밤은
가널프레 풀잎이 싹터오는데
안겨서 잠이 드렴.
내 짙은 난초 잎은
어우러져 스며들어라
눈이 사풋 사풋
아릿한 젖 언저리에 쌓인다.
은은한 복스러운 밤
비어 있는 해슬픈 맑은 항아린양
스스로이 소리 이루어
벌거숭이 몸뚱아리에 어리는 설움
눈 내리는 밤은
여자여 잠이 드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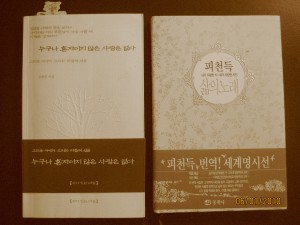
그 다음의 시집은 <<피천득 내가사랑한 시 내가 사랑한 시인 삶의 노래>> 라는 제목의 피천득 시인의 번역시집이다. 1994년에 발간이 되었고 1995년 처형부부께서 이곳 아틀란타로 여행을 하시면서 선물로 남기고 가셨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읽지를 않았다. 나중에 발견을 한 것이다.
중고교시절 국어시간을 통해서 피천득시인은 자연스레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아.. 그리고 1970년대 중앙방송의 DJ로 활약을 했던 피세영씨가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Shakespeare의 시를 접하게 되었다. 국어교과서에 실렸던 Alfred Tennyson의 시도 다시 보게 되었고 미국시인 Emily Dickenson, 또한 처음으로 일본시인의 이름도 접했다.
부서져라, 부서져라, 부서져라 — 알프레드 테니슨
부서져라 부서져라 부서져라,
차디찬 잿빛 바위 위에, 오 바다여!
솟아오르는 나의 생각을
나의 혀가 토로해 주었으면
오, 너 어부의 아이는 좋겠구나,
누이와 놀며 소리치는
만(灣)에 있는 작은 배 위에서 노래하는
오, 사공의 아이는 좋겠구나
그리고 커다란 배들은 간다
저 산 아래 항구를 항해하여
그러나 그리워라 사라진 손의 감촉
더 들을 수 없는 목소리
부서져라 부서져라 부서져라,
저 바위 아래 오, 바다여!
그러나 가버린 날의 그의 우아한 모습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리
1999년, Internet email의 덕분으로 고국의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이 되었다. 그 중에 제일 그립던 친구 양건주도 연락이 되고 email을 주고 받게 되었다. 이 친구와는 정말 오래 전에 헤어졌지만 세월의 공백도 그 순진하던 고등학교, 대학교의 사심 없던 우정으로 연결이 되었다.
항상 ‘도사’같이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고 의젓하던 친구.. 양건주 결국은 사회생활도 그 건실함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이끌고, 결혼도 우리들이 알고 있던 여성과 결혼을 하고 참 부러운 친구다. 그 친구는 말과 행동 또한 별로 다르지 않다. 사실 나는 그 친구로부터 받기만 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재진의 시집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라는 멋진 시집이었다. 건주야, 고맙다.
지나간 노래 — 김재진
지나간 노래를 들으며
지나간 시절을 생각한다
뜨거웠던 자들이 식어 가는 계절에
지나간 노래에 묻어 있는
안개 빛을 만나는 것은 아프다
너무 빨리 늙어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 보다
아프다
누군가 나를 만나며 아파야 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지나간 노래를 들으며
지나간 시절을 생각하는 것은 아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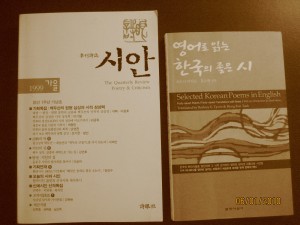
거의 20년 전에 이곳에서 알게 된 중앙고교 후배가족이 있었다. 나중에 취직이 되어서 귀국을 해서 헤어졌지만 딸들이 서로 친구라 가끔 간접적으로 소식을 접하는 그런 집이다. 그 당시 그 후배의 처남(wife의 남동생) 인 홍은택씨가 visiting scholar로 미국엘 왔는데 잠깐 들렸는데 그때 처음 만났다. 영문학전공이고 미국문학을 공부했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그가 시인임을 몰랐다. 2003년 쯤 우리 큰 딸(새로니)이 한국의 이화여대로 한 학기 공부를 하러 갔을 때 그 홍은택(교수)가 책을 딸 편에 보내왔다. 두 권인데, 하나는 <<영어로 읽는 한국의 좋은 시>> 란 시집이고, 다른 하나는 계간잡지 <<시안>>이었다.
<<영어로 읽는 한국의 좋은 시: Selected Korean Poems in English>>는 Rodney Tyson교수와 홍은택 교수가 공동 집필한 한영 번역시집이었다. 이 책을 보고 어떻게 그 언어감정의 극치를 전혀 다른 영어감정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 감탄을 하곤 했다. 저자의 한 사람이 영어권이고 다른 사람은 한국어 권이라서 그야말로 “아다리”가 맞았다고나 할까.
겨울 한강에서 — 김남조
겨울 강이여
너의 악보는 끝이 없구나
오늘은 결빙의 강바닥 아래
암청의 실타래들이 누워 있음이
무섭고 아름답다
흘러서 저기에 잠겨드는
사람 있으면 어쩌나
배 한 척 지나갔는지
물살 드러난 언저리 얼음조각 떠 있느니
아마도
탈색한 나룻배였을 게야
배에 탄 사람
삭풍에 도포자락 휘날리고
뱃전에 얼음 갈리는 소리
서걱서걱 울렸으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외치며
누군가 뒤쫓았을지도 몰라
By the Han River in Winter — Kim Nam Jo
Winter river
Your score has no finale
Today under the frozen river bed
Lie dark blue skeins of thread
Frightening and beautiful
What if a person is
Possessed and submerged there?
A boat may have passed by
As pieces of ice floated at the edges of the exposed current
Perhaps
It was a discolored ferry boat
Someone in the boat
Sleeves of his attire flapping in the north wind
And the sound of ice splitting by the sides of the boat
Crunch crunch
Someone may have run after him
shouting “Hello, hello”
계간시집 <<시안>> The Quarterly Review Poetry & Criticism, 1999년 가을호에는 바로 위에 언급한 홍은택교수의 시인등장을 알리는 시들이 실려있었다. <<제 3회 시안 신인상>>에 당선작 중에 홍교수의 시가 있었다. 4편이 실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겨울산>> 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무언가 태고 적의 전설을 연상케 한다. 또한 마치 삼국시대의 병마들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겨울산 — 홍은택
푸른 허공에 바람 길이 보인다
그 길 따라 수만의 말들이 갈기를 날리며
무리 지어 달려간다
말들이 허공에 남긴 발자국들은
아직 낮은 곳으로 내리지 못한
검은 나뭇잎으로 펄럭이고
사라져 간 길 끝자락을 부여 잡은 채
골짜기들이 마지막 숨을 몰아 쉰다
다시 이명(耳鳴)처럼 다가오는 말 발굽소리
눈을 뜨면 나뭇잎 하나 꼭 쥔 손을 슬며시
풀어놓은 마른 가지 끝에서 새 한 마리
실 끊긴 연처럼 막 허공을 날아오르는
겨울 산, 해가 기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