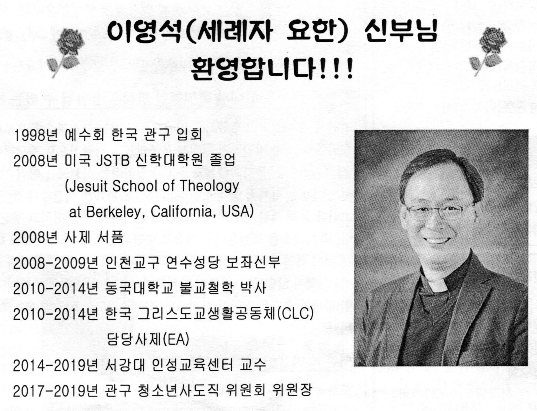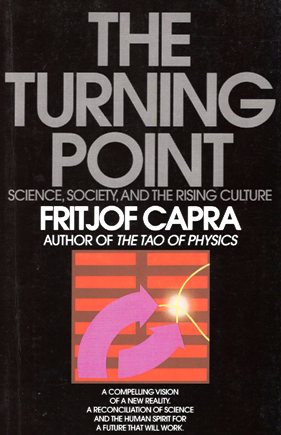 ¶ 얼마 전, 거의 40년 만에 ‘먼지 속에서’ 다시 찾게 된 책, 다시 읽게 된 , Fritjof Capra의 international bestseller, ‘名著’ The Tao of Physics (物理學의 道, 번역서: 現代物理學과 東洋思想)로 인해서 그 이후의 Capra의 ‘변모과정’을 다시 읽고 알게 되었다. 대강적인 그 과정은 물론 ‘무료’ Wikipedia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궁극적 진리를 향한 길’은 끝이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 얼마 전, 거의 40년 만에 ‘먼지 속에서’ 다시 찾게 된 책, 다시 읽게 된 , Fritjof Capra의 international bestseller, ‘名著’ The Tao of Physics (物理學의 道, 번역서: 現代物理學과 東洋思想)로 인해서 그 이후의 Capra의 ‘변모과정’을 다시 읽고 알게 되었다. 대강적인 그 과정은 물론 ‘무료’ Wikipedia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궁극적 진리를 향한 길’은 끝이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40년 전의 나와 현재의 나, 또한 그런 과정을 겪었겠지만 나는 그 긴 세월 동안 너무도 ‘쪼잔 하고, 미세한’ 영역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했다는 자책감을 금할 수가 없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보라’는 진부한 표현에 숨어있는 진정한 지혜를 왜 나는 그렇게 무시했던 것일까?
여기에 언급된 Capra의 두 번째 저서 The Turning Point를 다시 읽게 된 과정도 전에 발견했던 떼이야르 샤르댕 Teilhard Chardin의 때와 아주 흡사했다. 근래에 나를 ‘지혜중의 높은 지혜’의 방향으로 이끄는 나침반: ‘오늘의 思想 100인 100권, 역사를 움직인 100권의 철학책‘ 이 바로 그것이다. 이곳에서 나는 인류의 엄청나게 축적된 다양한 지혜에 다시 감사하며 나의 눈길을 끄는 것부터 읽는다. 세상에는 참 지혜롭고 명석하고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에 놀란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고 소화한 대한민국의 지성들을, 최소한 그들의 이름과 전문분야를 알게 되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여기 소개된 The Turning Point를 짧은 글로 소개하신 분 ‘이성범 李成範’은 놀랍게도 시인 詩人으로 나와있다. 이 ‘시인’은 Capra의 첫 bestseller 인 The Tao of Physics의 번역본 공동저자이기에 낯이 설지 않다. 하지만 시인이라는 사실은, 어쩐지 너무나 동떨어진 분야가 아닌가… 놀랍지만 이것도 즐거운 놀람의 하나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최근 최소한 지난 50년간 진행되고 있는 trend가 아닐까.. 모든 분야를 총괄적으로 보려는 노력, 이 시인도 그런 현상의 일부일 뿐이다. 현대과학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시인’, 그 계기는 잘 모르지만 참신하고 희망적인 사실이 아닐까…
************************
小論考
전환점 轉換點(1982)
The Turning Point
카프라 (Fritjof Capra 1939~ ) 著
(琴谷 금곡) 이성범 李成範 (詩人)
1
카프라 박사는 1966년에 비엔나 대학에서 이론물리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후 빠리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런던 대학 등에서 물리학 연구와 강의를 했으며, 1975년 이후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렌스 버클리 실험실 Lawrence Berkeley Laboratory에서 소립자 연구를 계속하며 강의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론물리학 교수이다. 그는 또한 The Elmwood Institute를 창설하여 여러 학문분야에서 새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을 종합하고 상호 통신하며 조직화하는 야심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그의 첫 저서인 <물리학의 道 The Tao of Physics, 拙譯 ‘現代物理學과 東洋思想’> 는 1975년에 출판되었는데, 그 후 각국어로 번역 출판돼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가 되어 있다. 이 책은 상대성이론과 양자물리학 등 현대물리학에서 밝혀진 새로운 물질관 또는 세계관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 세계관이 고대로부터의 동양의 사상들 (불교사상 음양사상 도교사상 힌두사상 등)에 담겨 있는 전일적 全一的이며 역동적인 신비사상과 어떻게 유사하며 부합하는가를 종합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 책은 미국은 물론 유럽 각국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고, 세계적인 과학자 철학자들에 의해 그 내용이 많이 인용되고 토의되고 있다.
<전환점, The Turning Point, 拙譯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은 그의 두 번째 저서로서, 1982년에 뉴욕에서 출판된 것이다. 이 책은 발간 즉시 독일과 프랑스에서 번역 출판되었고, 독일에서는 출판 직후 35주 동안 계속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2
<전환점>은 네 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1장<위기와 변형>에서는 현대의 우리 사상 속에 깊이 박혀 있는 물질적 과학적 세계관의 유래를 밝히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여러 문명의 흥망에 따른 세계관의 변천을 서술한다. 이와 동시에 현대문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현상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실제의 일면만 보는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과거 3백 년 간 너무나 오래 집착해 온 데서 기인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현대물리학에서 깨달은 새로운 세계관과 학문방법이 이제는 기타의 여러 학문 분야 (생물학 의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에 급속히 퍼져가고 있으며, 이것은 르네상스시대에 새로운 세계관과 문명의 전환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문명에 획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제2장 <두 개의 모형>에서는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와 새로운 물리학을 설명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중세의 유기체적 영적 세계관이 1500년과 1700년 사이에 어떻게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전환했는가를 ‘코페르니쿠스’를 위시하여 ‘케플러’ ‘갈릴레이’ ‘데카르트’ 등의 사상을 예시하면서 상세히 설명하고, 그 기계론적 세계관이 ‘뉴턴’에 이르러 완성되었으며 그 기계론적 세계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뉴턴’의 위대한 성공은 기타 과학의 발전을 급속히 촉진시켰고 모든 과학은 ‘뉴턴’의 수학적, 분석적, 환원주의적 방법을 답습했으며, 그 기계론적 세계관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기타의 모든 학문분야의 기저에 깔려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물리학이 전자장의 현상을 다루어야 되고 생물학에서 진화의 현상을 다루어야 됨에 이르러, 우주는 기계론적으로 단순하게 다룰 수 없는 더 복잡하고 오묘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현대 물리학은 ‘플랑크’가 1900년에 양자를 발견한 데 뒤따른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Photoelectric effect 론 과 상대성원리 Principle of Relativity에서 시작된다. 상대성이론은 ‘뉴턴’ 역학의 기본 가정이 되는 절대공간과 절대시간이 틀린 개념임을 증명했다. 시간이란 ‘뉴턴’ 또는 고전물리학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과거로부터 미래로 일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에 따라 그 동시성과 흐름이 다른 것임을 ‘아인슈타인’은 보여주었다. 또 공간도 ‘뉴턴’이 생각했던 것처럼 물체를 담고 잇는 빈 그릇과 같은 ‘유클리트’ 기하학적 균질 均質의 것이 아니라 그 담고 있는 물질의 질량에 따라 다른 곡률 曲率로 휘어져 있는 것이다. 또 우주는 질량을 가진 고체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뉴턴’은 생각했지만, 물질이란 에너지의 한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서 물질의 질량은 E=mc2(E: 에너지, m: 질량, c: 광속)의 등식에 의해서 정의되는 에너지의 양인 것이다. 또한 우주는 시공 연속체의 4차원 속에서 부단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 우주 속에는 정지해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도 ‘아인슈타인’은 보여주었다.
모든 물질의 궁극적인 구성체로 여겨진 원자를 찾아낸 물리학자들은 20세기 초반에 와서 원자의 많은 속성들을 발견하였으나, 그것은 우리들의 논리적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물리학자들은 절망에 가까운 혼란상태에 빠졌다. 드디어 ‘하이젠베르크’는 1927년에 불확정성원리 Uncertainty Principle를 완성시켜 원자현상을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게는 했으나 그것은 ‘뉴턴’이나 고전물리학의 철칙이었던 인과율을 파기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과학의 기반을 송두리째 소멸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불확정성원리가 핵심이 되는 양자역학의 해석에 대하여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간에 유명한 논전이 벌어졌다.
‘아인슈타인’은 ‘국소원인 원리’ 局所原因 原理 Principle of local causes를 주장하면서 양자물리학이 더 발전하는 어느 날엔 인과율이 원자의 세계에도 다시 적용될 것이라고 했고, ‘보어’는 불확정성원리는 자연의 기술에 있어서 부동의 원칙이며 불확정성은 관찰의 미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 본연의 속성이라고 했고, 우리의 시스템은 ‘비非국소적 연결’ Non-local connection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 후, 1964년에 ‘벨, G. S. Bell‘은 이른바 ‘벨의 정리 Bell’s Theorem‘를 발표하여 ‘보어’의 ‘비국소적 연결’을 뒷받침했다. 우리의 시스템이 ‘비국소적 연결’로 연결된 것이라면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다는 것이 되며, 이것은 우리의 세계가 기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유기체와 같다는 것을 뜻한다. 우주는 ‘뉴턴’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아니라 거대한 유기체로 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물리학에서는 물질의 개념이 바뀌어졌고 실재 實在 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인간 사고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으며, ‘인간의식’을 떠난 과학의 완전한 객관성이 성립할 수 없게 되었고, 우주는 인과율에 의해 기계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으므로 고전과학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받아질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새로운 시스템적 유기체적 우주관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제3장 <데카르트-뉴턴 사상의 영향>에서는 그 기계론적 세계관과 그 분석적 환원주의적 방법이 얼마나 뿌리 깊이 생의학 심리학 경제학 등 과학 전반에 박혀 있으며, 그 고정관념에의 수세기에 걸친 집착이 이제는 이들 학문의 발전을 얼마나 저해하게 되었으며 또 그것이 현대문명 전반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가를 지적한다.
제4장 <새로운 실재관 實在觀> 에서는 새로 대두하는 시스템적 세계관을 상세히 상술한다.
우주를 거대한 유기체로 보는 것은 우주를 거대한 기계로 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계는 활성이 없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의 구조가 기계 전체의 기능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을 가능한 한 최소의 구성단위까지 분석하고 분할하여 그 작동의 인과관계를 관찰하여야 한다. 반면 유기체는 생동하는 전체의 시스템으로서 전체와 부분이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면서 스스로의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창조적인 것이다. 기계에서는 부분의 합계가 기계 전체의 기능을 결정하지만, 유기체는 전체의 필요가 부분의 기능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주를 하나의 유기체라고 본다면, 그 안에는 무수한 수준의 유기체적 기관들이 있으며, 각 수준의 유기체들은 상호작용하고 부단한 창조활동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진 고전과학이 분석과 분할을 학문의 방법으로 한 데 반하여, 유기체적 세계관의 신 과학은 전일적 全一的 인 종합의 방법을 중요시 한다.
현대의 학문은 너무나 다기화되고 전문화되어서 학문 또는 문화 전체의 기반을 보지 못하기 쉽다. 이제 현대의 문화는 중요한 전환기에 와 있으며, 이와 같은 문화의 전환은 인류 역사상 드물게 일어나는 것이다.
3
‘카프라’ 박사는 현대문명을 종합 진단하여 그것이 중병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문화의 대두에 의한 새로운 문명의 출현을 상세히 기술하여 문명의 획기적 전환을 예언한다. 그는 무수한 과학논문을 썼고, 많은 철학적 일반강연을 했으며, 이 책 다음에는 ‘녹색 정치, Green Politics‘라는 책을 ‘샬렌 스프레트나크 Charlene Spretnak와 공저로 1984년에 출판 한 바 있다.
인류의 장래는 결정론적으로 예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카프라’ 박사의 문명전환론은 세계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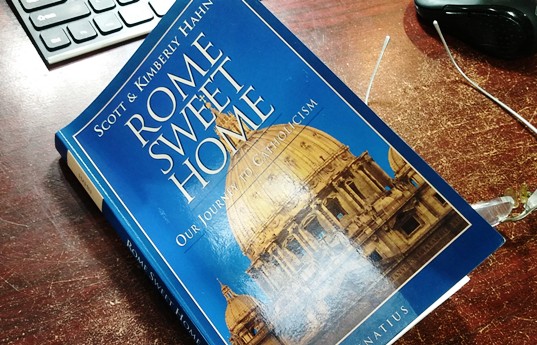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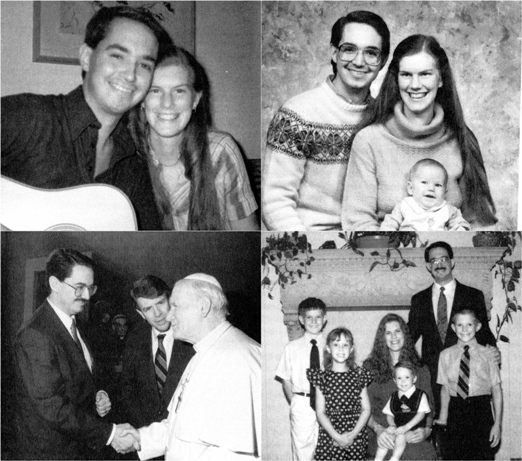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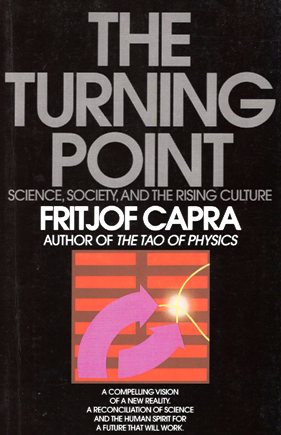 ¶ 얼마 전
¶ 얼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