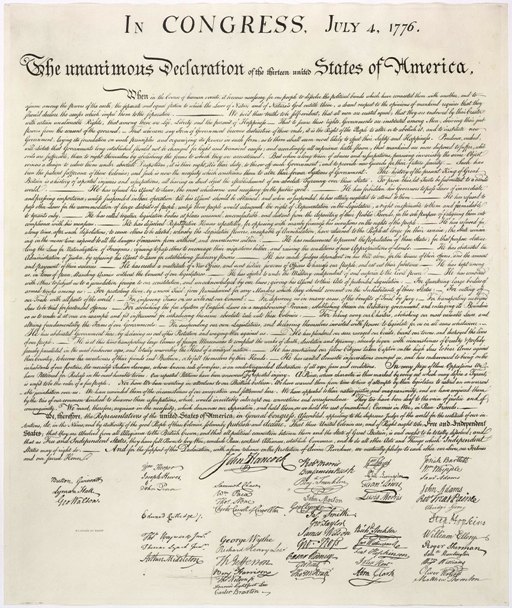7월 말, 흐린 여름날에..
¶ 서서히 길어지는 밤: 7월, 그것도 30일.. 허~~ 벌써 7월이 다 갔다는 말인가? 언제나 세월의 ‘가속도’에 놀라지만 이번은 그 중에서도 제일 빠른 느낌이다. 한 달이 거의 일주일도 안 된 느낌이 드는 것이다. 하기야 이번 7월은 나의 기억에서 정말 제일 바쁜 그런 나날들이었으니까 빠른 느낌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무언가 머릿속도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채 지나간 느낌, 점점 한가해져야 하는 이 나이에 나도 조금 이해하기가 힘 든다.
이른 아침에 밖을 쳐다보니 조금 느낌이 다르다. 확실히 아침이 전보다 조금 어두워졌다. 낮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이렇게 밤과 낮이 같아지면 또 가을이 시작되는가? 또한, 그림자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인데 오랜 만에 보는 시야였던가.. 아하! 날씨가 흐렸구나. 작열하는 햇빛이 없으니 당연히 서늘한 느낌도 들었다.
그러고 보니 한 동안 거의 매일 code Orange같은 경고가 나올 정도로 공기가 메말랐던 나날을 보낸 것이다. 한차례 시원한 소나기가 조금 그리워지는 7월말 중복이 지나가고 말복을 향한 본격적인 늙은 여름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면 다시 계절은 바뀔 것이고..
올 여름은 비교적 시원한 편이다. 비가 자주 와서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새로 설치한’ 2대의 에어컨, 이제는 하루 아침에 고장 나는 일이 없으리라는 생각에, 두 다리 쭉 뻗고 찬 공기를 만끽하니 더욱 시원한 느낌이다.
¶ 레지오 점심봉사: 지나간 주말(어제, 그제)은 아틀란타 순교자 성당 점심봉사로, 피곤하지만 보람 있는 이틀을 보냈다. 일년에 한번씩 레지오가 하는 점심식사 봉사팀에 우리가 포함되었는데 3년에 한번씩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 사실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의 봉사팀의 구성은 인원수가 워낙 적어서 (참가 3 쁘레시디움이 모두 최소한의 적은 단원을 가졌음) 신경이 쓰였는데 다행히 꾸리아에서 ‘전폭 지원‘을 해 주어서 무사히 성공리에 끝을 냈다. 또한 대부분이 자매님들인 레지오에서 이번의 봉사팀에는 의외로 형제님들이 그런대로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이날 점심은 지난 6월 우리 구역 점심봉사 때 했던 ‘모밀국수’를 했는데 그때의 경험을 100% 활용을 하였다. 물론 대부분의 모밀국수 menu idea는 연숙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모두들 열심히 협조해서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했다.
솔직히 이번의 일, 우리는 2일 거의 full-time으로 일을 한 셈인데, 역시 조금 무리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우선 우리들의 나이도 그렇고,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Moderation, moderation을 motto로 살아왔던 우리들, 이런 것들이 시험 case인가.. 한마디로 take it to the limit이란 Eagles의 노래가 생각날 정도였다. 이날 모든 일들을 마치고 귀가해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아픈 후유증을 달랬지만 역시 나이 탓인가… 쉽게 풀리지를 않는다.
¶ 1년이 가까워 오는 목요회: 7월의 마지막 목요일 밤 8시 반에 어김없이 우리 목요회 멤버들이 ‘궁상맞게’ 모였다. 다 늙은 남자 3명이 목요일 그것도 밤 8시 넘어서 외식을 한다는 것은 암만 그림을 예쁘게 그려보아도 예쁠 수가 없다. 하지만 모임은 계절을 몇 번 거듭하면서 조금씩 덜 궁상맞게, 더 예쁘게 탈바꿈을 하고 있다. 그것을 모두 같이 느끼는 것 또한 경이로운 사실이다.
작년 9월 마지막 목요일에 모였던 것이 시작이었고 언제까지 계속될 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 무언 無言 속의 표정들은 ‘아마도’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3명 모두 너무나 다른 사연과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고 풀어나가야 할 도전이 만만치 않다. 이런 모임에서 그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풀어나가는 것,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가벼운 화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로 2시간 정도를 보낸다.
살기가 너무 힘든 때에는 아무 말 못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거의 일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서로를 많이 알게 되어가고 이 모임은 확실히 우리에게 어떤 삶의 희망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디 그 뿐인가? 얼마 전부터 오랜 냉담을 풀고 귀향을 한 형제가 있었으니..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모였을 때는 이제까지 중에서 가장 즐겁고 유쾌한 그런 모임이 되었고, 1년이 되는 9월에는 모두들 ‘무언가 기념식’이라도 하자고 의견을 모으며 늦은 밤 헤어졌다. “친구들이여 우리 그날까지 열심히 삽시다!“
¶ 장례 예배: 장례, 연도 같은 연령행사가 뜸했던 요즈음 뜻하지 않은 곳에서 부음 訃音 을 듣게 되었다. 연숙의 이대 梨大 선배 김경자씨의 남편이 타계한 것이다. 이분은 1990년대 아틀란타 부동산업계의 선두주자로 잘 알려지신 분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소식이 뜸해지고 우리도 거의 잊고 살게 되었다. 지금 사는 마리에타 우리 집은 1992년 초에 이분의 소개로 사게 되었던 사연도 가지고 있다. 그 당시 집 구경을 처음 할 때 서로 만났던 McDonald’s,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인데 갈 때마다 가끔 이분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다.
이분들은 개신교 배경의 집안이라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장의사 chapel에서 해서 그곳에 다녀온 것이다. 천주교 장례미사와 너무나 차원이 다른 ‘간단한 예식’이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사실은 고인의 막내 동생이 성당에 다닌다는 사실, 전에 교리반 교사로 연숙과 같이 일했었다는 원선시오 형제였다는 사실, 이날 얼굴을 보니 사실 고인과 얼굴이 닮긴 닮았다. 나는 이 형제님을 잘 모르지만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다.
Take it to the limit – The Eagles
¶ Jim Beam & Charlie Chan: 근래에 ‘공적인 활동’이 늘어난 이후 느끼는 것은 바쁘고 보람된 일들 뒤에 ‘꼭’ 찾아오는 선물 같은 ‘심도 깊은 평화, 망중한의 텅 빈 머리’ 이것들 중에도 망중한 忙中閑의 기쁨 중에도 이 두 단어가 바로 그것들이다. 우리 집에서 있었던 구역미사를 위해서 liquor store까지 가서 사온 ‘양주’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Bourbon의 명품, Jim Beam이었다. 그때 ‘몰래’ 사온 세 가치의 cigar도 나의 기대를 자극하는 즐거움이었다. 물론 양주는 신부님 접대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실제로 거의 없어지질 않아서 그 이후 cigar와 함께 망중한의 즐거움으로 쓰였다. 사실 혼자서 즐기는 것이 되었지만 이럴 때 먼 옛날의 친구들과 어울려 마실 때를 회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 지나갔다. 모든 즐거움 들은 다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또 다른 것, Charlie Chan.. 수십 년 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TV를 보면 그 당시의 nostalgic channel 역할을 하던 channel에서 이런 류의 TV drama가 있었다. 평생에 이런 Charlie Chan이란 말 조차 못 들었는데 그 옛날 (1940년대)에 어떻게 ‘짱께’가 주인공을 나오는 TV program이 있었을까 의아하기만 했다. 그것을 요사이 Youtube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된 것이다. 요새 기준으로 보면 비록 범죄추리극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순진한 장면들 투성이..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마음 안 상하고 ‘즐길 수’있는 그런 것, 특히 편히 쉴 때 이것을 보면 마음 속 깊은 평화까지 느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