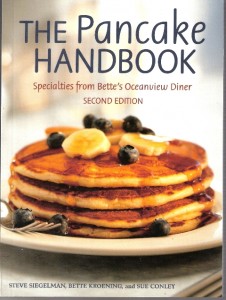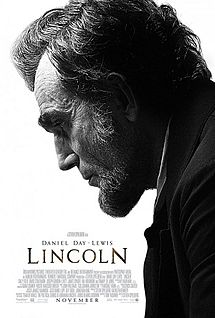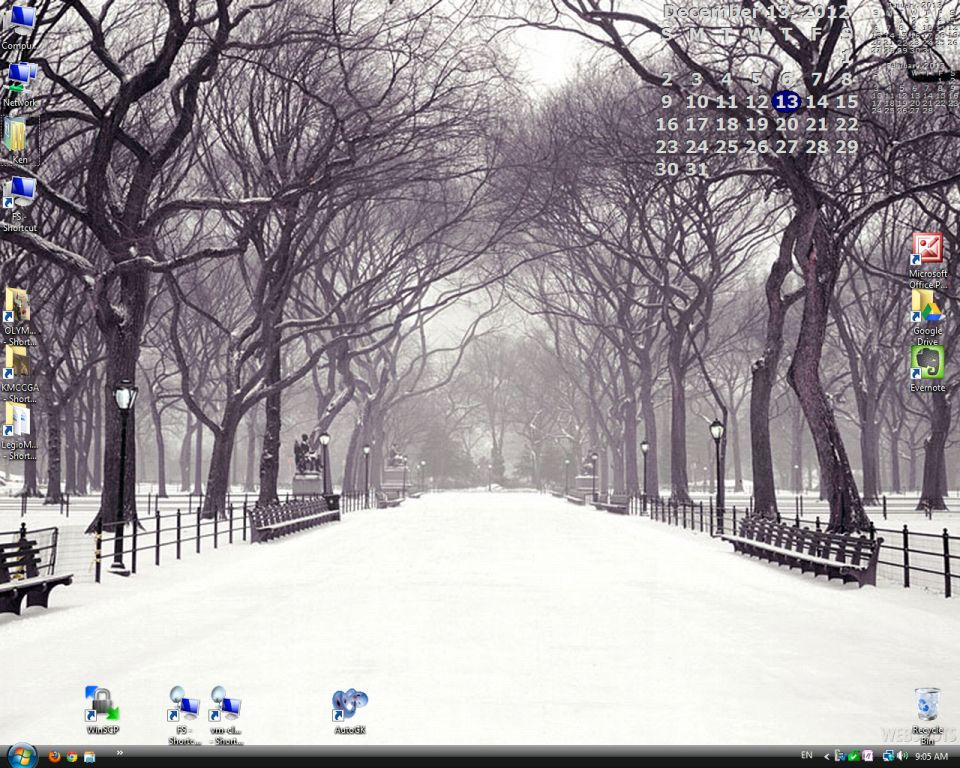Rip Van Winkle 같이..

얼마 전부터 까마득한 옛날에 읽은 듯한 미국 단편소설 (단편보다 더 짧은 장편掌篇 일지도..) Rip Van Winkle (맆 밴 윙클)의 생각을 하게 되었다. Nostalgic한, 그러니까 좀 포근한 기분을 느끼는 듯한 기분으로 기억력을 되살리며 그 소설책을 어떻게 읽었던가를 기억하려고 애를 쓴 결과, 이것은 영어책 읽기를 배우려는(당시에는 ‘영독’이라고 했다) 의도로 영어로 된 ‘원서’를 읽은 것이었고, 아마도 나의 ‘전설적인’ 아르바이트 가정교사 경기고 김용기형이 ‘반 강제로’ 권해서 읽었을 것이고, 그 정도를 읽으려면 고등학교 2학년(1964년) 정도였을 것이다.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 그 책 저자의 이름은 비록 잊었지만(찾아보니 미국의 Washington Irving) 스토리의 대강은 기억한다. 주인공인 맆 밴 윙클이 하루 종일 바가지 긁는 마누라를 피할 겸해서 산으로 갔다가 ‘귀신’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신나게 놀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고 보니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통해 비슷하게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전설에도 비슷한 것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문제는, 내가 이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으로 사는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책의 주인공은 20년의 잠을 잤지만, 나는 대강 10년 정도의 잠을 잤다는 것, 그는 괴로운 현실을 떠나서 즐겁고 편안한 잠을 잤지만 나는 사실 그 반대인 것이 차이라면 차이일까? 가끔 현실이 꿈같이 느껴지고, 꿈이 현실처럼 느껴진다는 표현을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그 표현이 그렇게 실감날 수가 없었다. 현실감이 희박해 진다는 것은 엄밀히 생각하면 조금 위험한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나는 가끔 혹시 내가 무슨 ‘정신이상’, 아니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도 많이 해 보았지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연숙에게 핀잔만 듣곤 하고 금새 현실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지금 현재 Rip Van Winkle처럼 느낀다는 사실이다.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는 기분인 것이다. 그러면 나의 그 긴 잠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아마도 1998년 경부터가 아닐까. 50세가 되던 그 해부터 2008년경 까지의 10년간.. 기나긴 그 때에 연숙의 어머님, 나의 장모님께서 갑자기 타계를 하시고, 그 다음해에는 나의 ‘태양, 그리고 별’, 어머님이 뒤 따라 가셨다.
그때의 심한 충격에서 아마도 나는 나의 고통을 ‘기나긴 잠’으로 잊고자 한 모양인가? 내가 살고 있어도 살아있는 기분이 아니었다. 그때야 나는 비록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았지만 나의 어머님의 존재와 위치의 ‘위대함’을 알 수 있었다. 나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방파제요, 희망이요, 피난처였던 나의 어머니.. 어린아이같이 나는 어머니가 무한정 내가 죽을 때까지 사시리라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며 나를 기만하며 살아온 것이다. 그 꿈이 현실적으로 사라지자 나는 고통을 피하려 본능적으로 잠 속으로 숨었을 것이다.
긴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며 나는 10년이 지난 나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고, 10년 더 먹은 나의 모습은 거울조차 보기 싫은, 과히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처음에 느낀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실망, 충격, 당황함 등등..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나는 나의 현재 몰골과 처지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때 내 앞에 슬며시 다가온 것이 ‘성모님의 묵주기도‘ 였는데, 처음에는 그저 ‘살려고’ 아무 것이나 잡겠다는 심정으로 시작했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나는 가게 되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르네상스 시작이 되었다. 이제는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