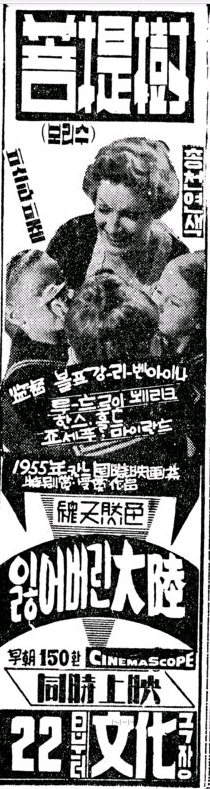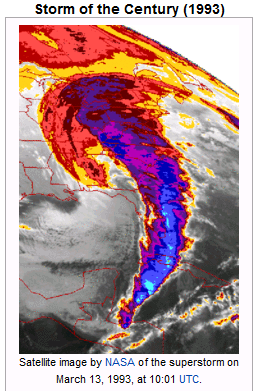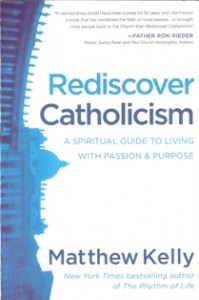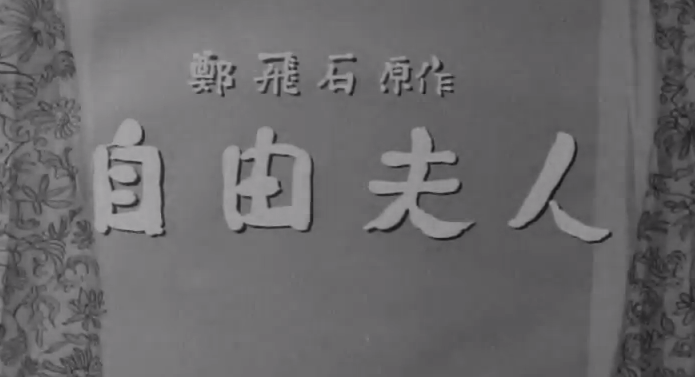Good Friday, Tipping Poin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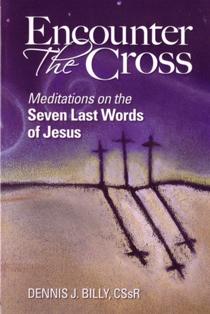
¶ Good Friday.. of the Passion of the Lord. 주님 수난의 성금요일.. 바로 오늘이다. 부활 성삼일 중간에 있는 ‘조용한’ 날이기도 하다. 한글로는 성금요일인데 영어로는 Holy Friday라기 보다는 항상 Good Friday라고 부른다. 이 성삼일에 있는 천주교 전례는 모두 독특한 이름이 있다. 목요일 것은, The Mass of the Lord’s Supper, 금요일 것은 The Passion of the Lord, 토요일은 Easter Vigil.. 우리의 본당인 영어권과 한국어권 두 곳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둘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부담이 항상 있지만 나는 그것이 부담이라기 보다는 ‘더 많이 알게 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오늘이 Good Friday 인데 왜 하필 ‘Good‘ Friday라고 부르는 것일까? 오랜 전부터 나는 그것이 의아스러웠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의아스럽지 않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었다. 비록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어갔지만 그것의 결과인 부활과 그것으로 200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천주교의 ‘인류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그것은 한마디로 Good인 것이 아닐까?
얼마 전에 우리의 젊은 신입 레지오 단원 엘리사벳 자매님이 우리 Holy Family 본당에서 있었던 일일 피정에 참가하면서 그 때 교재로 쓴 Dennis Billy 저, subtitle “Meditation on the Seven Last Words of Jesus”란 가벼운 책자 하나를 나에게 빌려주었다. 이 책은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천천히’ 죽어가면서 하신 일곱 마디 ‘말’들.. 을 가지고 reflection questions 을 제시하며 서로의 의견 나눔을 도와준다. 사순 절에 일일 피정의 교재로 쓰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책이라고 할까. 그 일곱 마디의 말은:
- “Father, forgive them, they know now what they do.” (LUKE 23:34)
- “Amen,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LUKE 23:43)
- “Woman, behold, your son… Behold, your mother.” (JOHN 19:26-27)
-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MATTHEW 27:46)
- “I thirst.” (JOHN 19:28)
- “It is finished.” (JOHN 19:30)
-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LUKE 23:46)
이 말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하신 마지막 ‘역사적’인 말들이다. 그 이후,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들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인간의 육신에서 해방이 되신 이후의 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상태에서 하신 이 마지막 말들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오늘 새벽 아니 한밤중이었던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나는 연숙과 같이 난생 처음으로 아틀란타 한국 순교자성당에서 성금요일 성체조배(Eucharistic Adoration) 를 ‘감행’ 하였다. 연숙은 오래 전에 친지교우들과 같이 한 번 해 보았던 것을 나도 기억을 하지만 나는 처음이다.
이것은 천주교만의 전통일까.. 성목요일 최후의 만찬 미사가 끝나면 성당내의 ‘모든 전례 도구’들은 ‘철거’가 되고 성체가 모셔진 ‘감실(tabernacle)’ 도 비게 된다. 그때 성체가 성체 조배실로 옮겨지게 되고 그때부터 ‘쉬지 않고 계속’ 성체조배가 행해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자정 이후 한 밤중에는 그것이 중지될 수도 있기에, 미리 ‘예약’을 받아두고 조금도 그 성체가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지난 달 꾸리아 월례회의에서 새벽 시간의 예약을 받을 때 나는 거의 ‘무심코’ 이름을 써 넣었다. 주로 레지오 단원들이 참가하기에 나는 큰 부담 없이 한 것인데 밤 11시면 ‘세상없어도’ 잠자리에 드는 나의 육신에는 사실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결국은 ‘무심코’ 감행을 하였고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두고두고 보아야 할 테지만 나는 ‘좋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도 사실 나의 근래의 좌우명 ‘It’s Now or Never‘ 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 Tipping Point.. 한참 유행했고 이제는 ‘흔한’ 용어가 된 말이다. 무언가 ‘거대한 것, 힘든 것’이 오랜 노력과 시간 끝에 ‘움직이기’ 시작하며 뒤돌아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현상을 말한다고 할까.. 나는 65년 일생을 통해서 이런 것을 나의 몸으로 경험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좋건 싫던 간에 나와 직접 상관이 없는 것들이 ‘넘어가는’ 것은 물론 많이 보았다. 정치적으로는 요지부동의 공산당 제국들(김일성 개xx는 제외)이 넘어가는 것도 보았고, 사회학 적으로는 ‘말단,주변 생물’이었던 ‘동성’들이 이곳 저곳에서 어깨를 펴고 기어 나오는 것도 보았고, 자연과학에서는 global warming같이 세계적 기후가 변화 되는 것도 현재 목격하고 있다. 이런 global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의 personal tipping point는 무엇일까..
요새 목격하고 있는 나 자신의 세계,우주관의 지각변동일 것이다. 이것이 tipping point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 변동이 참 오랜 세월이 걸렸기 때문이다. 세계, 우주관이라고 하면 조금은 막연한 느낌도 들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은 ‘종교, 신앙관’이 맞을 지도 모른다. 반세기 넘게 희미하게 흩어져 있던 조그만 ‘점’들이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서로 연관들이 없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연결되며 조금 더 큰 점으로.. 그 커진 점들이 다시 다른 것들과 연결이 되며 더욱 커지고.. 결국은 그 점들의 ‘질량, mass’가 tipping point에 다다르고 있다고 할까. 이제는 확실히 느끼며 믿게 되었다. 이 불가사의한 우주와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것이 이번 사순절을 지내며 내가 받고 있는 ‘은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