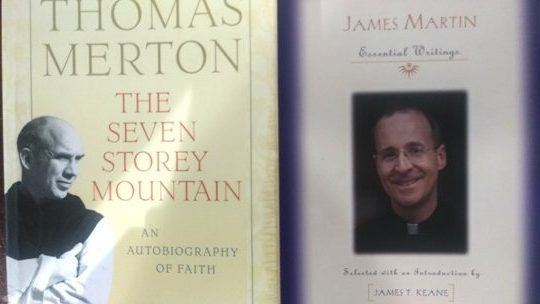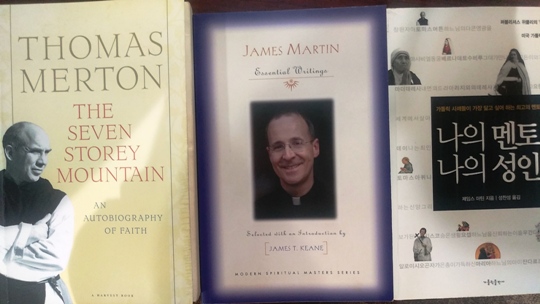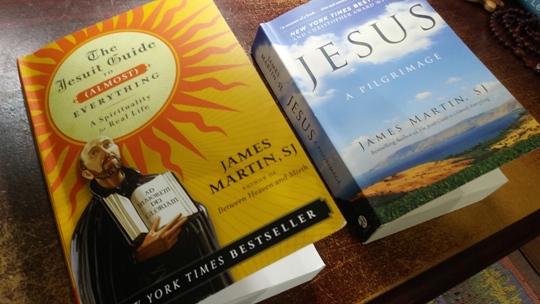어젯밤에 일기예보를 못 본 탓에 침실 ceiling fan 을 켜고 잔 탓에 밤새 추위에 떨었던 불편한 기억이었다. 왜 이렇게 춥지… 하며 몸을 온통 오그리고 잔 것이다. 급기야 긴 팔, 긴 바지, 양말까지 신고 내려오는 나의 꼴이…. 죄값을 받은 셈인가? 어제 저녁 잠깐 office에서 눈을 붙인 것이 기도도 팽개치고 그대로 밤잠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것은 정말 오랜만에 저지른 나의 ‘작은 쾌감’ 같은 것, 아주 후회는 안 한다. 하고 싶었기에… 덕분에 싸늘한 6월 말 아침의 ‘습격’을 받은 셈이다. 연숙에게 조금 미안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어제는 저녁기도를 했어야 했는데….

AFTER HUMANITY: A Guide to C.S. Lewis’s The Abolition of Man, $30 well spent? I hope so!
아침에 온 WOF (Word on Fire, a catholic ministry) email, Bishop Barron의 promotional video를 보고 ‘그대로’ order를 해 버렸다. 이 책은 사실 Lewis의 ‘어렵게 보이는’ 책, The Abolition of Man의 깊고 자세한 주해서 격에 해당하는 듯 보인다. 보너스로 원저 The Abolition of Man도 포함되었다니… 너무나 매력적인 deal이 아닌가? 나의 Lewis에 대한 늦은 관심과 사랑을 떠나서 이 책의 외형적인 조건들이 이 책을 사게 만들었다. 현재의 Post-Truth 현실과, 미학적 관점을 가미한 Barron의 영향을 느끼고 싶기도 했다. 이 책을 내가 깊이 이해하게 되리라는 막연하지만 멋진 희망도 빼놓을 수 없다. 희망을 걸어보자!
Art of Ignoring: 내가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 바로 이것임을 왜 이렇게 인생의 후반부에 깨달아야만 했을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안 것을 다행으로 여기자. 큰 것, 작은 것, 개인적인 것, 세계, 사회, 정치 상황 모두에 해당하는 ‘기술, 예술’이다. 무시하는 지혜,… 집에서부터 무한한 우주영역에까지… 해당이 안 되는 곳이 없다. 연숙의 ‘앙앙거리는’ 의미 없는 듯 들리는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우주의 기하학적 구조까지… 어떤 것들은 거의 무시하는 것이 안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지만 어떻게 촉감을 초월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것인가? 불교의 냄새를 풍겨야 할 것인가? 요새를 사는 나의 화두 중에 하나가 되었다.
80년대 VHS era, KBS [청소년 문학관] 시리즈: 비록 10편도 안 되는 것이지만 더운 초여름에 나를 너무나 아련~하고, 편하게 하는 영상과 이야기들이다. 어떤 것들은 아련한 사랑의 감정을 추억하게 해 주는 것이어서 정말 오랜만에 10대 당시 나의 모습을 그린다. 겁 많고 지나치게 수줍어 했지만 나만의 낭만적인 상상도 적지 않았던 시절들. 이 드라마들 중에는 ‘입시지옥’에 연관된 이야기들이 꽤 있는데, 우리 때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심각한 것들이라서 현실감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충분히 이해는 하고도 남는다. 지금은 ‘산사에서’ 라는 것을 보는데… 아늑한 산사, 절의 풍경과 입시지옥을 겪는 고교생, 재수생들의 이야기… 대학입시의 중요성이 극한으로 치솟은 고국의 10대들이 불쌍하기도 하다. 이것이 거의 반세기 후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다.
요새 80년대의 여러 가지 종류의 고국의 TV 프로, 주로 드라마, 이것들을 보며 간혹 나는 고민에 빠진다. 좋아하는 것보다 거슬리는 것, 특히 연기자들과 그의 역할, 성품 등에 연관된 것이다. 역할이 악역이거나 내가 싫어하는 전형적인 역할은 물론 연기에 따라서 싫고 혐오하기까지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지만, 문제는 그 연기자 자신에 관한 것이다. ‘악역’을 너무나 실감나게 연기해서 그런 것이지만 그 사람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연기자의 ‘화학적’ 성품이다. 최근의 예로, 미안하지만 남자 연기자 둘 ‘주X’과 ‘백일X’ case다. 이들의 사생활을 알기 전부터도 별로 호감이 안 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싫은 것이다. 연기 속의 그들이 아닌 실생활에서도 보일 듯한 그들의 모습이다. 특히 주X이라는 사람, 정말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정도로 그 ‘느글, 느물거리는 자태’는 물론이고, 그가 실제로 그런 인물일까 하는 의심까지 든다. 백일X, 그도 역시 ‘기름기가 밴 폭력성’이 나를 도망가게 만든다. 그의 사생활도 나중에 연숙을 통해서 들었기에 나의 유감은 맞은 셈이다. 이 두 사람의 ‘냄새’ 를 나는 정말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어쩔 것인가? 우문[현답]인가?
고국의 VHS급의 영상물을 보다가 서서히 90년대 혹은 2000년대로 옮아오며 나는 주저하고 주저한다. 우선 배경 scene들이 너무나 나에게 생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거북한데… 사실 웃기는 것 아닌가? 나는 그 당시에 가끔 그런 것들에 이미 익숙해졌던 것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왜… 그렇구나, 내가 우리 고향의 변화, 변천하던 모습을 거의 고의적으로 잊으며 살았던 것에 대한 죗값이라고 할까? 내가 너무나 이런 것에 민감한 것일까? 왜 남들처럼 무덤덤하게 못 받아들이는 것일까? 그래도 나는 노력할 것이다. 서서히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올라오며 공부하고 익숙해질 것이다.

Reese’s,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나이에 이것은 예외가 아닐지? 어제 이것을 무려 6개나 입에 넣고 나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낀다. 나이의 신호인 ‘당뇨병’이란 말이 귀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당뇨의 원인이 Reese’s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양적인 것은 아닐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시간당 적당한 개수는 몇 개일까? 웃기는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요즈음은 솔직히 말해서 사치적인 순간들이다. 즐기고 감사하면 된다. 아~ Reese’s야, 지금도 거의 손이 그곳으로 가며 2개를 먹을 준비가 되어있다.
‘나의 멘토 나의 성인’ 중 루르드의 베르나데트 라고 쓰인 벨라뎃다 편을 신들리듯 읽고 쓴다. 내용은 거의 이미 아는 것들이지만 이 신부님의 묘사, 글은 정말 engaging한 것이어서 실감이 100 % 난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그가 했던 성지순례일기였다. 아~ 이제 우리도 이곳을 가볼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실감은 아직 가지를 않지만 그래도 꿈과 희망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한다. 건강할 때, 걸을 수 있을 때, 여행을 갈 수 있을 때…
신명 들린 듯, 마술에 빠진 듯 읽으며 필사를 ‘즐긴다’. James Martin신부의 문장, 글의 스타일 때문일까, 아니면 내용에 무엇이 있는가? 지금 루르드의 벨라뎃따, 순례기를 읽고 있는데, 생각한다. 이곳을 가게 되면서 혹시 우리들… 앞으로 꼭 봐야 할 유명한 곳 보다는 세계에 널려 있는 성지를 가급적 많이 가보고 싶다는 어린애 같은 소망이 떠오른다. 나답지 않은 것이, 예전에 나는 그렇게 성지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Martin신부의 글을 읽으며 서서히 그런 생각이, ‘꼭 가보고 싶다’ 라는 희망적인 염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목표가 서서히 안개 속에서 나타나는 듯 느껴지는 날이 되었다.
기록적인 속도로 베르나데트 성녀 편을 끝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거의 30 페이지를 질주한 것이다. 역시 내용이 큰 관건이다. 너무나 몰입하며 즐겁게 읽게 되니까 이렇게 빠르게 독파한 것이다. 다음 편은 여러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를 택했다. 이것은 Word on Fire Bishop Barron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신학대전 Summa…’, 신학의 정수를 정리한 분이니… 이것으로 나는 apologetic의 한 곳을 또 건드린다.
이슬비도 안 되는 물기가 가득 찬 하늘을 보며 로난을 데리고 걸었다. 햇살은 없지만 대신 습기가 땀을 배게 한다. 아직도 나는 로난과 가는 것이 힘들지 않다. 숨도 고르고 다리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언제까지? 연숙은 요새 걷는 것조차 부담이 되는 듯 보인다. 나와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야 할 텐데… Toddler, 아이를 보는 것 baby-sitting, 힘든 것인가 아니면 할만한 것인가? 지금은 새로 찾은 Dave&Ava [3D animation, 최근의 video technology의 위력을 보여주는 예] 라는 아이들 video를 Youtube에서 보게 하는 것이 무척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그것 이외는 diaper 갈아주는 것, 많을 때는 3번씩이나 하고 나면 정말 나도 늘어진다. 책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 정도가 되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힘은 들어도 이러면서 서로 skinship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좋은 것 경험이 아닐까. 아직도 손주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일들’, 그래 기왕 하게 된 것 편하고 즐겁게 하도록 노력하자… 그것이 노년에 최선을 다해 사는 한 방법이다.
하지가 지났다는 것이 조금 실감이 안 간다. 날씨 때문에 해의 동향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관심이 덜 했던 것인가? 설상가상으로 나의 방에 있는 wifi light controller에 문제가 생겨서 ‘일년 중 제일 늦게 저녁불이 들어오는’ 것을 목격을 못 했기 때문이다. 좌우지간, 이제부터는… 저녁때의 불이 조금씩 빨리 들어올 것만 알면 되고… 아~ 진짜 여름의 시작이고… 4개월만 지나면 ‘황금색’의 세상이 올 것을 기대하며…
6월의 하순, 24일의 요한세례자 ‘영명축일’과 메주고리예 성모님 발현이 머리에 떠오른다. 6월 25일은 나의 아버님이 빨갱이들에 의해서 끌려가신 모습이 떠오르고… 이렇게 하면 6월도 저문다. 그리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 계속 기다리는 것…
요사이 너무나 시원한 초여름의 날씨, 특히 뒤뜰의 초록색의 향연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온다. 연숙이 참으로 애를 쓰며 만들고 있는 이것, 아마도 우리 집의 보물이 될 지도 모른다. 그래, 열심히 사는 날까지 가꾸고 보살피고 사랑하자.
President Biden의 사랑하는 pet dog Champ가 집에서 편하게 영원한 잠을 자게 되었다는 소식. 날짜가 6월 19일, 우리Tobey가 3년 전에 저 세상으로 간 같은 날? 아~ 우연인가? 게다가 나이가 13살? 이것도 거의 비슷한가? 그렇구나… 비슷하다. 그래 우리 Tobey도 집에서 나의 손에 안겨서 떠났으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이 뉴스가 national news에 날 정도니까, 얼마나 미국인들의 pet dog, cat 에 대한 사랑이 깊은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그런지.. 바이든이 더 좋아진다 [모르긴 몰라도 Donald 개XX 는 pet dog이 있어다면 수시로 발로 걷어차며 열을 내고, 화를 풀었을 듯하다].
오랜 세월 동안 손에 들어온 고국의 시사 월간지들, 특히 신동아, 월간 조선, 중앙 등… 이제는 추억의 잡지로 곰팡이가 쓸고 있지만, 나에게는 기나긴 고향을 잊고 살았던 기간을 회복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유물이 될 수도 있다. 1970년대 2권, 1980년대 21권, 1990년대 7권, 2000년대 1권… 이것으로 얼마나 나는 과거의 대한민국을 공부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한번 해 보자!
올해 Father’s Day, 받는 것만큼 나도 협조를 한 셈인가? 조그만 가족들이 모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으로 이날의 의미는 살렸으니까… 하지만 조금은 피곤하기도 하다. 나는 사실 이런 날, 기념일, 방학, 휴가, 명절, 휴일 등등, 혼자 있고 싶은 때도 있지만 나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의 속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이세상에 아마도 나의 볼래야 볼 수도 없는 어머님밖에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나의 생각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사회적 인간이 아닌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도 나는 속으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존재가 한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Father’s Day 모임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모이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행사이기도 했다. 나는 별로 즐겁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문제가 거의 전부일 수도 있지만 별 수가 없었다. 별로 즐겁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 그런 때도 있는 거지…

Father’s Day grill out by Father
이영석 신부와의 카톡 대화로 8월 경에 이임, 귀국을 하신다는 것은 짐작했다. 6월 말까지 떠난다는 소문으로 아마도 새로 오시는 주임신부님이 그날까지 못 오시는 듯하고 아마도 8월 경쯤 visa가 된 것은 아닐까? 좌우지간, 8월 전까지는 새로운 신부가? 와~ 아찔해진다. 물론 좋은 사제가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윗동네’ 주임신부 같은 ‘피하고 싶은’ 사제가 오는 날이면? 와~ 이것도 조금은 도전이고 시련일 수도 있다. 이임 소식을 아직도 생각하고 정리를 하고 있다. 물론 나에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 성당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내년까지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인지? 어떤 목자가 출현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눈 앞에 있는 생의 마지막 순례길을 크게 결정, 좌우할 듯하기 때문이다. 나의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신부님, ‘몸이 아프신가..’ 하는 추측 성 말들을 하게 되었다. 아니면 가족 사정, 특히 그들의 건강상태.. 등으로 관심이 넘어가면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닐 듯 보인다. 그러면 나쁜 것 아닌가? 문제는 timing이다. 왜 지금인가? 시간이 지나면 알려질 터이지만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더 좋은 신부님이 오신다는 hint를 주셨지만 그것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