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표지 flap:
 사색을 통한 신앙 전승의 습득을 촉구하는 우리 세대에 몇 안 되는 위대한 제안자의 한 사람인 벨테가 그의 창작 활동의 원숙한 결실을 내놓았다. 그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사유함이 자율적으로 진전된 우리 시대에 이성의 광장 앞에서 종교가 가진 권리이다. 일체의 것을 결정짓는 의미물음을 통해서 그는 오늘날의 우리가 걸어갈 수 잇는 신에게로 향한 사유의 길들을 구상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일상적 행위 안에서 의미물음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긍정하는가를, 도 우리가 같은 인간들에 대해 책임성 있게 행위 함으로써 계시를 통해 인간의 경험의 지평에로 들어온 무조건적인 신비의 인격적 특성을 어떻게 요청하는가를 명시하고 있다. 이 인격적 신이 인간의 태도를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곳에 그 완전한 의미로 종교가 있으며 신앙과 기도와 예배로 종교를 실행하는 종교적 인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를 실행함에 있어서 신으로부터의 운동(예컨대 선포)과 신에게로의 운동(예컨대 회중의 기도)은 함께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사색을 통한 신앙 전승의 습득을 촉구하는 우리 세대에 몇 안 되는 위대한 제안자의 한 사람인 벨테가 그의 창작 활동의 원숙한 결실을 내놓았다. 그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사유함이 자율적으로 진전된 우리 시대에 이성의 광장 앞에서 종교가 가진 권리이다. 일체의 것을 결정짓는 의미물음을 통해서 그는 오늘날의 우리가 걸어갈 수 잇는 신에게로 향한 사유의 길들을 구상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일상적 행위 안에서 의미물음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긍정하는가를, 도 우리가 같은 인간들에 대해 책임성 있게 행위 함으로써 계시를 통해 인간의 경험의 지평에로 들어온 무조건적인 신비의 인격적 특성을 어떻게 요청하는가를 명시하고 있다. 이 인격적 신이 인간의 태도를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곳에 그 완전한 의미로 종교가 있으며 신앙과 기도와 예배로 종교를 실행하는 종교적 인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를 실행함에 있어서 신으로부터의 운동(예컨대 선포)과 신에게로의 운동(예컨대 회중의 기도)은 함께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실제 종교생활의 본질적은 것을 사유함 안에서 모사 模寫 하는 일, 그것은 이 저작의 이해를 따르면 종교철학을 의미한다. 이 작품은 오늘의 묻는 인간, 종교와 신앙의 일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모두를 향해 있다.
뒤 표지 flap:
지은이 베른하르트 벨테
 1906년 3월 31일 독일 바덴의 메쓰키르히 에서 태어났으며, 1951~1973년 프라이부륵 대학교에서 종교철학 교수로 봉직하였다. 1983년 9월 6일 사망하였다.
1906년 3월 31일 독일 바덴의 메쓰키르히 에서 태어났으며, 1951~1973년 프라이부륵 대학교에서 종교철학 교수로 봉직하였다. 1983년 9월 6일 사망하였다.
가톨릭 신학과 현대철학 사이에 가교를 놓으려 했던 벨테의 사상적 노정은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 안셀무스 가 표현하였던 유명한 정식, 즉 “통찰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벨테에 의하면 종교철학은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뿌리와 전제들에 충실하면서도 순수한 철학적 사유의 특성을 견지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확신은 동향인 하이데거의 경우에서처럼 현상학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벨테의 저작으로는
<영원한 것의 자취를 따라서>(1965), <구원의 이해>(1966), <유한과 무한의 겨룸터>(1967: 한국어 번역판 1996), <시간과 신비>(1975), <시간과 영원 사이에서>(1982) 등이 있다.
옮긴이 오창선 Ph.D 은
가톨릭 사제로서 오스트리아 인스브룩 대학교와 독일 뮌헨대학교 철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현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철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머리말
내가 여기에 제시하는 종교철학은 강의들에서 태동된 것이다. 1962년 이후부터 1973년까지 나는 종교철학에 관한 강의들을 정기적으로 해야만 했다. 나는 나의 생각들을 매번 반복하면서 고쳐 썼는데 그 결과 이 시기 동안에 새로운 전망들이 늘 또다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나는 이와 같이 불어난 전체 생각을 이번의 간행을 위해 다시 한번 철저하고 면밀히 검토하였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제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들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들에게 나는 많은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에 제시하는 것은 오랜 기간의 숙고와 많은 대화들의 결실이다.
여기에서 논할 주제들을 나는 부분적으로는 종종 논문들이나 개별 연구들에서 다루었는데, 그것들은 이따금 거기에서 비교적 더 상세히 취급되었다. 그렇게 때문에 나는 적당한 곳에서 감히 그것을 환기시키고 나 자신을 인용할 것이다.
이 종교철학을 완성하면서 나는 종교철학적 문헌과 논쟁할 의도가 없었다. 이것은 다른 저자들이 이 중요한 주제에 공헌한 것을 내가 경시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직접적이고 곧바로 사유 안에서 착수하려고 의도하였다. 계몽주의 시기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종교철학의 가장 중요한 현상들에 대한 훌륭한 문헌 개관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도 환기되어야만 한다. 쇠에 와 특히 트릴하스 가 RGG에서 그리고 그에 대한 보충으로 메츠 가 LThK에서 한 상론과 보고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 높이 평가될 만한 작업들을 고려해 볼 때에 거기에서 이미 훌륭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것은 내게는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오늘날의 철학함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조 思潮들이 전문 영역을 넘어서 공공의 견해를 형성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한에 있어서 그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내게는 중요한 것처럼 보여진다. 이것은 특히 비판이론과 현대의 실증주의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이 이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세계관이 된 한에 있어서 그것들은 종교 문제에 대한 오늘날의 숙고의 전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 자체의 전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전의 중요한 견해들을 다루게 되었을 경우에 현행의 본문들에서 그것을 환기시키게 될 것이다.
각주들의 교열, 정리 및 보완하고 또한 교정을 본 데에 대해 나는 괴르츠 박사와 슈나이더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나는 이 책이 몇 가지 측면에서 유익할 수 잇기를 기대해 본다. 계속해서 사유하도록 하는 자극들이 이 책에서 제공되기를 나는 특히 기대해 본다.
1977년 10월 15일, 프라이부륵
베른하르트 벨테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적 물음
1. 철학적 사유 전반의 의미에 대해
2. 종교철학의 의미에 대해
3. 종교의 예비 개념
4. 현대의 철학적 상황에서 종교와 종교철학
제2장: 종교의 원리로서의 신
5. 신에게로 향한 첫 번째 노정 路程의 구상
6. 신에게로 향한 두 번째 노정의 구상
7. 이전 시대의 견해들에 비추어본 두 구상들
8. 절대적 신비의 인격적 특성
9. 절대적 신비의 신격 神格
10. 신의 모습의 역사적 변천
11. 무신론
제3장: 종교의 실행자로서의 인간
들어가는 말
12. 신앙
기도 -들어가는 말
13. 침묵의 기도
14. 언어로서의 기도
15. 예배로서의 기도 I: 회중, 선포 그리고 회중의 기도
16. 예배로서의 기도 II: 실재 상징적 행위로서의 예배
17. 종교의 폐해 弊害
맺는 말: 끝없는 끝맺음
역자 후기
제1장: 서론적 물음
1. 철학적 사유 전반의 의미에 대해
우리의 출발점은 종교철학이 여하간 철학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철학이라는 이것이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물음에 대한 명백한 해답이란, 더욱이 최종적인 해답이란 있지 않다. 철학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철학이라는 것이 결코 미리 주어지는 어떤 정의 定義에 의해서 확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만일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하자면 “메타-철학” 에서 얻어진 것이어야 하는데, “메타-철학”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또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몇 가지 말할 수 있고 또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스스로-생각함
우선 철학이란 자기 자신만을 밝힐 수 있고 규정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해명과 규정은 다시금 인간이 철학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그 정도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철할이란 철함함이며, 철학함이란 그것이 얼마나 더 상세히 계속해 규정되든 여하간 사유함 Denken이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철학이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기에서, 그 자신의 능력에서, 그 자신의 사고력에서, 그 자신의 근원에서 생기는 것이다. 철학함이란 독창적인 인간 사고가 전개해 나가는 한 출중한 형태이다.
그런 까닭에 철학은 철학적 명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현존하는 것으로서 표상되거나 인지되는 거기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지식이란 다만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던 철학에 대한 지식일 뿐이지, 그 자체로 철학은 아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오직 사유함 자체의 사건으로서만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건은 때때로 명제들 안에서 파악될 수 있고 또 파악된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이 명제들 또는 그 밖의 무엇이 철학함의 파악될 수 있는 요소들에서 등장하든간에, 그것들은 현실적이고 생동적인 사유의 요소이며 또 그런 것으로 남으며, 우리가 이를 뒤따라 체험해 봄으로써 또다시 생겨난다는 점이다. 오직 이 점에 있어서만 그러한 요소들은 철학과 같은 어떤 것의 요소들이라고 주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근본적인 사정을 숙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철학이 동시에 뛰어난 인간사로서 특징지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철학적 사고 안에서 인간은 그에게 고취된 자신의 사고력에 힘입어 자유롭고 독자적으로 그의 이 힘을 펼쳐나가기 시작한다. 그는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본래 어떠한 것인지 또 세계의 진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서 그에게 빛을 발하는가를 스스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며, 혹은 보고자 하는 그의 원의가 생기는 것이다. 철학하는 자는 우선 외부로부터 그에게 제시된 일체의 의견들과 명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그러한 명제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 스스로 보고 나 스스로 생각하게 놔두시오. 철학함은 인간에게 보증된 자유로운 자아존재 Selbstsein의 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해 자아존재의 이 자유를 펼쳐나가고 이렇게 하여서 자유롭게 스스로 사유하고 스스로 본다. 그러므로 철학함으로써 인간은 단순히 피상적인 명제들과 견해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사유함”에 의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철학적 사유는 인간 자유의 한 출중한 행태이다.
2. 사유의 관심사
사유함은 여기에서 물론 내재적 內在的 인 한 과정, 즉 인간 주관성의 일종의 내면 공간 안에서만 진행된다고 할 수 있을 어떤 무엇으로 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유함은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생동적인 개방성이며, 인간과 세계의, 사유하는 자와 그의 사유의 투명한 공간 안에서 그에게 떠오르고 그를 만나는 그것 사이의 어떤 만남이며, 한편으로는 인간 생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의 공간 안에서 사유하는 이 생을 만나는 표징과 신호와 물음과 경탄 사이의 한 대결이다.2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철학의 사유함을 특징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문제에 엄격히 매여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문제로 삼는 것은 진리와 존재라는 점에서 세계의 모습들에서부터 사유함에 마주해 오는 그것이다. 사유함은 그것을 만나는 진리와 존재의 이 격려에 “부응하여-말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에 대해 “책임을-떠맡으면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성으로서 사유함의 자유는 자신의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제에 매여 있다는 점에서 철학적 사유는 물론 모든 진지한 사유, 예컨대 과학적 사유와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그리고 오히려 바로 철학적 사유를 위해서도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사유함이란 진리와 존재의 격려 속에서 사유되어야 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확실한 사유가 되는 곳에서 사유는 단지 제 스스로 구상된 형태들의 내부 공간에 계류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모든 사유에 있어서 저마다 문제가 되는 관심사를 사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명제들과 견해들에 대해 철학적 사유가 그토록 자유로운 것이지만, 그것은 문제와 그리고 이 문제로부터 철학적 사유에 마주해 오는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 그토록 매여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철학적 사유가 취하는 일체의 조처들을 그것의 문제에서부터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의미에 있어서 그것은 논증되고 논증하는 사유이지 않으면 안 된다. 철학적 사유의 논증적 성격은 우선 이 사유가 정확히 그의 문제를 주시하고 그 문제로부터 건네진 말을 정확히 듣는다는 데에 있다. 거기로부터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의 근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알리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보고 듣는 것을 들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로 철학적 사유는 그 근저로부터 높여진 것을 조심스레 개념화하고 언어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작업은 다시금 이 개념들과 말들로써 그 근저가, 즉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는 것이 그것 스스로에서부터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게끔 이루어져야만 한다.3
오로지 그러한 논증 절차의 엄격성에 의해서만 철학적 사유는 우연치 않게 늘상 반복해서 그것에 대해 제기되는 정밀과학의 그 비난, 즉 그것이 근거 없는 비현실적 사변이라는 비난을 벗어난다. 현실에서 또는 관련 문제의 존재나 진실에 있어 입증되지 않은 머릿속의 구성물이나 모델을 구상하는 것은 재치 있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본래의 의미의 철학은 아니다.
따라서 사유가 그토록 자유롭고 사유하는 사람 저마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신의 문제에 엄격히 매여 있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의 존재와 본질 그리고 이로써 도한 그 진리에 마음이 끌리어서 이 문제를 개념화하고자 하는 사유는 인간의 원천적인 자아 및 존재이해를 펼쳐나가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은 현존재하면서 언제나 이미 자기 자신을 그의 거기에 Da 또는 그의 세계 내에서 이해한다. 동시에 그는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그의 세계를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서 이해한다. 그 때문에 인간은 자이 맟 존재이해로서 현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이 사유한다면, 그에 예컨대 이것은 무엇이냐 또는 나는 무엇인가 또는 내가 나의 세계 내에 현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 바로 이 자아 및 존재이해를 펼쳐나가는 것이다. 그는 사유하는 것이며 자신과 그의 세계를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서 존재의 빛 안에서 질문하는 것이다. 오직 이 이유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의 현존재의 계기들의 존재에 마음이 끌리어 이 존재와 관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모든 것이 존재의 관점에서 분명해지고 그가 거기에 응할 수 있음으로써 본질 역시 그에게 분명해지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는 본질과 비실재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질문하는 일체의 사유, 일체의 철학함은 인간 그 자체의 자이 및 존재이해의 전개이다.
그 안에서 자신을 펼쳐나가고 움직일 수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아 및 존재이해는 또한 이성 理性이라고도 일컬어진다. 따라서 인간이 철학하면서 그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때에, 그는 그에게 주어진 자아 및 존재이해 안에서 그의 문제에 매여 있는 가운데 그 자신의 원천에서부터 활동하는 것이다. 이 활동이 그 자체로서 전개되어 있는 거기에서 우리는 철학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본래적 존재와 사실
물론 철학적 사유가 사유해야 될 문제에 매여 있음은 정밀과학들의 경우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그래서 논증의 방식들, 즉 해당 문제의 관점에서부터 증명하는 방식들은 다르고 고유한 성질의 것이다. 이것은 특히 철학적 사유가 관계하는 문제가 정밀과학들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어떤 특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우리가 철학적 사유의 문제를 더 정확히 통찰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유가 그것의 길과 방법들에 있어서 특유의 성질을 지닌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간략히 말했고 그에 대해 약간 더 논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견해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철학적 사유를 특징짓는 것은 그것이 숙고될 필요가 있는 것의 존재 또는 진리(또는 진정한 존재)와 관계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자이 및 존재이해가 펼쳐져 나가는 중에 되는 것인데, 그러한 자아 및 존재이해 안에서 우선 그의 세계가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 역시 그 스스로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다.
이 자아 및 존재이해의 빛 안에서 펼쳐져야 할 문제는 문제의 본래적 존재라고 일컬어진다. 즉, 문제의 존재를 본래 특징짓고 그것에 본질적인 그것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본질적이고 본래적인 존재는 또한 전체적인 것이기도 하다. 즉, 절연되어 있는 일체의 부분 관점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망라하는 그것이기도 하다. 그러 까닭에 철학적 사유는 그것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묻는다. 이것은 전체로 보아 본래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무엇인가? 이 문제의 존재와 진리와 본질적 특성은 어떠한 것인가? 마침내 그것은 이렇게 묻기까지 한다. 존재와 진리와 본질은 전반적으로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간략히 말해서 철학적 사유는 숙고되어야 할 것의 존재를 질문하면서 추적하여 이 존재와 관계한다. 즉, 사유의 자유를 호출하고 의무 지우고 책임 지우는 존재자의 존재에 응한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즉, 사실들을 확인하고 정밀과학들의 경우에서처럼 확인된 사실들을 체계화하는 것이 문제에 매여 있는 사유의 또 다른 방향이다. 이점에서 그것은 마찬가지로 상당한 정도로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는 본래 또한 사실들이나 사물들 또는 사실들 및 사물들의 연관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것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하는 과학적 사고는 이것 또는 저것이 이러저러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것은 사실적인 “그와 같이- 있음” So-Sein의 파악할 수 있는 요소들에 상당히 의지하는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물음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본래 무엇인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기저에는 무엇이 본질적인 것으로서 있는가? 매우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요소들에서 개별적으로 파악되는 그것은 전반적으로는 무엇인가? 이것은 그 본래적 본질에 있어서 무엇인가?
그래서 확인하는 사고는 참으로 필요한 사실과학들에 이르게는 하지만, 철학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종교의 영역에서 그러한 사고가 적용된다면 그것은 종교학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안중에 둔다는 것은 종교철학을 위해서는 언제나 유익하고 심지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철학으로서의 종교철학은 또한 이와는 다른 어떤 것이다.
존재하는 그것의 확인할 수 있는 개개의 특징들이나 특성들을 확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개별 과학들의 과제이지 철학이 아니다. 철학적 사유는 자연이나 역사에서 또는 그 밖의 어느 것에서이든 어떤 개개의 특징들이 확인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상세히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이나 역사 또는 그 밖의 어느 것이든 이것이 본래 전체적으로는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학 學으로서의 역사 Historie에 있어서 역사적임 Geschichtlichsein이 그렇듯 자연과학들에 있어서 자연의 존재 그 자체는 좀처럼 주제가 되지 않는다. 그 반면에 그러한 사정들은 바로 철학적 사유의 주제를 이룬다.
4. 본질적 존재와 비현실적 존재
숙고되어야 할 문제의 본래적 존재인 그것에 대한 사유의 질문에는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그 이외의 특징이 불가분하게 결부되어 있다.
숙고되어야 할 문제의 존재를 숙고한다는 것은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존재와 비본래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 사이의 구별에 대한 비판적 물음을 포함한다. 존재의 대한 사유가 만일 이 구별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단순한 사실성에 매여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겠다. 그러나 이것은 사유의 경우가 아니다. 철학적 사유는 사실적인 것을 조망함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본래적인 존재와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존재와 진리는 사실적인 것의 척도들이라는 그것들의 근본 특징을 그 자체로 갖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적인 것은 그것이 그 본질 또는 그 본래적 상태대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측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사실적인 것은 그 존재 또는 그 진리에 의해서 비판적으로 특징지어진다. 그 까닭에 철학적 사유는 사물들을 그것들이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그저 받아들일 수는 없다. 철학적 사유는 그것이 사물들의 존재를 묻고 이렇게 해서 그것들의 진리와 본질을 질문하면서, 사실적인 것이 거기에 따라서 측정되어야만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이 이 사실적인 것과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동시에 묻는다. 따라서 어떤 문제나 어떤 문제 영역을 철학적으로 숙고한다는 것은 또한 언제나 비판적인 숙고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비판을 가능케 해야 하며 본질적 존재와 본질적인 존재관계의 발견으로부터 논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철학적 사유의 논증 방식
이로써 철학적 논증들이 왜 개별 과학들의 논증들과 같은 종류의 것일 수 없는지 또한 명백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들은 “발견-됨”이라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성으로 말미암아 결정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사실성은 방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상호주관적으로, 학문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발견될 수 있고 확인될 수 있는 사실 이상의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곳에서는, 본질과 존재가 고려되는 곳에서는, 또 여기에서부터 사실적인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척도들이 쟁취되는 곳에서는 그러한 사실성은 복원될 수 있는 일체의 상호주관성에 대해 더 이상 똑같은 것일 수 없고 또한 더 이상 의미있는 것도 되지 못한다.
이것은 철학의 사고 과정들이 왜 개별 과학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논증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기 쉬운가라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사유는 이미 말했듯이 자기 방식으로 문제에 매여 있으며 논증적으로 있다. 그것은 자신의 방식으로 엄격한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문제에 매여 있는 그것의 논증은 근본적으로는 철학적 사유가 세계의 현상들에서부터 그것에 마주해 오는 본래적 존재를 발굴해 내고 찾아 내어 이를 개념화하고 언어화하면서 그것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순히 실증적으로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유가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발견해 내는 것이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다. 만일 그것이 발견되었다면, 물론 이렇게 발견된 본래적 존재를 사유하면서 보아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보여졌다면, 그것을 개념 안에서 발굴해야만 한다. 철학적 사유에 의해서 찾아내진 것을 사유하면서 보고 또 발굴하면서 파악하는 데에 철학의 본래적 논증이 있다. 그것의 근거들은 문제의 관점에서부터 명백하게 되었고 명백해질 수 있었던 것에 있다.
자연이란 본래 무엇인지 또는 예술이란 본래 무엇인지 또는 종교란 본래 무엇인지를 우리는 왜 사유함으로써 분명히 하여 인식할 수 없단 말인가? 왜 그것은 언어화되어 재차 다른 사람들을 비출 수 있을 정도로 인간에게 명백하게 되고 분명해지지 말아야 하는가? 철학적 사유의 엄격함이 성공적으로 명백한 언어가 되었다면, 그것 자체는 할 수 있는 한 그들 자신의 힘으로 보아야만 하는 다른 이들에 대해 재차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덧붙여 늘상 다음과 같이 말해져야만 한다. 아무도 꼭 이 방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외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강요될 수 없다. 사유하면서 봄과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본질적인 철학적 사유의 논증 성격은 그것의 문제로 말미암아 강요될 수는 없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단순히 임의적인 어떤 것이라는 의미로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의 문제가 “자기-스스로를-알림” 에 직면하여 그것은 정당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점에 그것 고유의 엄격함이, 근본적으로 그것의 증명과 논증들이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사유하면서 그리고 “함께-생각하면서” 철학적 사유의 방식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자명하다. 둘 다 요구된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6. 철학적 사유의 종결될 수 없는 것
그러한 철학적 사유와 사유하는 논증이 종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 또한 이와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결정적으로는 결코 종결되지 않으며 자신의 문제를 끝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존재자의 존재는 사유함의 파악방식에는 고갈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철학적 사유가 이렇게 종결될 수 없음은 사람들이 언제나 새로운 철학적 길들을 간다는 데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날의 철학적 길들, 예컨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생각들이 늘 되풀이하여 새로운 관심을 끌게 된다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함께 생각하면서 그것들과 더불어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들을 통해서 늘상 새로운 것을 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동시에 그는 그 자신의 새로운 사유의 길들을 더 잘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진정으로 철학적인 생각들이란 결코 완전히 시대에 뒤진 것이 아니지만, 또한 완전히 완성된 것도 아니다. 이점에서 그것들은 정밀과학들과 기술의 발전이 갖는 역사성과는 아주 다른 완전히 고유한 종류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갈되지 않음은 곧 극복될 수 있는 철학의 어떤 불완전함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철학의 본질에 속한다. 이점에 있어서 그것은 마찬가지로 옛 것이 결코 시대에 뒤지지 않고 새로운 것이 결코 결정적으로 최종적인 것이 아닌 예술과 비슷하다.
이것은 재차 철학의 문제와 사유함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존재자의 본래적 존재는 고갈되지 않는, 질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매번 새롭게 접근할 때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만, 그 어떤 접근으로도 모든 것이 다 나타나지는 않는다 사유함의 길들은 그것들이 실현되는 한에 있어서 언제나 제한되어 있다. 존재자의 존재에 의해서 사유함에 열려지는 그 가능성들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철학은 사유함을 요하는 것을 늘 새롭게 맴돈다. 늘 새롭게 맴돌면서 그것의 문제를 이렇게 접촉함에 있어서 철학은 결코 결말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결코 비생산적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보에티우스 는 철학이 감옥에 갇힌 그에게 어떻게 위로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묘사하였다. 그러한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남자에게는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며, 그에게는 심지어 무한하고 건설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고, 그의 동반녀를, 말하자면 별볼일 없는 것으로 내려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그러한 만남이 그에게 풍부하게 선사할 수 있는 바로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게 되 것이다.4
같은 이유에서 플라톤적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지혜 sophia와 구별하였다고 하였다. 즉, 그것은 사랑하면서 완성을 열망하는 것이지 완성 그 자체가 아니다.5 이 의견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뒤를 따랐음을 우리는 그의 형이상학에서 찾아 읽을 수 있다.6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한 바대로 철학적인 사유함의 몇 가지 특징들에 주목하게 하는 데에는 이상의 것으로 우선은 족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해석된 특징들은 대단히 임시적인 것이고 또한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맥락으로서는 그것들은 충분할 것이다.
2. 종교철학의 의미에 대해
1. 사유의 문제로서 종교
종교철학이란 종교를 자신의 문제로 삼고 따라서 종교의 본질과 존재방식을 그러한 사유를 통해 밝히려고 노력하는 철학적인 사유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철학은 사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파고든다. 종교, 그것은 본래 무엇인가?
2. 종교와 인간의 사유
종교철학이 그것의 문제, 즉 종교를 숙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철학적 사유에 종교가 우선 주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 이 단순한 사태는 종교가 전적으로 자신의 뿌리에 존립해 있고 또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있다. 종교들의 세계를 잠시만이라도 일견해 봄으로써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기원들을 일견해 봄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알 수 있다. 종교는 분명히 철학적 사유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며, 철학이 그것을 명확히 동반하지 않고서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때때로 심도있게 영위되어 왔다. 그러니까 종교는 전혀 철학이 아니며, 오히려 찰학의 타자이다.7
그렇다면 철학은 어쩌면 종교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 같지 않은가? 아니면 결국에는 심지어 위험스럽기까지 한 것은 아닌가? 파스칼이 살았던 시절 이래로 철학자들의 신은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신과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의 하느님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과는 어느 정도 예리하게 대조된다. 변증신학 辯證神學 은 인간편에서 구상되고 따라서 그 기원이 인간의 사유의 덕분인 그런 종교에 대적해 투쟁하였다.
그것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종교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관계는 무엇인가? 종교적 삶은 철학에 대해 다양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철학에 의해서도 영향받고 함께 형성되었다는 사실 역시 여하튼 알 수 있다. 서양의 역사와 서양의 그리스도교 및 그 신학의 역사는 이 연관과 교환에 대한 풍부한 예들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연관을 보는 바로 거기에서 그리스도교, 즉 비록 배타적으로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방향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종교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비록 언제나 똑같이 명백하게 의식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자신의 기원을 늘 의식하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종교는 전적으로 철학적 사유의 타자로서, 그것과 마주하고 그것보다 이전의 것으로서 그것을 만난다. 그러나 종교는 그것이 아무리 자신의 기원으로부터 살아가고 그것이 어쩌면 신의 선물일지라도 인간적 사건과 인간의 생 및 현 존재의 형태로서 실행된다는 사실이 환기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전망 안에서 생긴다. 신앙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위한 집회를 열거나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과 현존재의 지평 안에서 실행되는 것은 또한 인간의 자아 및 존재이해의 지평 안에서 실행된다 사람들은 예컨대 신에 대한 그들의 신앙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리고 – 비록 명확한 것은 아닐지라도 – 신을 신앙한다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인간의 자아 및 존재이해는 종교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생동적이다. 종교가 생동적으로 존재하는 거기에는 그것이 아무리 위로부터의 선물이며 이로써 자신의 기원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매번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존재하는 그것으로써 이해하는 인간적 이해 안에서 언제나 살아간다.
인간이 그의 자아 및 존재이해를 사용한다면, 종교,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그는 묻는 것이며, 그리고 사유하면서 이 물음에 전념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라는 것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면서 사유함은 철학적으로 사유함이다. 이 이유에서 종교에 대해 철학적으로 사유함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든 종교가 인간에 의해서 이해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가능하다.
이 연관은 인간이 왜 그 자신의 신앙에 대해, 그 자신의 예배와 그 자신에 의해 생활화된 그의 종교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맹목적으로 그리고 적당히 아무런 생각 없이 검토해 보지도 않고 그러한 것에 자신을 내어 맡겨서는 안 된다. 물론 인간이 종교를 스스로 생산해 낼 수는 없다. 그러나 종교가 인간의 자아 및 존재이해의 매개 안에서 인간적 현존재의 한 형태로서 실행되는 한에 있어서 그는 그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이다.8
인간의 자아 및 존재이해가 종교에서 특유의 방식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의 언어 안에서, 인간적 범주와 사유 가능성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며, 인간적 실행의 형태들 안에서 영위되는 것이다. 오로지 그러한 이유에서만 종교가 인간의 자아 및 존재이해의 역사적 변천에도 그것의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종교는, 비록 그것의 자아이해의 출처인 신의 불변적이며 인간의 역사를 넘어서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이고 때로는 너무나 인간적인 역사를 가진다는 아주 명백한 사실이 설명될 수 있다.
바로 이 이유로 인간은 늘 반복해서 새로이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으며 또 물어야만 한다. 종교, 그것은 본래 무엇인가? 그리고 특히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고 또 묻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생의 형태로서 실행되는 나의 종교, 그것은 무엇인가? “이다”Ist에 대한 물음은 인간의 존재이해에서부터 생겨나는 커다란 질문이다. 그것은 그것이 문의하고 있는 문제가 비록 철학의 바로 그 타자이고 그 자신의 뿌리에 존립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구조상 철학적 물음이다.
따라서 종교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가능하다면, 종교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 뒤따르는데, 더욱이 자유로운 인간의 사유의 물음으로써 그렇게 제기된다. 종교 역시 그것이 인간의 사유 안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단순히 사실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종교와 관련해서 인간의 사유의 폭에 사실적인 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철두철미 그것의 본질과 같은 어떤 것이 출현한다.
이 점들이 종교철학을 언제나 가능케 하는 사정들이다.
3. 종교에 대한 철학적 반성의 시간
가능한 것은 물론 무조건 필연적인 것도 아니다. 종교의 본질에 대한 사유의 명시적 물금과 이 물음을 체계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확실히 어떤 경우라도 부득이하거나 예고된 것은 아니다. 종교는 명시적인 철학 없이도 그것의 생을 형성해 나갈 수 있으며, 흔히 철학이 동반되지 않고서도 살아왔는데, 특히 종교적 삶의 초기의 강력한 시원적 始原的 단계들에서 그랬다.
그러나 종교가 더 이상 초창기의 시원적 강도를 갖지 못했음에도 사유는 반성으로서 강력하고 자율적으로 전개되어 나갔을 경우에, 종교철학은 예고된 것이며 아무튼 역사적 의식의 그러한 상태와 관련해서 부득이한 것이다. 그럴 경우에 인간은 종교인 그것을 스스로에게 비판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해당된다. 종교와 그리스도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더 이상 인간의 보편적 현상들이 아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여전히 종교와 신앙이 존재하며 또 널리 만연된 생각과는 달리 마르크시스트인 가르다프스키의 다음과 같은 말에 동의할 수 있다: “신은 완전히 죽지 않았다.”9
그러나 물론 종교와 신앙과 그리스도교는 이전의 자명성을 사실하였으며, 현대사회와 현대의 문화적 의식 안에서의 그것의 위치는 상당한 곤경에 처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 숙고하지 못할 또는 더 이상 숙고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못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수된 그들의 종교적 표상들의 옛 껍질을 떠나버린, 그러니까 종교가 그것의 장소에 다소간 아직 머물러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것과 갈라선 이들을 위해서도 위기적인 상호아이 되어버린 바로 그런 시대에 그와는 반대로 다음과 같은 물음이 강화되고 더욱더 비판적으로 면밀하게 제기되고 숙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종교, 그것은 본래 무엇인가?
이 특별한 시대사적 상황에서 철학적 사유가 숙고되어야 할 것의 본래적 존재와 본질 그리고 또한 그 권리에 동시에 전념할 수 있고 또한 전념해야 한다는 것은 결정적이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종교라는 단순한 사실 이상의 다른 것이 이전보다는 더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종교의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비판적으로 종교의 존재와 본질 및 권리에로 자주적이고 사려 깊게 파고들어가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종교의 본질적인 것이 성공적으로 조망된다면 사실적인 것이 그에 따라 측정될 수 있고, 또 측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척도들이 거기에서 얻어질 수 있고 또 얻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가 더 이상 자명한 것이 못 되는 시대에 더욱더 그렇다. 그럴 경우 또한 종교의 영역에서도 있을 수 있는 부당함과 무의미에 대해 종교의 권리와 의미를 해명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가능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또한 비종교와 비신앙의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는 부당함과 무의미에 대해 그것을 해명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가능해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적인 종교에 대해서도 만연되어 있는 실제적인 비종교에 대해서도 철학적으로 비판적 토대를 얻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어느 한쪽도 검토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여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의미에 있어서 이성의 광장 앞에서의 종교의 권리가 문제가 된다.
4. 종교에 대한 종교철학의 위험과 유익
물론 종교철학에 대한 종교편에서의 이론 異論들도 있다. 철학이 종교에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지는 않은가? 종교는 그 자신의 기원을 가지고 잇는데, 이성과 이성의 철학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에 참견토록 해도 좋은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철학이 부당하게, 즉 그것의 문제의 의미에 반해서 종교에 참견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종교에 대해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철학이 바로 이 문제를 그에게 미리 주어져 있는 것으로서 존중하고 이렇게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을 그것의 본질과 관련하여 해명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 되지 않는다. 이성과 이성의 철학은 그것들이 종교를 그냥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인간 사유의 자율적 힘으로 그것을 자유롭게 구성해 내거나 파괴까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확실히 부당한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성과 이성의 철학이 종교가 미리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주어져 있는 것으로서의 종교를 인간의 자아 및 존재이해의 힘으로 뒤따라 구성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부당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인간의 그 자아 및 존재이해란 종교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요소인 것이다. 이 의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종교의 본래적 존재와 본질을 고려해 이미 주어져 있는 종교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이다.
그러한 철학적 재구성은 – 만일 그것이 올바로 행해진다면 – 종교에 유익할 수 있을 뿐이며 도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당연히 그렇게 비판적일 경우에 더구나 특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의 본질적 특징들에 대한 그리고 본질과 폐해의 비관적 구분에 대한 그 자신의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교 자신의 자기 및 존재이해에 따르면 종교는 당연히 인간에 의해서 비판적으로 책임지어져야만 한다. 바로 이점이 또 다른 한편으로 철학이 존재 및 자아이해를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해석하는 한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철학의 역량에 속하듯이 종교적 삶의 문제에 함께 속한다.
그런 까닭에 비판적인 철학적 반성을 단념하고 비반성적으로, 직접적으로 종교적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이 비판적인 철학적 반성을 단념한다면, 특히 종교의 시원적 힘이 약해지고 사유가 고도의 반성력을 갖게 되었을 때에 종교는 쉽사리 그것의 본질에 더 이상 부합하지 못하는, 반성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은 제멋대로의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철학이 종교를 그리고 우리의 숙고와 관련해 특히 그리스도교를 전제로 하지만, 그러나 어떤 전제의 형식으로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할 것이다. 철학적 조망에 대해서 종교는 이 조망이 사유하면서 관련을 맺는 문제 영역으로서만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성을 위한 그것의 권리와 본질은 비로소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때문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자명한 것처럼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아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신학과 관계되는 것일 터이다. 왜냐하면 신학은 직접적으로 신학적 전제들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철학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철학으로서의 종교철학에서는 사유에 이미 주어져 있는 종교 사실이 사유의 자유와 자력 自力으로 숙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종교와 그리스도교는 사유하는 자 자신의 전제들일 수는 있다. 그는 아마도 신앙에 의거해서 그리스도교의 소식을 그의 삶의 기초로 삼았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바로 이 경우에라도 사유하는 자는 자신의 사유의 자유로운 힘을 여전히 지닐 것이고, 또한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유함의 이 자유로운 힘, 즉 종교의 문제에 대해 그것이 적절한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3. 종교의 예비 개념
1. 신에 대한 인간의 관계로서의 종교
시사된 의미로써 종교철학이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종교를 조망하고 이 조망 안에서 종교의 예비 개념 을 구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는 철학적 사유가 어떤 문제 영역을 다루어야만 하는지 이미 그 발단 發端에서부터 알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시작에서부터 곧바로 사유함의 필수적인 조처들이 생각되고 계획성 있게 정돈될 수 있기 위함이다.
종교라는 말로써 오래 전부터 이해되어 온 것은 신에 대한 인간의 관계 내지 또한 신적인 것의 영역에 대한 관계이다. 이 이해는 아무튼 종교에 대한 임시적 이해로서 여전히 수용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오늘의 우리의 비판적 의식을 위해서 그것의 모든 술어들, 즉 인간-관계 그리고 특히 신이나 신적인 것의 영역이 더 자세히 설명될 필요가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모든 것이 질문될 수 있다. 인간은 본래 무엇인가? 신은 본래 무엇인가? 신과 인간 사이의 연관은 본래 무엇인가? 우리가 종교라고 일컫는 전체는 무엇인가? 이 전체의 본래적 본질은 무엇인가?
우선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근본적인 사정에 주목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의 예비 개념에서 신 또는 신적인 영역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언급될 경우, 그것으로 우리는 우선 어떤 일정한 인간적 현존재 방식에 유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현존재와 그의 실행의 방식은 우리가 종교라고 일컫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살아지는 장소이다. 사람들은 종교적 관계에서 아주 일정한, 즉 종교적 방식으로 태도를 취한다.
사람들이 신 또는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태도를 취할 때에 우선 사람들은 그들이 신적인 것에 의해서 말 건네졌다고 알고 있으며, 따라서 신에 대한 인간의 관계 내에서 인간에게 태도를 취하는 것은 먼저 신이다. 신이 먼저 인간에게 태도를 취한다면 이것은 인간이 “그-스스로-태도를-취함” 내에서, 인간 현존재와 그의 자아이해 내에서 생긴다. 이처럼 우리는 이 중요한 경우에도 인간 현존재의 한 형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종교에서 늘 발생하듯이 이 관계의 방향이 바뀔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경우에 인간은 그 편에서 신으로부터 건네진 말에 응답하면서 동의한다. 양편 모두, 신적인 것으로부터 건네진 말과 인간의 응답은 인간 현존재의 지평 안에서 생긴다. 이 의미에서 종교는 어느 경우이든 인간적 현존재의 방식이다. 그것은 신 또는 더 미확정적으로 말해서 신적인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크기에 의해서 자신이 규정되어 있음을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러한 현존재의 방식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자신과는 다르고 더 위대하고 또한 더 근원적인 어떤 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종교가 인간적 현존재의 방식을 뜻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현존재의 방식이 “초-인간적인 것”, 그러니까 신적인 것으로부터 독특하게 구성됨을 뜻한다. 이 구성은 상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종교적 삶의 방식 내에서 신 또는 신적인 것이 언제나 전체 태도의 일차적이고 기초적인 크기인 한에 있어서 그렇다.
그 때문에 종교철학에서는 비록 인간이, 즉 인간의 종교적 현존재의 방식이 문제이긴 할지라도, 혹은 오히려 바로 그러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인간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 말해질 수 있어야만 한다. 심지어 우선 인간의 타자 他者, 신적인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신이 우리가 종교라고 일컫는 인간 현존재 방식의 일차적으로 기초 짓는 그 요인 要因이기 때문에 그렇다. 신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현존재는 종교적인 것으로서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신적인 것과 신, 그것이 본래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철학적 개념 槪念을 구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한 후에 우리는 신의 신비가 인간과 관계되고 상관 있는 한에 있어서 인간이 이 신비에 대해 어떻게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가라는 물음을 가지고서 종교의 인간적 측면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에서 인간의 태도가 요구되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그것이 관계하는 것에 걸맞느냐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본질적인 종교와 공허한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처음부터 성립한다.
2. 종교의 내면성과 외면성
종교의 기준점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 그리스도교를 생각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종교 역사가 보고할 수 있는 종교의 다른 형태들도 덧붙여 함께 생각하고자 한다. 우리는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인간의 종교적 관계 또는 종교적 현존재의 형태를 우리는 그 밖에도 포괄적으로 이해한다. 종교적 현존재는 수많은 차원들에서 펼쳐진다. 예컨대 신앙이나 명상 같은 내면성의 차원들과, 예컨대 예배나 전도 등과 같은 외면성의 차원들이 거기에 속한다.
때때로 문헌에서 종교라는 낱말은 단지 외적인 것에 대해서만, 폴 틸리히 P. Tillich가 말했듯이 종교의 문화적 복장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사용된다. 10 이것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종교라는 낱말이 지닌 좀더 광범위한 의미로부터 출발한다. 그럴 경우에 그것은 종교적 태도와 종교적 관계의 모든 형태들과 모든 차원들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초기의 칼 바르트 K. Barth와 디트리히 본회퍼 D. Bonhoeffer에 의해서 구상되었듯이, 우리는 종교가 자신의 힘으로 신의 정의 正義를 획득하려는 시도로서 간주되어야만 하는 그 종교 개념에도 속박되지 않고자 한다.11 이 신학자들에게서 종교가 신학적 이유들로 인하여 비판적으로 다루어지는 한에 있어서 아주 특정의 종교 이해가 그 기저에 깔려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의 숙고들이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무튼 출발에 있어서 그러한 특정의 이해를 억제하고 여기에 속하는 현상들을 가능한 한 개방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3. 비판적으로 반성된 종교
그러한 철학적 숙고에서 종교의 존재방식과 본질이 성공적으로 개진되는 한에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규범적인 관점들도 포함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 종교는 한편으로는 종교철학보다 이전의 것, 즉 먼저 도착해 있는 것이며, 철학적 사유가 자신에 앞서 와 있는 것으로서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임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종교는 단순히 종교철학에 앞서 있는 것만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주어진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철학적 반성에서 그 주어진 것의 존재와 본질을 해명하고 척도들을 획득하면서 철학은 역시 종교의 영역에서 결과들 역시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끈질기게 결과들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관련해서 철학은 실천적으로, 다시 말하며 미래적으로 정향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철학은 한편으로는 종교보다 철학보다 나중에 오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철학의 비판적 기능에서 종교의 비판적 쇄신을 위한 유일한 척도들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특히 그리스도교와 같은 종교는 그 목적을 위해서라도 그 자신의 내적 원리들로부터 연역될 수 있는 완전히 다르고, 자신의 본질에 더 인접한 가능성들 에로 역시 되돌아가야만 한다. 그러나 이로써 이성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말하도록 불리어져 있다는 것이 방해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예비적 숙고가 의도했던 것은 종교가 더 이상 자명한 것이 못 되지만 비판적 반성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 시대에 실행될 수 있는 종교철학의 권리와 의미와 가능한 의의를 명백히 하는 일이다.
4. 현대의 철학적 상황에서 종교와 종교철학
종교철학도 그것에 관계하는 것, 즉 종교와 마찬가지로 시간과는 무관하게 진해하는 것이 아니다.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배경과 맥락에서 사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 역시 그것이 설령 반성 이전적 이전적인 것일 수 있을 경우에라도 모든 인간적인 것의 시간적 운명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그것들과 관련하여 종교를 고찰하고 숙고하고자 하는 그 현대사적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철학과 세계관
철학적 상황은 다양하게 서로 얽혀 활동하는 두 수준에서 규칙적으로 형성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됨에 있어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시대에 표명되었던 중요한 철학적 견해들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견해들은 누군가를 위해 그것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펼칠 경우에만 사회 전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철학적 상황의 또 다른 면이다. 철학적인 간결한 표현들 안에서 일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확신의 요소들이 예리한 개념에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적 특성은 그 편에서 다시 지배적인 확신에 폭넓은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는 공공의 세계관이 된다. 이 세계관이라는 말로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의 확신과 공공의 언어를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유포되어 있는 신념의 본보기들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널리 퍼져 있는 이 신념의 본보기들이 세계 내에서의 인간의 현존재 전체에 대한 한 해석이고자 하는 요구를 지니고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세계관으로서의 철학적 견해들은 이중적인 일반성을 지닌다. 철학적 견해들은 일반적 확신을 규정하는데,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이 일반적 확신은 그것이 살아가는 전반적 세계와 연관하여 그것에 따라서 입장을 취하게 된다.
철학적 상황의 이 두 가지 형태, 즉 만들어진 철학과 유포된 세계관으로서의 철학은 결코 서로 분리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를 철학적으로 다룸에 있어 그 현대사적 배경을 조금은 더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그 두 가지 형태들에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중요한 철학적 견해들은 두 개의 집단으로 요약된다. 그 중 한 무리는 현대의 정밀 경험과학에 맞춰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과학철학이다. 여기세 속하는 것은 특히 신 실증주의 新 實證主義 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일체의 것과, 또한 대다수의 철학적 언어학과 비판적 합리론이다. 또 다른 집단의 중요한 철학적 견해는 사회에 대한 비판에 전념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히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속한다. 이 두 철학적 조류들은 세계관 형성과 관련해서 공공의 확신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해 왔다.
2. 과학철학과 종교: 비트겐슈타인의 <논고>
우선 우리가 논할 것은 과학철학이다. 우리는 그것을 초기의 비트겐슈타인 Wittgenstein과 칼 포퍼 Karl Popper와 한스 알베르토 Hans Albert의 예들에서 설명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세계관 형성의 요소에 특히 유의할 것이다. 과학철학에는 일반적으로 신과 종교 또는 심지어 종교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전형적으로는 어떤 관심도 일으키지 못하는 대상들이다. 이것들이 왜 그러한 것인지 우리는 유념해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종교가 이 영역에 전형적으로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게다가 그와 같은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혐의마저 받는지 유념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논고 論考>12 의 초기 비트겐슈타인에 맞추어 우선 방향설정을 하겠다.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여전히 과학철학의 고전적 표현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논고>가 끼친 역사적 영향을 말해준다. 비트겐슈타인 자신은 충분한 근거에서 <논고>의 관점을 나중에, 즉 <철학적 탐구들>13에서 극복하고 본질적으로 확장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비트겐슈타인을 좇아서 과학철학이라고 일컬었던 그것의 발전을 위해 <철학적 탐구들>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특히 <논고>이다. 그것은 기초적이고 말하자면 고전적 문헌으로 남아 있다.
<논고>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논고>의 명제 4.112 에서 “생각들의 논리적 설명”이 철학의 목적으로서 제시된다. 그리고 더 계속해서 “철학은 학설이 아니라 활동이다. 철학적 작업이란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성립한다. 철학의 결과는 “철학적 명제들”이 아니라 명제들이 명백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해되는 바대로 철학은 “생각들”, 즉 명제들과 관계가 있게 된다.14 이 명제들은 스스로 철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의 전제이며, 철학적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의 영역이다.
따라서 철학이 해명하고자 하는 그 명제들은 “어떤 사태의 묘사”15 이다. 명제는 “사태들의 성립과 그것들이 성립되지 않음을 표현한다”.16 그러나 사태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진다. “경우인 그것은 사실 Tatsache이며, 사태들의 성립이다.”17
사실들의 전체는 세계이다. 그러므로 <논고> 1.11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계는 사실들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으며, 그것은 일체의 사실들이다라는 것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철학이 관계하는 명제들은 사태들을 묘사한다. 그리고 참 명제들의 전체는 사실들의 전체, 즉 세계를 묘사한다. 그러나 참 명제들의 이 전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참 명제들의 전체는 모든 자연과학(또는 자연과학들의 전체)이다.”
따라서 그러한 언명들에서 표현되는 철학은 정밀 자연과학 내지 자연과학들의 명제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그것의 유일한 목적으로서 인정한다. 그것은 사태들을 서술하는 고유한 언명들의 의미로는 아무런 명제들도 개진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과학적 명제들이 사태들이나 사실들 또는 세계의 전체를 서술하기 때문에 철학은 그러한 명제들 전체를 주시한다.
신과 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입장에서 불 때 전적으로 필연적인 결과이다. 왜냐하면 사실들 내지 사태들이 과학의 유일한 대상이며 과학의 중재에 의해서 또한 그와 같이 이해된 철학의 유일한 대상이라면, 사태들은 그것들의 규정 안에서 파악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파악될 수 있고, 심지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고 말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그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그것들은 그것들의 규정들 안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정된다는 것은, 특히 측정될 수 있게 규정된다는 것은 아무튼 한계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유한성을 의미한다. 사태란 그것이 한정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 파악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한계 없는 것 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제한적인 것은 측정될 수 없는 크기들이다. 따라서 이 철학의 밑바닥에 놓여 있는 사태들은 그 근본적인 발단으로부터 유한한 사태들이다.
사실들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사태들이다. 그것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필연적으로는 추론될 수 없다. 그러므로 비트겐슈타인이 안중에 두었던 자연과학들은 원칙적으로 경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살들은 연역될 수 없는 것이며, 경험으로부터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이점 역시 정밀과학과 과학철학의 근본 관점들에 속하는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밀과학과 연관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에 대해 사람들은 그가 무한하고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결과적으로 과학과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진 철학의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은 결코 조망될 수 없으며, 따라서 종교는 가능한 대상 영역이 되지 못한다.
<논고>의 입장과 가까운 <윤리학 강의>(1929)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이 사태를 힘주어 강조한다. 거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윤리적 및 종교적 언명들이 “의미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있다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은 비트겐슈타인이 <논고>에서 <윤리학 강의>에서도 그의 종교적 감각과 종교에 대한 그의 깊은 존경심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인상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서 개진된 의미로서는 철학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있는 언어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완전히 그 발단에서부터 비롯된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비록 종교 또는 – 비트겐슈타인이 앞서 언급된 곳에서 말하였듯이 – 신비적인 것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할지라도, 종교와 종교철학이 의미가 없다는 혐의는 철학의 근본 입장에서 논증된 것처럼 보인다.
그 때문에 무의미의 혐의는 정밀과학을 그것들의 성찰의 영역으로 삼는 한에 있어서 다른 철학적 구상들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그것들은 개별적으로는 상이하게 강조되고 있다.
3. 과학철학과 종교: 칼 포퍼
현대의 정밀과학의 입장에 기초한 철학은 비트겐슈타인의 <논고>를 넘어 그 이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대한 뛰어난 실례는 칼 포퍼의 유명한 저서 <탐구의 논리>이다. 포퍼는 우리의 지식의 성장 또는 발전을 그의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포퍼가 분명하게 말했듯이 그의 선택은 각별한 어떤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로서 다른 가능성들 역시 열려 있으며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 언급된 것이다. 사유의 지평은 비트겐슈타인의 경우에서처럼 근본적으로 열려져 있는 것이다.
그것의 발전이 탐구되어야 할 과학들이라는 말로 여기에 이해되는 것은 경험과학들인데, 그 전형은 재차 현대물리학이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논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철학이 경험과학에 속함을 보게 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논고>를 벗어나 포퍼는 그의 (경험-과학적) 탐구논리를 이론 형성의 한 이론으로서 개진한다. 이론 형성에 관한 이 이론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일체의 이론들에 대하여 그것들이 허위일 수 있음이 요구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보편명제들 또는 명제 체계들로서의 이론들은 포퍼에 따르면 허위일 수 있어야만 한다. 즉, 그것들은 상호주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험에 의해서 반박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포퍼에 따르면 어쩌면 논박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명제들은 경험의 명제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특히 주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들은 또한 기초명제들이라고도 일컬어진다.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 표현되는 그러한 기초명제들은 그것들이 보편명제들의 가능한 논리적 추론들을 제시하거나 그러한 추론들을 거부할 경우에만 그러한 보편명제들의 이론이나 경험을 논박할 수 있다.
이 숙고들 중에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비트겐슈타인의 <논고>에서처럼 여기에서도 인식이란 근본적으로 규정되고 따라서 제한되고 또한 사실적인 것의 규정으로서 전제된다. 이론들은 그것들이 당연히 의미있는 이론이어야만 하는 한에 있어서 오로지 참으로 그러한 성질의 것에만 관련되는 명제들 혹은 명제 체계들이다.
규정되고 그것의 규정에서 제한된 것과 사실적인 것이고 따라서 “필연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다려야만 하는 것 – 이것들은 근본적으로는 신을 고려하지 않는 전제들이다. 왜냐하면 신은 종교에서 언제나 무한하고 그 무한성으로 말미암아 파악될 수 없는 자로서 그리고 절대적이고 그 절대성으로 말미암아 단지 사실적인 것 그 이상인 자로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신에 대한 이론 역시 또 이와 더불어 가능한 종교철학이란 칼 포퍼가 의미하는 그러한 과학적 이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한스 알베르트의 비판적 합리론
정밀과학을 기준으로 한 철학의 또 다른 형태는 한스 알베르트가 의도하는 비판적 합리론 Kritischer Rationalismus에 의해서 제시된다. 비판적 합리론은 그것이 경험도 또 거기에 속한 이론 형성도 근본적으로는 틀릴 수 있고 따라서 끊임없이 비판될 수 잇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에 있어서 신실증주의의 범위를 넘어선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진리로서 제시된 명제들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이용하여 진리에로 다만 지속적으로 다가가는 접근만이 있을 뿐이다.
이 숙고는 특히 이른바 뮌히하우젠의 상호모순된 세 가지 결론에 대한 논증을 적용하여 지지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이 일체의 명제들을 의심의 여지가 없게 확실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해 어떤 논거를 요구하고자 한다면, 결국 그들에게 남겨진 할 수 있는 일이란 실제적으로는 실행될 수 없는 논거들의 무한한 후퇴, 또는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논리적 순환, 또는 마침내 어떤 특정의 지점에서 그러한 절차를 중단하고 이 특정의 지점이 확실한 기초를 형성한다는 자의적 恣意的 선언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일 뿐이다.
특히 이 세 가지 가능성들 중에서 세 번째의 것, 이른바 독단주의 獨斷主義 혹은 특정의 위치에서 다소간 자의적으로 확정지음이 비판적으로 탐구된다. 그것은 모든 종교적 또는 종교철학적 체계들의 주요 오류라고 주장된다.
실제로 종교 및 이와 더불어 또한 종교철학에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 속한다. 비판적 합리론에서는 그러한 것이 방법론적 이유들에서 의심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되어야만 한다. 논거에 대한 요구나 또는 사람들이 그것을 좌우간 어떻게 이해하고자 하든 간에 원인문장 原因文章 은 그것이 철저히 실행될 경우에 사정에 따라서는 어려움들을 안겨준다고 해서 이미 무의미한 것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 우선 뮌히하우젠의 세 가지 딜레마의 당혹스런 논증에서 생겨나는 그 어려움들은 그것들 편에서 이 세 가지 상호모순된 결론에서 사용된 논증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전제들에서 전적으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논증에 있어서 진리란 여기에서 언명들에 걸맞은 한 가치이다. 언명들과 그것들의 진리 내지 비진리는 모두 똑같은 수준에서 인식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체의 언명들에 대해 충분한 논거를 요구하는 명제는 언제나 동일한 수중에서 인식되고 있다. 그 때문에 형식상 동일한 언명들이 어쩔 수 없이 무한히 연속된다는 착각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나 언급한 전제들이 맞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것들에 의해 언명된 것에 대해 여기에서 전제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관계에 있는 언명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 충분한 근거의 표현이 언제나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둘 다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한스 알베르트가 제시하는 논증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업는 것이 못 된다. 그렇지만 종교철학이 만족할 만하게 추진되어야만 한다면, 명제들과 또한 충분한 근거의 명제가 질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어야만 하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이하에서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덧붙여 한층 더 근본적으로 언급되어야만 하는 것은 한스 알베르트가 의도하는 언명들은 경험과학들의 언명들에서 그 모델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것들에서 근본적으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제한되고 사실적인 존재자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하는 언명들이다. 그러나 앞서 논했던 견해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절대자는 이로써 그 발단에서부터 이미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판적 합리론 역시 원칙적으로 그것의 숙고들의 영역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이 숙고들이 일체의 가능한 언명들과 관계한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 거명된 철학적 구상들은 그것들이 어떤 출발점, 즉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존재자를 선택하고 다른 것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 점에서 모두가 공통된다. 특히 비트겐슈타인과 칼 포퍼에게서 분명한 것은 그로써 상이한 가능성들 중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음을 이들 사상가들이 의식하고는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사상가들이 제시하는 사고상 思考上 의 구상의 한계 내에서는 이 관점이 실종되고 있다.
거명된 철학들에 대해 특히 언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것들이 유포된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의미로써 대단히 폭넓은 영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 섬세하게 구별될 수 잇는 것들이 생략되고 방법적-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서술될 수 있는 것이 전체이다라는 확신이 유포되게 된다. 오로지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이 있을 뿐이며, 예컨대 시사되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 표명될 수 있는 의미있는 진술들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 유포된 세계관적 생각은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제시된 유형의 철학적 구상들은 모두 그것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 취급될 필요가 잇는 모든 것이며, 그밖에 또 다른 차원들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종교와 종교철학은 아무튼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 배경에서 그것은 앞서 논했던 철학들의 발단에서부터는 이미 고려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어떤 차원이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게 된다. 이 증명에 오늘날 종교철학의 특히 중요한 과제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적극적으로는 과학철학들에 의존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도정 道程에서 그 자신의 차원을 나타냄으로써 이 철학들과 적극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
5. 비판이론과 종교
우리는 여기에서 특히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학파, 즉 그 중에서도 테오도르 아도르노 Theodor W. Adorno, 막스 호르크하이머 Max Horkheimer와 위르겐 하버마스 Jurgen Habermas에 의해서 개진되었던 비판이론 Kritische Theorie에로 넘어가 이를 잠시 고착해 보도록 한다. 이 비판이론은 그것이 현대의 과학적 확신에서 태동된 철학과 논쟁적으로 거리를 두는 바로 거기에서 본래 그러한 확신을 전제하고 있다. 1960년대의 이른바 실증주의 논쟁은 두 방향들이 서로 구별됨과 마찬가지로 함께 속해 있음을 입증한다. 논쟁은 위르겐 하버마스가 칼 포퍼의 견해들을 그의 관심사를 위해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간주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비판이론은 광범위하게 세계관을 형성하면서 영향을 행사한 또 다른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의 맥락 안에서도 중요하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영역을 넘어 공공의 확신에로 파고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현대적 삶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그 정립된 입장들과 본보기들을 야기시켰다.
비판이론은 대체로 실천적 목표를 갖고 있다.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성적이고 성숙한 인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이다. 그래서 비판이론은 전반적으로 실제 實際와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방법은 구체적인 역사적-사회적 관계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의 밑바닥에는 사회가 그 테두리 내에서 모든 개인의, 특히 과학과 그것의 철학의 의미가 인식되어야만 하는 더 커다란 전체이다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 점에 있어서 비판이론은 처음부터 상이한 형태들 안에서 전개되는 신실증주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지평, 즉 사회적 삶의 지평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 의미에 있어서 전체, 즉 사회적 연관들의 분석은 이 연관들 안에서 극복되고 부정되어야만 할 것을 노출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부정되어야만 할 것과 여기에서부터 추론되는 부정적 변증법을 이렇게 노출시킴으로써 이 이론은 각기 현재의 상태의 한계를 극복되어야만 할 것으로서 비판적으로 지시해 보이는데, 이것은 실제 안에서 비로소 도달될 수 있는 더 나으니 미래를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하여 비판이론은 종교를 일반적으로 도외시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칼 마르크스 Karl Marx와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흐 의 종교비판에 대한 그의 관계를 추종하든가, 아니면 종교가 똑같이 관심을 유별하는 사회적 분석의 한 영역으로서 함께 고려된다. 특히 막스 호르크하이머는 자주 그것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종교를 다루는 주된 관점은 그 경우에 다시금 사회적 전체 맥락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의 관점이다. 그리고 이 사회적 전체 맥락은 다시금 억압과 해방의 변증법이라는 주도적 관점 아래 주로 고찰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관적인 광범위한 영향을 행사하는 비판이론은 신실증주의에 비해서 더 폭넓은 지평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더 폭넓은 지평에 대해서도 그것이 실제로 전체적인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으면 안 된다. 과연 일체의 인간적 관계들이 사회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조건이 유념될 수 있어야만 하는 그 유일한 관점인가? 그것 역시 재차 당분간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아마도 무제한적인 더 큰 전체 안에서의 한 측면일 뿐이 아닐까? 바로 그 비판이론 역시 여러 주어진 가능성들 중에서 그것의 관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일체의 인간적 관계들이 사회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이 중요하더라도, 그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들 역시 함께 숙고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와 종교철학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물음이 다름아닌 비판이론을 고려해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비판이론과 또 이와 유사한 견해들은 우리에게 종교가 어떻든 사회적 차원도 갖고 있으며, 그 편에서 비판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사실을 표현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종교는 그것의 출현에 있어서 그 안에서 그것이 매번 나타나는 그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조건 지어져 있다. 종교는 스스로 사회들을, 예컨대 교회들로, 형성하며 그 안에서 그것이 매번 살아가는 더 큰 사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한다. 종교는 실제로 사회적으로 관련에 있다.
그런 까닭에 종교철학은 오늘날 종교의 이 사회적 관련성을 고려해서 스스로 사회분석적이고 사회비판적으로 숙고할 동기를 갖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에 있어 사회적 차원은 유일한 차원이 아니며, 일차적으로 결정적인 차원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교가 사회적 측면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이 사회적 차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명제를 세우고 논증하는 것 자체는 종교철학에 속한다. 그것의 우선적 측면은 오히려 본래 종교적인 측면, 즉 신에 대한 인간의 관계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그것이 신앙으로서, 기도로서 또는 그 외 어떤 것으로서이든 이 관계가 영위되는 방식들이 연역되는 것이다. 이것들은 키에르케고르 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그것들의 본래적 근거와 그것들의 직접적인 본성에서 사회비판적 분석의 개입에서 벗어나 있는 우선적으로 실존의 관계들인 것이다. 종교의 이 중심에서부터 그것의 사회적 현상이 우선은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두 개의 기본 형태들의 논평 정도로 끝내기로 하자. 물론 그 밖의 많은 다른 철학들이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정도로 공공의 확신을 규정한 다른 철학들이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그것들은 오늘날의 종교철학이 그 앞에서 전개되지 않을 수 없는 일종의 배경을 형성한다.
종교철학이 현대적 확신에서 피력되는 견해들을 주시할 이유를 가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에 간단히 좌우될 이유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와 동시에 대체로 명백해진다. 종교철학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그 모든 견해들로부터 배워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롭게 그 자신의 길을 찾고 나서 동시에 물론 현대의 확신에서부터 제기되는 물음들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이 물음은 우리가 그것을 실행해 가면서 비로소 스스로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종교의 원리로서의 신
5. 신에게로 향한 첫 번째 노정 路程의 구상
종교를 신봉하는 인간은 자신이 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신과 관련되어 있음을 안다. 따라서 신은 거기에서부터 종교가 우선적으로 구성되는 그 단위 크기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이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주어져 있을 경우에만 그렇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주어져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을 리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명하지 않은 이 소여성 所與性[필사자 주: 사실이나 대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주어진 경험의 내용] 을 환기시키고 이를 가리켜 보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뜻 보기와는 달리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고 그를 “볼” 수 있는, 즉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들을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도가 성공할 경우에, 우리는 그러한 길들과 경험들을 토대로 아마도 신에 대한 한 개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마도 신 개념의 권리 역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이 우선 우리의 목표들이다.
이 의도는 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신의 증명이라는 표현을 피한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오늘날의 상황하에서는 현대의 정밀과학의 의미로서의 증명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트 이래로 그러한 신 증명은 당연히 반박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 관점에 기초한 한스 알베르트의 비판적 합리론의 비판적 견해와 마찬가지로 신에 대한 유포된 신실증주의적 무관심은 이 문제에 있어서 칸트의 뒤를 따르고 있다. 여기에 시사된 의미로서의 과학적 증명들이란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
또한 하이데거가 언급하였듯이 가령 그러한 증명들에 의해 확증된 신이라면 그것은 어떠한 신적 神的 인 시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류의 증명들을 도외시할 이유를 우리는 한층 더 갖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이유들과 그리고 다른 이유들로 말미암아 현대과학의 의미로서의 증명들에 의해 신을 확증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신을 암시하고 신에 대한 신앙의 권리를 밝히려는 우리의 방법은 현대 과학적 확신의 영역에서 발견되는 증명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선 제안하고자 하는 길은 앞으로 언급될 예정인 다름의 길들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전수된 전제들이 필요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신이라는 단어가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진다는 전제가 필요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미리 주어진 전제들에 대한 이 적어도 상대적인 절제에는 어떤 적극적인 방법적 자각이 대조된다.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 내가 보기에는 –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들에 입각해서 행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우선적으로 진력해야 될 노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안한다. 그것들이 경험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강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견해로는 그것들을 부정할 근거가 없는 세 가지 기본 사실들이 거명되고 숙고되어야만 한다. 특히 이 세 가지 기본 사실들은 한 인간 또는 한 사회나 한 특정 시대 예컨대 우리 시대의 확신이 어떤 상태가 관점을 지니고 있느냐와는 무관한 것이다. 끝으로 네 번째로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본 사실들의 논리적 연관이 마찬가지로 보여지거나 경험될 수 있게끔 그것을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현존재 現存在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의 첫 번째 것으로서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시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타인들 한가운데서, 우리의 사회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세계 한가운데에서 현존재 한다. 이것은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우리의 세계 한가운데에 현존재 한다”와 같은 명제들은 사회 일반의 확신의 지배적인 경향들과는 무관하게 현실적 의미를 가진다.
이 사실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훗설이 현상학적 환원의 첫 번째 단계로 추구하였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데카르트의 기초적 숙고들을 우리의 앞으로의 숙고들을 위한 의심할 여지 없는 토대로 관련 짓는다.
이것은 우리가 – 훗설의 견해들과 유사하게 – 이 출발점과 더불어 세계 내에서의 우리의 현존재에 대한 가능한 해석들을 괄호 치거나 아무튼 그것에 속박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또한 그렇다. 세계 내에서의 우리의 현존재가 플라톤의 방식대로, 또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하이데거 또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방식으로, 또는 그 밖의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든지 간에 이 해석 가능성들과 그리고 일체의 이와 비견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세계 내에 우리가 현존재 한다 라는 말들로써 언명되는 근본 사실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주장된다.
그러나 우리는 일체의 해석 가능성들을 이렇게 배제하면서도 한 가지 사실을 배제하기를 원치 않으며 또 해서도 안 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일체의 해석들의 전제이며 또한 해석들을 삼가는 모든 절제의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세계 내에서의 우리의 현존재는 경험들의 열린 공간과 같은 어떤 것이다 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데카르트적 접근을 훗설의 방식으로 확대하는 도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행위 하거나 겪으면서 또는 그 밖의 어떤 방식으로이든 우리가 우리의 사회와 세계 내에 현존재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 밖에서 또는 우리 자신에게서 여러 가지로 경험한다. 어떤 것이 출현해서 자신을 보인다.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경험의 어떤 열린 공간이나 열리 장소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써 의미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는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이것이 현존재의 일부를 이룬다라는 단순한 사실이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회, 또 우리의 세계와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한 경험들에 대해 투명하고 열려 있음은 세계 내에서의 인간 현존재에 속한다. 우리가 오로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잇는 것이다. 우리는 말하면서 경험들의 존립을 언명한다.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만 우리는 이 경험들을 또한 해석하거나 해석을 도외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 내에서의 우리의 현존재 함에 대해 말할 때에 경험들의 개방성이 이 현존재함의 일부를 이룬다는 것이 그와 동시에 함께 이해될 때에만 그러한 언급은 의미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세계 내에 현존재 한다”라는 명제는 그것이 그 외에는 가능한 해석들을 괄호에 넣으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단순히, 예컨대 물리학적으로 이해된 현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괄호에는 경험의 개방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명제는 또한 예컨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다음과 같은 명제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목성의 위성들이 존재한다 또는 현존한다.”
“우리가 우리의 세계 내에 현존재 한다”라는 이 명제가 뜻하는 것을 나는 편의상 현존재 Dasein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그럴 경우 이 표제에는 이미 시사되었듯이 해석들의 그 괄호치기와 경험들이 개방성의 해명도 함께 망라될 것이다.
따라서 이 의미에서의 현존재는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첫 번째 기초적인 사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 더 정확히 말해 피지 못하게 그리고 이 의미에 있어서 이미 데카르트가 보여주었듯이 부득이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
2. 비-현존재 非-現存在 또는 무 無
이 맥락 안에서 유념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이 첫 번째 사실, 즉 세계 내에서의 우리의 현존재의 토대 위에서 보여진다. 그것은 우리가 언급하였던 경험들의 그 개방된 공간 내에서의 한 출중한 경험이다.
이 두 번째 사실은 다음과 같은 명제들 안에서 표현된다. “우리는 언제나 현존재 했던 것이 아니며, 언제나 현존재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알 수 있듯이 이 명제들은 두 개의 부정문들이다.부정문들의 의미에 대해 우리는 몇 가지 관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도록 해보아야만 한다.
가) 무의 본질
그러한 부정문들에서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이 더욱이 부정적 사실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우선 명백하다. 우리가 언제인가 현존재 하지 않았으며 또다시 언제인가 더 이상 현존재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부정적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도 현존재에 대해 제안되었거나 제안될 이러저러한 해석과는 무관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그 경험은 우선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는 실증적 사실들과 자료에 대한 경험과는 아무튼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장차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험이 특이하고 우선은 불가사의한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해서 그 누구도 이전에 현존재 하지 않았고 또 미구에 현존재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부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 시사된 대로 조망해 볼 때 “비-현존재”는 분명 어떤 특정의 부정 不定을 제시한다. 그것은 각기 특정의 인간 현존재와의 관련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 우리는 언젠가 현존재 하지 않았으며 장래 언젠가 더 이상 재차 현존재 하지는 않을 현존재자들이다. “비-현존재”는 이 의미에서 우리의 “비-현존재”이다.
그것은 우리의 ‘비-현존재’이며 또한 예외 없이 인간 현존재 누구나 의 ‘비-현존재’이다. 이 명제의 확실성이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말하기란 다시금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의심될 수 없다. 그가 언젠가 현존재 하지 않았고, 또 언젠가 재차 현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질 필요가 없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사실은 심지어 인간이 만든 모든 초개인적 형성물이나 제도들, 사회 형태들, 문화들 등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아무도 그리고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비-현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일체의 인간 현존재의 확실하고 현실적인 부정이다.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인류 전체와도 관련되는 것인가? 그것은 진지하게는 의심될 수 없다.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생겼다가 사라졌다. 왜 인간만이 유독 생겨날 뿐 사라지지 말아야만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타자로서 으레 자연이라고 일컫는 세계의 그 영역들과도 관련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자연을 조망해볼 때에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연은 언젠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자연으로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그것이 혼자서는 대략 무엇인지 구명 究明되지 않은 채 놔두어도 좋을 것이다. 자연은 짐작 건대 자기 자신을 자연으로서 또는 단지 존재하는 것으로서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된 경우에 현존재와 “비-현존재” 사이의 구별은 자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현존재란 자신을 제시하는 것, 현존재와 “비-현존재”를 뚜렷하게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자연은 본래 더 이상 현 da 존재하는 것이 아닐 터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이전의 그리고 미구의 “존재하지-않음”은 우선적으로 인간 현존재 전반과 관계되며, 거기에서부터 그것은 인간에 대해 세계이거나 세계일 수 있는 일체의 것도 망라한다.
우리는 시사된 의미로 “비-현존재”를 무 Nichts 라는 표제로 부르고자 한다.
나) 무의 경험
이 “비-현존재” 또는 무의 경험 Erfahrung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질문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무는 순수 형식적으로 숙고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것은 여타 존재자와 현존재자에 있어서의 어떤 무엇과 관련되는 어떤 관계적 표현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개별 현존재자이든 또는 현존재자 일반이든 이 현존재자의 부정이다. 관계적 표현으로서 그것은 그럴 경우 부정, 다시 말하면 현존재자의 부정을 표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현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표시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숙고에서 이렇게 시사되는 것과 또한 계속해서 시사될 수 있는 일체의 것들로써도 많은 것이 여전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현존재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이 현존재하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주어질 경우에 그것은 하나의 경험이 된다. 그러나 “비-현존재”가 과거의 것으로서나 미구의 것으로서 경험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의 부정적 특성 안에서 긍정적인 어떤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떤 무엇, 즉 우리가 언젠가 현존재하지 않았으며 언젠가 현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감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무가 단순히 형식적인 부정적 특성으로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언급된 “비-현존재” 도는 무의 경험이 가지는 그 긍정적 특성은 그 밖의 경우에, 즉 현존재의 영역 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일컬어지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다. 그것은 긍정적인 것, 즉 다름아닌 현존재의 타자로서 그리고 현존재에 속하는 긍정적 특성의 타자로서, 이 긍정적 특성의 부정으로서 주어져 있으며, 어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을 주시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특히 근대에) 이 경험을 주지하고 그것을 진술한 몇몇 중요한 증인들을 언급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예컨대 파스칼이 무에 대해 말했을 때에 그는 분명 어떤 놀라운 경험과 그 내용에 대해 말하였던 것이다. 사정은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다르지 않다. 하이데거는 쉘링에 의해서도 표현된 문장을 때때로 인용하는데, 이 문장에는 마찬가지로 무가 포함되고 전제된다. “도대체 어째서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인가?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닐까?” 오이겐 핑크 Eugen Fink 역시 그의 저서 <형이상학과 죽음>에서 이 경험을 상세히 숙고하였다. 우리의 시야를 서양의 영역을 넘어서 확대한다면 고대 불교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불교 영역에서 늘 되풀이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무의 경험이라는 사실이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여하튼 부정적인 것, 무가 긍정적으로 주어져 있음을 말해주는 몇 몇 결정적 증인들이다.
그러나 – 그러한 증인들과는 무관하게 – 예컨대 자신의 죽음이든 타인들의 죽음이든 죽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100년 또는 1,000년 안에 그에 대해 또는 그가 알고 있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잠시 생각해 보는 사람은, “때때로 무덤에서 목욕하라”는 파블로 네루다의 충고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더-이상-현존재하지-않음”, “비-현존재”, (이런 의미로) 무가 특이하고 거대하며 부인할 수 없는 경험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감히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소여성은 두 개의 시간적 양태로서, 즉 지나간 “더-이상-현존재하지-않음”과 장래의 “더-이상-현존재하지-않음”으로 나타난다. 앞으로의 우리의 숙고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선 후자의 것, 즉 장래의 “더-이상-현존재하지-않음”을 기준으로 삼겠다. 도 다른 것은 후에 다른 맥락 안에서 다시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무의 모호성
경험으로서의 무가 어떤 긍정적 특징을 가진다면, 그것에 대해 몇 가지 언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를 경험하는 곳에서 우리는 어떤 무엇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알고 있는 첫 번째의 것은 물론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분명 그 의미가 이중적이다. 그리고 그 점에서 무 자체는 우리에게 모호한 것이 된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 경험을 공허한 거에 지나지 않는 무의 경험으로서 이해하든가 아니면 어떤 절대적 숨김에 대한 경험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에 그는 여기에 도대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에 나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여기에 있는 것은 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는 말할 것이다. 무의 경험의 내용 또는 그것의 현상적 특성을 토대로 하고서는 이 이중적 의미가 결정되지 못한다. 우리는 숨겨진 어떤 것이 그 배후에 숨어 있는지 아닌지 알지 못하며 그것을 우선 경험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결정된 수 없는 의미의 모호함은 우리의 무 경험에 본질적으로 속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단순한 모델에 의거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누군가 완전히 어두컴컴한 공간에 들어서게 되면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는 이것을 그의 긍정적 경험의 표현으로서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도대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예컨대 깊은 잠이 들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경험의 긍정적인 것이 있다. 무는 보여진 무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여진 것은 그 의미가 모호하다는 것이 즉시 명확해진다. 그가 도대체 텅 빈 공간에 들어선 것인지 아니면 비어 잇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든 간에 그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공간에 그가 들어선 것인지 우리의 피시험자는 그가 여기에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무의 관점에서는 결정 내릴 수 없다. 두 가지 가능성들과 결과적으로 같은 현상에 이르며 그 때문에 같은 언어적 표현을 가진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무의 의미의 이 모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시험자는 조심스레 움직일 것이 뻔하다. 그는 그의 사안을 완전히 자신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가 되는 그 경험된 무의 중대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선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정직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선 역시 미해결인 채로 놔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의 숙고가 위치해 있는 그 지점에서 보면 공허한 무와 절대적 감추임의 무를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란 없다. 이 양자택일은 우선은 미결정적인 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무가 가지는 그 외의 특징들을 고려할 경우에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특징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간에, 그것들은 모두 우선은 그 의미가 모호한 것으로 머문다. 이 이중적 의미는 후에 결정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로 그러한 것인가에 대해 후에 숙고 되어야만 한다.
라) 무의 억압하는 것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토대 위에서 우리에 대한 무의 관계를 계속해서 숙고한다면 우리는 특히 다음의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무는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도록 억압한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거나 여하튼 기꺼이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무엇이 무 자체에 있다. 그런 까닭에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또 누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차원들 안에서 알아차리고 인식하기란 결코 수월치 않다.
따라서 위협적으로 도래하는 확실한 무로부터, 예컨대 적극적인 삶의 다망 多忙함과 그것의 자칭 또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에로 우리가 끊임없이 도피한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이 도피가 성공할 경우 우리가 바라보는 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긍정적인 것일 뿐 무는 없기 때문이다. 혹은 우리는 어둠에 싸인 무를 미래의 어쩌면 더 낳은 현존재의 구상들과 유토피아들로 덮어 가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한 어디에서나 다시금 오로지 긍정적인 전망들만이 생길 뿐이다. 혹은 무, 예컨대 죽음의 무가 시사되고 우리가 그것을 피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경우에, 우리는 흔히 이 자각을 여타 사건들 중의 한 사건으로 취급해서 중요치 않은 사건으로 중화시킨다. 그것은 죽음을 알리는 신문의 부도들이 여타 알림들 가운데에서 알림들이며 또 여타 알림들의 요금표와 비교될 수 있는 어떤 요금표를 가지는 것과 같다. 혹은 마침내 우리는 위협적인 “비-현존재”의 문제에 몰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일상의 과제들로부터의 도피로서 그리고 아무런 쓸모없는 소일로서 치부해 버린다. 파스칼은 이것들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 앞에 세워둔 후에 걱정없이 나락에로 달려간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비-현존재”, 특히 다가오는 위협적인 “비-현존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사실이라는 것을 저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은 결과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억지로 그것에 주의하게 하지 않는 한 그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말하자면 흐름을 거슬러 더욱이 추세를 거슬러 부인될 수 없는 것, 즉 우리 모두가 더 이상 현존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주시하고, 따라서 이 경험을 진지하게 접하기 위해서는 지성적 정직성의 결코 자명하지 않은 결단과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다.
마) 무의 끝없음과 무조건성
우리로 하여금 도래하는 “비-현존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현저하게 감정이 개입된 장벽을 극복하고 그것을 직시한다면, 우리는 물론 거기에서 몇 가지 특이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사물의 속성들이 아니다. 무는 아무런 사물도 아니다. 그러나 무의 차원들과 같은 어떤 것이 있다.
여기에는 예컨대 언뜻 보기에 자명해 보일 뿐인 이 사실이 있다. 무는 아무런 끝도 없다. “존재하지-않음”에로 침몰한 것은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문장에서 “두 번 다시 않는다”라는 말은 도래하는 무의 끝없음 을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면서도 되돌아오지는 못하는 침묵의 심연이다.
사람들이 현존재와 그것의 경험들의 관점에서 이것을 미래의 “비-현존재”와 비교해 본다면, “비-현존재”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더 큰 것이다. 그것은 누구든 그리고 모두와 이것을 영원히 삼켜버린다. 그것의 끝없음에서 그것은 엄청난 것이다. 그것이 억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등 놀랄 일이 아니다.
무의 엄청난 끝없음은 말하자면 그것의 외연적 外延的 차원이다.
내연적 內延的 [필사주: 이런 말도 있나? 사전에도 없다. 역자, 오창선 박사님, 공부 좀 더 하세요.. 분명히 이것은 “내재적 內在的”일 것입니다!] 차원 역시 이것의 일부를 이룬다. 이 차원으로 말미암아 무의 엄청난 특성이 비로소 완전하고 예리한 것이 된다.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그것의 불가피성 이다. 아무도 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일체의 현존재를 삼켜버리고 간직하는데, 영원히 그렇다. 현존재의 위대한 모습들이 제아무리 위대하고 – 사람들이 말하듯이 – 잊을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것들은 하잘 것 없는 모습들과 마찬가지로 무에 의해서 삼켜져 저리는 것이며,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것들을 이것에서 빼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이렇게 피지 못하다는 데에서 무는 일체의 현존재와 그것의 권세를 참으로 압도하는, 그것도 소리 없이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압도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이겐 핑크는 죽음 내지 무를 “절대적 군주”라고 분명하게 칭하였다. 권세라는 말은 물론 이 경우에 어떤 힘있는 사물이나 어떤 힘있는 실체의 부수적 성직이나 활동 또는 속성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무의 권세는 어떤 사물의 권세가 아니다. 무는 아무런 사물도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암시된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무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다만 무로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무의 권세는 완전히 소리 없는 것이기도 하다.
무가 회피할 수 없는 것임으로 해서 그것은 또한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 다만 이 단어는 이 경우에 흔히 그러듯이 추상적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구체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도래하는 무는 무조건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으며, 그것과 거래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의되었든 문의되지 않았든, 숙고되었든 숙고되지 않았든 와서 탈취하여 가진다. 사람들은 상당한 기술적 비용을 들여 달에서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천체들에서부터 돌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일단 무 에로 가라앉은 것은 아무것도 되가져와 질 수는 없다. 여기에서 일체의 인간적 권한은 기술적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그 때문에 무의 경험은 철두철미 구체적인 의미로 무조건적 경험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바) 무는 아무런 사물도 또는 주체도 아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무에 관한 몇 가지 차원들, 즉 끝없음과 구체적 무조건성에 대해 언명들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사물의 술어들이나 속성들이 문제일 수 없음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여 환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언어는 외관상 거의 피치 못하게 마치 어떤 문법적 주어에다 술어들을 첨가한다는 인상을 일깨운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라는 이름을 지닐 어떤 주체나 사물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부정인 것이다. 특성들이나 우유적 속성, 태도방식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무는 다시금 이 모든 것의 부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언어적으로 명명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말의 가장 근접한 의미에 한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차원들 안에서 그것이 경험됨으로써 무는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
사) 현존재의 타자로서 무
이와 관련된 사실은 무가 현존재에 대해, 즉 우리의 세계 내에서의 우리의 현존재에 대해 단순히 외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면서도 외부 감각으로는 타자적인 것으로서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이 현존재가 마치 단지 외적으로만 그것의 한계들에 접해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다. 부지불식간에 쉽게 생길 수 있는 이 생각은 회피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사물적으로 잘못 생각된 무의 모델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무는 현존재의 타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름아닌 현존재의 타자라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데. 그것은 현존재 안에서 경험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현존재의 타자이다. 현존재 자신이 무의 경험 또는 주어짐의 장소로서 나타난다. 무는 바로 현존재 안에서 그것의 타자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단지 그것의 한계들에 접하여 있고 그것 밖에서 존재할 뿐인 것이 결코 아니다. 현존재는 그것이 무를 경험하는 거기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 경험을 거절하는 거기에서조차도 무로 충만해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현존재가 왜 그렇게 경험을 거절하겠는가? 긍정적 특성을 지닌 현존개가 그것의 완전한 타자, 그것의 부정으로 충만되어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무는 어떤 것, 즉 현존재의 경계선상에서 중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묘하게도 현존재를 관통하고 조율한다. 따라서 현존재와 무는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영역으로 생각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들은 오히려 서로 겹쳐져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무가 현존재 안에로 이렇게 뻗쳐 있음은 현존재 자신에게 돌이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하에서 그러한 영향들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3. 의미물음과 의미전제들
우리의 현존재가 하는 경험으로서의 무의 경험은 우리의 이 현존재 안에 있으며, 현존재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 현존재의 근본 태도들과 반목한다. 그러나 바로 이 불화로 말미암아 그 근본 태도에 대해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의 생동적 현존재의 근본 태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 企圖 들과 의도들에서 우리가 의미를 묻곤 한다는 데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의미에 대한 물음은 그것이 명시적으로 제기되었든 혹은 다만 불명료하게 살아진 것이든 우리의 전생을 동반한다.
의미를 묻는다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의미라는 말로써 우리가 통례적으로 뜻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의 개별 실행들에서 우리의 생을 정당화하고 성취시킬 수 잇는 그것이다. 그러한 정당화시키고 성취시키는 의미를 무리는 묻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물음은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근본 경향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의미물음은 단지 이론적이고 추상적일 뿐인 물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존재의 생동적인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의미물음이 이처럼 관심 있는 물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를 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위 할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를 또한 언제나 주어진 것으로서도 전제한다.
행위 자체는 우선 미해결인 것처럼 보이는 의미물음을 긍정한다. 이렇게 행위하면서 의미물음을 긍정하는 것은 어떤 요청의 형태를 지닌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하면서 이 행위가 의미 있는 것이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위하면서 일체의 것을 정당화하는 의미를 매번 전제하며, 그것을 요청한다.
물론 이 기초적인 실상은 우리가 현존재를 단지 확인할 수 있게 눈앞에 있음일 뿐인 것으로서 해석할 경우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다. 설령 이 해석이 널리 유포되어 잇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현존재를 구체적으로, 즉 구체적이며 생동적으로 현존재하는 것으로 고찰하기 시작하자마자 즉시 실효되는 마는 추상적인 것이다.
이 의미요청이 우리의 현존재와는 뗄 수 없다는 것이 특히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의미 있다는 전제에 의해서 언제나 유도되어 있다. 이 원칙에는 엄밀한 의미의 예외란 없다. 그러므로 의미전제는 현존재의 실행 전반의 주도적 원동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한 것으로서 의미전제는 우리의 현존재의 귀결인 동시에 또한 전제이기도 하다. 그것이 귀결이라 함은 우리가 현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는 현존재를 요구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전제라 함은 의미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현존재가 생동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로서는 실행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의미전제와 그 안에서 솟구치는 원동력으로부터 우리의 생의 일체의 구상들과 희망들 그리고 요구들이 생겨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일체의 인간적, 사회적, 사교적이며 문화적인 노력들을 움직인다. 왜냐하면 이 모든 노력들은 그것들이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어떤 의미를 믿는 한에 있어서 종종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에른스트 블로흐의 유명한 “원리로서의 희망”은 분명 올바로 파악하였다.
주의해서 자세히 보면 이 의미전제의 생은 차이들을 드러낸다. 의미전제는 우선 우리가 우리의 방침으로 삼을 수 있는 일체의 개개의 유한한 목표들 안에서 전개된다. 그러므로 이 의미전제를 좇아서 우리는 늘 반복하여 유한하게 도달될 수 있거나 도달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개개의 의미 모습들에 기초하여 우리의 현존재를 구상한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의미 있는 직업, 우리가 도달하고자 애쓰는 의미 있는 생의 모습, 우리가 투신하고자 하는 공공의 관계들의 의미 있는 형성과 변화 등이 여기에 상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의미 있는 현존재의 이 구상들과 수천의 다른 구상들은 물론 우리가 이 현존재를 형성하고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특징만을 바라볼 경우, 의미전제의 전체는 우리의 행위들과 우리의 목표들의 완전한 대열들의 집합처럼 보인다.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의미구상들이 펼쳐지면서 어떤 부정적 변증법이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있기 때문만으로도 그렇지 않다. 시사된 종류의 모든 도달될 수 있거나 도달된 의미형태는 늘 거듭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 의미가 부정적인 것 안에서 나타난다. 언제나 반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이것을 달성하였다는 것은 잘 된 일이고 뜻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부분적이고 더 계속하게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서의 이 “그러나” 언제나 그와 동시에 함께 있는 것이다. 더 바람직한 어떤 것이 언제나 남아 있는 것이다. 시사되었던 대로 도달되었던 또는 도달될 수 있는 일체의 것은 언제나 부분적으로는 의미요청과는 일치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서 나타난다. 이것은 개인적 삶에서도 사회적 및 사회집단적 삶에서도 그렇다.
이것은 의미요청이 우리의 생의 있을 수 있는 일체의 유한한 세부사항을 망라하는 것이지만, 또한 일체의 것을 능가한다고 우리가 말해도 좋은 이유이다. 그것이 일체의 개개의 계기들을 능가하기에 물음은 근본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나의 세계 내에서 현존재한다 는 이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리고 이 물음에 따라오는 의미요청에서 일체의 유한한 것과 유한한 것들의 모든 집합을 능가하게끔 재차 전체적인 것을 제시하는 어떤 의미가 요구된다는 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의미요청의 구체적 삶을 특징짓는 것으로서 언급되었던 그 부정적 변증법이 결정적을 경험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의미물음과 의미요청의 가장 깊은 이유를 표출시킨다. 물음이 이 의미에 있어서 보편적인 것이 되거나 혹은, 더 잘 표현해서, 보편적인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그것의 본래의 차원이 비로소 획득된다. 그리고 그 물음과 더불어 그에 걸맞은 요청이 있게 된다. 우리의 생이라고 지칭되는 이 부산 떨음, 그것은 도대체 그리고 전반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유한한 성취로도 절대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도대체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엇 에로 귀착하는가? 이 물음들은 전반적인 물음들이다. 그것들은 물론 우선은 부분적인 구상들과 그것들의 변증법 안에서 표현된다. 그러나 이 변증법의 이유에 전체적인 물음이 근거하고 있으며, 때때로 싹튼다. 그러한 물음은 현존재가 현세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싹트면서 늦게, 심지어 마지막에 제기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 비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 실제적으로는 일체의 인간 생의 첫 번째의 것이자 시작인 그것만이 밝혀진다. 일체의 개별적인 것이 이미 언제나 전체적인 의미를 전제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첫 번째의 것이자 시작이다. 이 의미에 있어서 전체적인 의미요청은 의미를 추구하는 일체의 생의 전제이며 시작이다. 우리가 은연중에 전체적인 것이 아무튼 의미있다 라는 생각에 의해서 적어도 이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어떠한 개별적인 것도 구상하거나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최종적이고 근원적인 물음이지만 그것은 그 이전에 여전히 첫 번째의 물음인 것이며 첫 번째 물음으로서는 물론 대부분 감추어져 있다. 그것은 최종적인 물음인 동시에 첫 번째의 전체적인 물음으로 전반적인 관심과 전체적인 의미의 전제로 가득 차 있다.
끝으로 우리가 의미요청을 다루면서 이와 관련 지어 여전히 주목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우리의 인간 현존재 안에는 이 현존재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여지를 남겨 두면서 결국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 기획하고 그것을 목표하는 것이 분명 살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진 의미전제와 이렇게 살아진 의미전제의 해석 사이에서 차이와 동시에 그 연관성이 생겨난다. 사람들과 민족들의 생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가면서 늘상 다른 구상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구상들 안에서 그들은 그들의 생의 의미를, 더군다나 전체적인 의미를 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구상들은 그것들이 기저에 놓인 원초적인 생의 충동에 대한 일체의 해석들이다. 이 충동은 해석을 요구하고 그것을 야기시킨다.
해석하는 그러한 의미구상들은 여전히 매우 의심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더 자세히 조사해 보면 그것들은 언제나 이 사실을 가리킨다. 우리의 현존재는 도대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미를 지닌 것이며 따라서 이 의미를 이러저러한 모습들이나 해석들에서 보고자 함은 의미 있다는 것이 불명료하게나마 적어도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도대체 해석되면서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살아진 의미구상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명시적으로 해석되고 기획된 의미구상에는 차이가 있으면서도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래의 뿌리에서부터 살아진 의미구상은 매번 해석된 의미구상을 위한 전제이다. 이 해석된 의미구상들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폭넓게 가변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들의 뿌리는 언제나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전체적인 의미를 목표로 하는 생.
이 연관은 우리가 가장 극단의 경우, 즉 모든 것이 도대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무의미함 중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고 사람들이 천명할 경우를 함께 고려할 때에 가장 예리하고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다. 실제로 이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런 유의 중요한 인간 삶의 실례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저마다 존중될 만하다. 대단히 암울한 이 가능성에 직면한 것만으로도 의미의 포기와 무의미를 선택함은 그러한 결정들이 행위들이라는 점에 있어서 매번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예컨대 더 솔직하고 더 현실적 따위의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진 의미전제는 도대체 의미를 무시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최악의 부정적 해석마저 가능케 하는 토대로서 재차 나타난다.
다름아닌 이 중요하고 중대한 가능성을 깊이 숙고해 볼 때에 생과 의미에 기초한 생 혹은 의미전제는 같은 뜻의 개념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간의 생이 명시적으로 의미를 포기하려고 결심하면서도 이 결심이 여전히 현실적이고 행위 하는 생의 한 모습을 이루는 곳에서조차 그것이 생인 한에 있어서 그것은 또다시 의미를 전제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런 까닭에 의미를 진지하게 포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살아가고 현존재하기를 포기한다. 자살이 참으로 유일한 철학적 문제라고 지적하였던 알베르 카뮈는 이런 의미에서 전적으로 옳다.
그리고 모리스 블롱델이 그의 유명한 저서 <행동 L’Action>에서 생은 의미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런가 아닌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을 때에 그는 생 자체를 주도하는 본래의 물음을 고전적으로 표현한 것이데, 이 물음은 물론 사유의 명확함과 해석에 있어서 망각되거나 뒤바뀌거나 또한 부정될 수 있는 물음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의미전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어쩌면 단순히 유익한 착각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마침내 묻는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의미요청이 전개되는 본래의 장소는 구체적인 생이며, 더구나 특히 그것이 윤리적으로 강조된 거기에서이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강조된 구체적 생은 인간의 생 일반의 중심이다. 물론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생의 의미에 대해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현존재가 윤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기에서, 예컨대 신의와 우정이 문제이거나 타인들의 자유와 정의의 담보 擔保 나 이와 유사한 그 어떤 무엇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인간 상호간의 관계들에 있어서 우리는 한 순간이라도 이것이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그 경우에 의미요청은 그것의 내적 권리와 함께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그 까닭은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의미 있는 것으로 전제해도 좋고 도 전제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 경우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적으로 정당한 요청으로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삶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의미를 고려함과 의미의 당연한 요청은 인간 현존재의 토대와 뿌리 안에 존재한다. 그러한 것은 조용하며 결코 강제하지 않지만 그러나 언제나 자유에 호소하는 소리로서, 즉 “생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신앙으로서 살아 있다. 이 소리에 참으로 자신을 여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의 진리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 물론 자유의 지평 안에서 생각이 이루어지는 곳 어디에서나 그렇듯이 강제적인 논증들이 여기에 거론될 수는 없다. 이 요청의 권리가 드러나는 윤리적 행위에서도 이미 자유의 사용이 전제되듯이, 자유는 그것의 근저에서 소리 없이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그것에 자유로이 자신을 열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결코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드러난 세 번째의 중요한 실상, 즉 우리가 우리의 맥락 안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세 번째 사실이다.
4. 귀결: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것이 존재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된 계기들을 그것들의 연관 안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 세 가지 계기들, 즉 세계 내에서의 우리의 실제적 현존재,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더-이상-존재하지-않음“, 끝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의 일부를 이루고 그것을 움직여 나가고 이끌어가는 근본적으로는 무조건적이며 전체적인 의미구상.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존재와 그 경험들의 토대 위에서 무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의 물음과 요청을 서로 연결 짓고자 한다면, 무엇이 알려지는가?
그럴 경우 우리는 일체의 현존재가 허무한 것으로서의 한없는 무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삼켜져 버리는 한, 본래 모든 것은 도대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허무한 무로서 이해되었을 경우 무는 모든 의미를 파괴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무를 참으로 솔직하게 대면할 경우에만 명백한 것이 되는데, 이것은 이미 말했듯이 결코 자명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것에 몰두해 유쾌히 살아간다는 것은, 여기에 그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철두철미 의문스러운 것으로 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인간의 유익한 자기착각들을 위해 필요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고 그렇듯이 모든 것이 언젠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면, 잠시 동안 의미 있고 좋았던 것 같았던 관계들이 정말로 의미 있고 좋은 것일까? 특히 모든 것이 어차피 끊임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것이라면, 선과 악의 윤리적 구별은 진지하게 견지될 수 있는 것일까? 악과 선, 자유인과 노예 구별 없이 모두 마침내 무의 폐물이 되어 영원히 거기에서 잊혀지고 만다면, 일체의 것은 결국 똑같은 것, 즉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텐데, 그럼에도 정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 자유와 굴종을 구분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럴 경우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 역시 동일한 것, 즉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럴 경우 거짓과 불의보다는 오히려 진리와 정의를 위해 투신하는 것이 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 더 이상 이해될 수 없다. 그것이 허무한 무일 뿐인 것으로 이해될 경우, 무는 모든 의미구상과 모든 의미요청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고 만다.
현실적으로 위협적인 무와 의미를 구상하고 요청하는 현실적 현존재 사이의 이 모순은 – 알 수 있듯이 – 결코 단순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모순이 아니다. 허무한 무는 가장 내면적이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궁극적으로는 포기될 수 없는 그 계기 안에서 현실적 삶과 배치된다.
이 모순은 견지될 수 없으며 견지되어서도 안 된다. 진리와 허위의 차이의 의미와 또 이와 유사한 차이의 의미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현존재의 가장 내면적 양심의 소리 없는 음성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그 음성에 우리를 개방하고 자유롭게 귀 기울이는 한에 있어서만 그렇다. 우리는 의미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윤리적 구분들이 의미 있다라는 이 사실은 이 이 구분들의 구체적으로 제시될 경우에, 즉 그것과 관련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람의 구체적 형태들, 예컨대 타인들에 대한 구체적 사랑이나 정의를 위한 또는 타인들의 자유나 이와 유사한 것들을 위한 구체적인 투신을 고찰한다면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한 연관들에 가령 그러한 것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은 것일까?
혹은 달리 구제적으로 말해보자. 우리의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 무고하게 고통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세계의 불의의 멍에를 지지 않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경우에, 우리는 그것이 결국에 가서 똑같은 것, 즉 무 에로 귀착하고 마는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은 본래 어떤 것이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것일까?
그것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물음을 제기한다면, 의미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내게는 명백한 것 같다. 선한 것이 되든 악한 것이 되든, 의로운 것이 되든 의롭지 못한 것이 되든 등등 그 어느 것이 되든 상관없다고 우리들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고한 사람의 고통이 이 고통을 불의하게 야기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과 동일한 것에로 귀결된다고 우리들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올바로 이해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양자택일에 직면하게 된다. 앞서 전제하였듯이, 무가 그저 허무한 무일 뿐인 경우, 우리가 이를 시종 일관되게 생각한다면 일체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든가, 아니면 일체의 것이 의미 있으며 이는 명백한 윤리적 근본 요구요 양심 자체의 소리이든가 하다. 이 경우에 무는 그저 허무할 뿐인 것과는 다르게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무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듯이 무 자체는 뚜렷하지 않은 그 현상적 특성으로써는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개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체의 것은 의미있다라는 명제를 고수하고 또 이 명제가 구체적으로 명백한 것인 한, 이 명제로 말미암아 무의 경험의 이중성은 명백한 것이 되게끔 결정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명백한 근거에서, 즉 의미요구를 견지하고, 의미하지만 분명한 양심의 소리와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진리에 복종하기 위해 무를 결정해도 좋은 것이다. 그렇다면 의미있는 인간 현존재란 무가 그 무한성과 거기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허무한 무가 아니며 오히려 무한하고 무조건적이며 일체의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간직하는 권세의 숨김 혹은 숨겨진 현전 現前 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숨겨진 현전: 소리 없이, 형태 없이, 암흑의, 어쩌면 소름 끼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전하는 것이다.
그것들의 결정적 계기들에 있어서 물론 자유에 의해서만 접근될 수 있는 현실적 관찰들과 이성적 추론들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롭게 신앙해도 좋다. 사람들이 정의와 불의,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의 구별을 전도시키고자 애쓸지라도, 무의 거대함과 무조건성은 특히 그 구별을 무조건적인 것으로서 견지하고, 일체의 의미를 보존하는 거대하고 무조건적이지만 그러나 불허 不許 되고 숨겨진 어떤 현실의 표징과 자취라고 믿어도 좋다. 그것은 무죄하게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상상할 수 없게 그의 현존재의 의미를 간직해 주는 권세인 것이다.
그와 동시에 무는 그것이 암흑과 같고 현상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긍정적인 내용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무한성과 무조건성의 차원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차원들을 보여주면서 무는 이것들을 관철시킨다. 그것의 무한성과 무조건성은 이제 권세로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물론 유한한 책략들에 있어서 권력이라고 지칭되곤 하는 일체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소리 없는 이 권세 안에서 무는 일체의 유한한 특히 일체의 인간 생에 대해서 그 의미를 보증하고 보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그것은 일체의 생을 정당화하고 충만케 할 수 있는 그것이다. 마침내 그것은 일체의 이 긍정적 특징들을 신비의 방식으로 드러낸다. 왜냐하면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도 동시에 그것의 불가해한 부정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가장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는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일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체의 의미를 보존하고 일체의 의미를 결정하는 무한하고 무조건적이며 일체의 것을 요구하는 신비스런 권세에 대한 신앙은 그래서 이성적으로 확증된 신앙일 수 있다. 물론 그 신앙은 그 결정적 순간들을 맞아서 아무도 강제하지 않는 통찰들에 의거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 통찰들이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5. 지금까지 언급된 것에 대한 설명들
이 기본적인 숙고들에 몇 가지 생각들이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첨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것의 나타남으로서의 무 차체
위에서 기초된 발단에서부터 무한한 권세는 무에 의해서 마치 공간처럼 둘러싸일 만큼 그렇게 예컨대 무한한 무 안에 감추어져 잇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쩌면 들 수도 있다. 사람이 들어설 수 있는 어두컴컴한 공간의 모델은 바로 이 생각에로 오도 誤導 할 수 있었다.
단지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만 그 “안에서”라는 표성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거기 에로 접근해 가는 그 무의 어둠 안에서 필시 어떤 무엇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어쩌면 배제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어떤 무엇만으로도 “어떤-무엇이-아님” 그리고 이 의미에서 무의 한없는 공간을 그 편에서 다시금 자신의 주변에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공간은 우리가 존재하는 사물들의 대열을 죽음과 무의 한계를 넘어서 아무리 연장시켜 생각할지라도 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생각해 내든 간에 그것을 넘어서 구상된 이 어떤 무엇은 그것에 다가와서 의문에 붙이는 여전히 한결같이 무한하고 한결같이 피치 못할 그 무에 직면하여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질문되어야 할 것으로 남기 때문이다.
달리 말한다면 우리의 현존재의 의미전제와 피치 못하게 위협적인 무한한 무 사이의 구체적 모순은 무 자체가 – 그러니까 그것 안에서가 아니라 – 무한한 권세의 접근을 불허하는 현전 現前 이라는 것이 믿어질 경우에만 비로소 의미 있게 해결된다. 무는 그 자체로 다름아닌 무로서 모습이다. 즉, 무한한 권세의 자신을 드러냄 혹은 현상적임의 방식이다. 오직 이렇게 생각함으로써만 그것은 의미가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앞서 언급하였던 한스 알베르트의 뮌히하우젠 의 세 가지 상호모순된 결론의 논증이 해결된다. 왜냐하면 이 무와 그 신비는 비록 그것이 잠시나마 연기되었을 지라도 언제나 또다시 스스로 복원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넘어갈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이 그저 원한다고 해서 붙잡아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그것은 면역전략 免疫戰略 들에 의해서 방어될 필요도 없다. 그것이 피치 못할 것으로서 알려짐으로써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한다.
물론 뮌히하우젠의 세 가지 상호모순된 결론은 무한한 시비가 단순히 더 거대한 존재자일 뿐인 것으로서 해석될 경우에 또다시 복원되고 만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물음이 질문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이 존재자는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혹은 다음과 같이 질문될 수도 있겠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 기초해 있는 것인가? 그리하여 사람들은 무한한 역행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 역행을 그저 고의적이며 독단적으로 중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칸트는 이른바 입증된 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음과 같이 묻게 하는 <순수이성비판>의 그 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유래한 것인가?18
오로지 순수하게 “어떤-무엇이-아님” 만이 그 신비스런 권세를 지닌 채 그러한 양자택일을 벗어난다.
나) 존재자를 뛰어넘어서
이것을 견지한다면, 무한한 권세는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아무런 존재자일 수도 아무런 어던 무엇일 수도 아무런 실체일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명백해진다. 무한한 권세가 현재함으로써 의 무 無는 “어떤-무엇이-아님”으로써 어떤 무엇의 타자이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존재자가-아님”으로써 존재하는 일체의 것에 대한 타자이다.
존재자란 존재가 그것에 귀속되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존재가 다만 귀속될 뿐인 그것에는 어떠면 존재는 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사실상의 것이며 사실상의 것으로서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필연적이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은 제한된 것이다. 그러나 무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대한 신비는 일체의 그러한 제한과 사실성 事實性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 엄밀한 의미로 존재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일체의 것을 뛰어넘어서 존재한다. 그런 까닭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진은 존재자의 일체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존재한다고 말하였던 것이다.19
이 사태로 말미암아 종교언어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언어의 방법들과 규칙들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없는-것 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산 또는 골짜기 또는 자동차 등이라고 말했을 때와 같은 방식이다. 마치 우리의 세계의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 문제가 되는 듯이 우리는 명사적 형태들을 관사와 더불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여기에 논의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 라는 언명의 내용은 그것의 서술방식을 능가한다. “무” 라는 표현은 그것의 형식상 그것의 내용에 부적절하다. 그것은 그 내용에 의해서 그 자신의 언명 형식을 능가하여 마침내 더 이상 도대체 언명될 수 없는 것을 가리켜 보인다. 따라서 이 표현될 수 없는 것을 언어적 형식 안에서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란 언어에는 남아 있지 않다. 언어를 넘어서 지시해 보임은 스스로 여전히 언어의 형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은 언명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것들을 무의 무한한 권세에 속한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점에서 숨겨진 것으로 나타난 그 특별한 특징들과 관련하여 유사한 것이 언급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무가 부정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긍정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권세”라는 표현이 좋다고 생각되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권세의 무한함과 구체적인 무조건성에 관하여 말하고, 이 감추어진 무한한 권세가 모든 것에 대해 일체의 의미를 간직하고 부여하고 이 점에 있어 일체의 것을 심판하고 결정한다는 것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였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일련의 외관상의 특성들과 같은 것을 열거하였다. 그것들은 무한한 권세가 명제주어 로서 등장하는 그러한 명제들의 일련의 술어들 안에서 표현된다. 하지만 이 명제의 형식은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고려할 때에 견지될 수 없다. 만약 아무런 어떤 무엇도, 즉 아무런 존재자도 없다면, 이 어떤 무엇의 특성들을 생각해 내어 술어들로서 언명한다는 것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한한 권세가 존재자의 일체의 범주들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것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존재자가 무엇이라고 말하곤 하는 그 일체의 명제들과 술어들을 뛰어넘어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명들은 우리가 다루는 주제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들이 말로 표현하고 또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에 의해서 재차 그것들이 언명 형식을 붕괴시킨다. 그것들은 자기 나음으로 말로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것을 뛰어넘어서 있는 영역을 시사하는 것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신비의 긍정적 특성, 즉 무한성, 무조건성 그리고 의미 부여의 힘에 대한 이 언명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이 지적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의미는 우리의 숙고들의 과정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말로 표현하는 그것은 언어적 언명 형식으로 적절히 표현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있다. 언어는 그 자체로서는 더 이상 언명될 수 없는 신비를 늘상 지시해 보인다.
그래서 무한자는 일체의 어떤 것을 뛰어넘어, 또한 일체의 명제마저 뛰어넘어 그것의 신비 안에 머문다. 그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대로 그것에 대해 알 수는 없다. 하물며 그러한 앎을 완성한 명제들 안에 확정 짓고, 말하자면 정리해 마무리 지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드러나고 또 그것이 드러나고 언표를 정당화시키면서 동시에 이 언표를 능가하는 몇 가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다) 현상학적 차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숙고의 도 다른 한계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신비스런 현상을 그것의 권세, 그것의 무조건성, 그것의 무한성이라고 일컬어졌던 것 안에서 파악하려는 꽤 면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우리가 더 계속해서 할 수 없는 한, 여기에서 이미 종교적 의미의 어떤 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신적인 것이 영역에 그리고 그 결과로 특별히 종교적인 영역에 이미 와 있는 것일까?
실제로 지금까지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숙고들의 결과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적인 신 사이에 현상학적 차이와 같은 어떤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 차이에 대해 특히 마틴 하이데거는 강조해서 환기시켰다. 자체원인 causa sui은 철학에서 신에 대한 전문술어적 명칭이다 라고 그는 쓰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글자 그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이 신에게 인간은 기도할 수도 없고 봉헌할 수도 없다. 자체원인 앞에서 인간은 경외심에서 우러나와 무릎을 꿇을 수도 없으며 이 신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출 수도 없다.”20
우리는 이 차이를 여기에 명확히 깨닫도록 한다. 그것은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 이 중요한 사정을 우리는 후에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6. 이 노정의 비판
끝으로 이른바 자연신학 에 대해 신학적 측면으로부터도 철학적 측면으로부터도 제시되었고 또 제시되고 있는 비판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이 전체 숙고를 검토하는 일이 남아 있다.
가) 신학적 비판
신학적 비판은 대개 인간의 입장에서 밝혀졌거나 입증된 절대자란 인간에 종속된 것일 테고 그렇나 것으로서는 그것의 절대성과 또 궁극적으로는 그것의 신성 神性을 박탈당한 것일 터이다. 예컨대 폴 틸리히는 신존재 증명들과 관련해서 그가 그것들을 알고 있었던 한에 있어서 그렇게 논증하였던 것이다.21 적지 않은 다른 저자들이 유사하게 판단하였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이 이의가 신을 유한하게 사고운동을 하면서 유한하게 존립하는 것으로서 이해하여 사유의 유한한 소재에서부터 구성하려는 사고 과정들에 대한 것인 한에서 옳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 현존재의 입장에서 무한성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무의 모습 안에서 본다는 것 sehen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즉, 그것이 자시 스스로를 알리고 보게 한다는 사실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을 알리고 보게 한다면, 그것은 인간적 구성이 아니다. 그럴 경우 그것은 인간에 이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비록 감추어진 것 안에서이긴 하지만,그 스스로 인간을 이미 언제나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침내 무한한 권세를 가리키는 인간 현존재의 의미구상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의미구상은 우리가 보았듯이 인간 현존재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 현존재에 속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간은 의미구상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변조하면서 달리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또한 여전히 이 운동들 안에서 인간은 살아진 의미구상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의미구상을 창출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의미구상이 인간을 창출하고 그의 현존재를 가능케 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미구상 역시 주관적 구상이 아니다. 의미의 구체적 요청, 그뿐 아니라 마침내 무조건적 의미의 요청이 구체적인 같은 인간의 상황 안에서 인간을 부른다. 인간이 그의 개인적 착상에 의해서 이 부름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적인 것으로서 이미 언제나 그 스스로 우리를 요구하는 것을 찾아내기만 할 수 있었다. 생각이 인간과 유한성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것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폴 틸리히와 여타 많은 사람들이 선언하였던 신학적 유죄선고에 지배되지 않는다.
나) 철학적 비판
그러나 그러한 생각에 대한 철학적 이의들은 어떠한가?
이 철학적 이의들은 그것이 한편으로는 규정될 수 있는 유한하고 사실적이며 따라서 경험적인 존재자에 확정되어 있다 라는 실증과학적 사고의 특성에 의거하고 있다. 이 확정에 따라서 이런 유의 존재자만을 주시한다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것에 대한 물음은 물론 필연적으로 탈락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제한이 전적으로 옳은 것인가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 점을 – 우리가 보았듯이 – 이미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알아채었다. 물론 이에 동의하고자 하는 한에서, 무한한 신비가 자기 자신을 알린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숙고의 의미였다. 이렇게 하여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일체의 실증주의적 사고의 지평을 넘어선다.
그 외에 신에 대한 생각에 반대하는 중요하고 진지한 적극적 이의, 즉 절대적 신은 인간의 주관성의 한 투사 projection이다라는 이의가 있다.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흐는 이 종교비판적 견해의 고전적 주창자이다. 칼 마르크스는 이 견해를 넘겨받았으며 지그문트 프로이트 S. Freud 역시 그러한 길을 밟았고 그것을 정신 분석학적 숙고들을 이용해서 해명하였다.
투사이론은 반박되기가 쉽지 않다. 외부세계의 현실조차 투사로 해석될 수 있다면, 오히려 절대자 혹은 신에 대한 신앙은 훨씬 더 그렇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의 숙고들을 고려할 때에 분명 죽음은 투사일 뿐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만일 죽음이 투사라면, 그것에 대한 생각은 성공적으로 지워져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아무런 투사가 아니라면, 죽음과 더불어 나타나는 미구의 “존재하지-않음” 역시 아무런 투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할 수 없으며, 다만 그것으로부터 눈길을 돌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 이렇게 눈길을 돌리거나 도피함은 오히려 우리의 소망들의 투사인 것이다. 게다가 눈길을 돌린다고 해서 사실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래하는 “존재하지-않음”은 우리가 바라는 생각들이나 투사들과는 무관하게 도래하는 “존재하지-않음”으로 머문다.
또한 의미를 추구하는 생으로서의 생과 구체적인 같은 인간의 현존재와 관련하여 의미를 믿는 것은 아무런 투사도 아니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구상할 수 있는 의미의 그때그때의 구체적 해석들은 혹시 투사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체의 생이 의미를 지향하는 생임을 이미 언제나 전제하고 있다.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같은 인간 현존재의 의미를 지각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경험들에 속한다. 우리가 그것들을 주관적으로 구상하고 투사한 것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들은 또한 우리의 자의 恣意 [제멋대로의 생각]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다.
폴 틸리히 역시 이 점을 환기시켰다.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든 간에 그것들 자체가 조건 지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에 저항하고 그것들로부터 예컨대 ‘아버지상’ 혹은 ‘사회적 양심’으로부터 해방될 수는 있다. 그러나 도덕적 명령의 무조건적 성격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인간은 어떤 특정의 정신적 내용을 또 다른 내용을 위해 무시할 수는 있지만, 도덕적 명령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22
6. 신에게로 향한 두 번째 노정의 구상
1. 우리 뒤에 놓여 있는 무 無
우리가 언제나 현존재하지 않았다는 부정할 수 없는 평범한 앎이 있다. 즉, 우리의 지난날의 “비-현존재”가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의 현존재의 예컨대 물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전제가 옛적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현존재한다” 혹은 “우리가 현존재한다”라고 말할 경우 우리가 말로써 표명하고 언명하는 그것은 우리의 출생 이전에는 없었다. 경험의 이 구체적인 열린 공간은 (나의 경험을 하는 것은 언제나 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이 열려 있음으로써 자기 자신과 재차 연관되어 있고 또 (행위하면서 나의 세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언제나 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을 실행하면서 나에게서 출발해서 세계와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인간 현존재의 모든 개별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으로서 그 자신이 완전히 “존재하지-않음”을 극복하고, 말하자면 이를 자신에게서 밀쳐내는 각각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이다.
그런데 “내가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은 대체될 수 없는 각각 나의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나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의 이전의 “존재하지-않음” 혹은 무 無 역시 각각 나의 것이다. 즉, 그것은 나의 현존재의 입장 안에서 지양 止揚 된 것으로서의 특정의 부정이다. 우리는 누구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동시에 자신을 밀쳐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 안에서 지양하는 우리 자신의 이전의 그 “존재하지-않음”과 더불어 우리 자신으로서 괄호 쳐져 있다.
그러나 이 각기 나의 것임 Je-meinnigkeit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가 단순히 고립된 한 지점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자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나는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 세계에 다양하게 관여하면서 언제나 구체적으로 타자들과 더불어 세계 내에 존재한다. 나는 세계, 즉 같은 인간의 세계, 자연의 세계, 세계 일반을 소유하면서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의 물음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나의 또는 우리의 것인 한에서) 나의 또는 우리의 전세계는 언젠가 현존재하지 않았으며 다라서 전반적으로 그 자신의 무에서부터 생겨난 것이다. 같은 인간의 세계로서, 사회적 세계로서, 역사적 세계로서 나와 우리에 속해 잇는 그것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주적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 즉 우리가 거기에로 들여보내졌음과 동시에 거기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느끼는 그 더 거대하고 더 오래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 역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 아무튼 – 이해하지 못할 우주적-물리학적 과정으로서의 세계인 것은 전혀 더 이상 말로 나타낼 수 없다.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때가 오랜 동안 언젠가 존재하였다고 사람들이 여전히 말할 수 있는 한에서, 인간과 말이 없는 이전의 이 세계는 여전히 (또는 이미) 우리의 언어의 세계에 속하며, 따라서 그것은 관점상 觀點上 우리의 세계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마저 완전히 떼어내어 물리학적 구성물을 완전히 스스로에 맡겨두려는 – 물론 언제나 소용없는 – 시도를 벌인다면, 오로지 침묵과 밤만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세계 내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현-존재하는 자들”로서의 우리와, 그리고 이와 더불어 어느 의미로든 우리의 세계인 이 모든 것과 이 전체는 그것의 과거의 무를 지양된 것으로서 또 영원히 그것에 속하는 것으로서 배후에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 언명이 물리학적 세계과정의 물리학적 지속에 대한 명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학으로서의 물리학의 지속에 대해 말하는 명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찰해 볼 때 우리는 우주적 과정이 이미 무한히 오래 지속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유한한 어떤 시간에 앞서 시작한 것인지 라는 물음을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한 물음은 칸트가 초월적 관념들의 첫 번째 모순으로 제시한 그 난점들 에로 이끌어가고 만다. 23
2. 무 無 그리고 어떤 무엇의 설명 필요성
우리의 현존재 또는 그 어떤 현존재가 그 자신의 무 또는 “존재하지-않음”에서 유래함과 동시에 이 출처를 밀어내고 자신 안에 지양함으로써 새로운 것으로서 현존재하는 그 지점에서 이제 특유의 긴장이 존재자의 존재 안에서 생겨난다. 존재자의 존재 안에서 이 연관을 탐지하는 즉시 우리는 사유함 Denken은 그 긴장을 알아차린다.
사유함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새로운 현존재는 자체로 명백하지 않고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유함에 나타난다. 그것은 자체로 불명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 시선으로는 설명되지 안은 것이 된다. 이 미 해명과 불명료함으로 말미암아 사유함에 있어 어떻든 설명해야 될 필요가 생겨난다. 이전에는 현존재하지 않았던 이것이 왜 혹은 어떤 출처에서 이제는 현존재하는 것인지 혹은 이와 유사한 질문들이 어떻게 일컬어지든 우리는 질문한다.
이 경우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인가 혹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우리의 사유함이다. 세계의 현상들이 그것에 대해 설명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수수께끼인 한에서, 사유함은 그것들에 직면해서 자기 자신과 합치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유함은 자기 자신과의 일치를 필요로 한다. 자기 자신과 일치하고 자신 안에서 안정된 것일 수 있기 위해서는 사유함은 모든 현상들의 출처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런 까닭에 사유함은 질문하면서 설명을 앞서 구상한다. 어째서,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이것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가? 질문은 질문하면서”무엇 때문에” 를 혹은 근거를 구상한다. 질문은 존재하는 그것에 대해 탐색하면서 “무엇 때문에”를 미리 구상한다. 사유함은 자기 자신과 다시 합치되기 위해서 이 “무엇 때문에”를 탐색하고 구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사유함이 “무엇 때문에”를 묻게 되는 사유함의 필요의 이 구상은 사유함이 필요로 하는 것일 뿐만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 이전에 숙고된 사실이, 그것의 무에서 생겨난 어떤 무엇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그와 같은 중요한 경우에 있어서 사유함은 자기 자신을 사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의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것의 사실, 즉 이전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이 새로운 사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봄 Sehen에 대해 사실 자체 Sache selbst가 그것이 설명되어 있지 않으며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는 달리 표현한다면, 단지 자체로만 볼 경우 그것이 자신과 합치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것이 자체로는 존재하는 것으로서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체로는 의심스럽고 일정치 않으며 해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사실은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 의심스러움과 해명되어 있지 않음을 보이면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있고 (미심쩍고 불투명한 대신에) 지속적이고 명백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설명하는 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 사실은 가리키고 있다. 바로 이 설명자 안에서 그것은 자신과 합치하고 또 그러한 합치 안에서 완전한 의미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의 입장에서 그렇게 요구된 것은 (비록 그것이 아직은 사유함을 위해 찾아내진 것은 아닐지라도) 기초 짓는 근거로서, 즉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이 그것의 무로부터 생겨나 존재 안에 확정 지어져 있으며 존속하는 그것으로써 나타난다. 따라서 사유함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은 사실의 견지에서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의 견지에서 사유함에 나타나며 존재자의 각기 새로운 존재의 경험 안에서 명백해진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자의 존재에 대해 해명하는, 즉 사실을 명료하게 해 주는 근거를 묻는, 즉 요구하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들에 정직하게 자신을 개방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보고 인식할 것이다. 이 경험은 사후에 이차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예컨대 존재자의 존재 안에서 단지 특정의 요소들만이 주목됨으로써 전체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경험이 더 이상 완전하게 인지되지 않을 수 있다. 정밀과학에서 부분적으로 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근거에 대한 물음이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함축적으로 또한 이미 전체 “원인-결과-관계”가) 단순히 형식적-기능적 연관에로 축소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방법적으로 현저한 장점들을 가진다. 그러나 이 장점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축소가 어쨌든 하나의 축소, 즉 우선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 우선 “자신을-보여주는 것”으로서 사유함 안에서 경험되는 그것의 축소라는 사실이 방해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그것의 무로부터 생겨난 모든 새로운 사실은 전체적인 것으로서 그것의 등장에 대해, 즉 그것이 새로운 “거기에-있음”에 대해 그것이 “거기에-있음”을 지탱해줌과 동시에 분명하게 하고, 확정 짓고 존재로서 성취시키는 어떤 해명하는 논거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그러한 장점으로 말미암아 방해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근거에 대한 물음은 거절될 수 없으며 그것이 결국에는 당혹스럽게도 예컨대 칸트와 최근에 한스 알베르트가 주의를 환기시켰던24 그 물음에로 이끌기 때문에 금지될 스는 더욱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사유함은 여기에 우리가 고찰하였던 경우들에 있어서 “왜” 라는 물음을 제기할, 즉 해명하고 새로운 존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탐색할 권리를 참으로 가진다.
그래서 이 근거가 아직은 발견된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 전제를 토대로 행위할, 다시 말해 전제된 근거를 탐색할 이유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인과율적 명제가 아니라, 경험 안에서 입증된 근거 – (내지 인과율적) 전제 Voraussetzung의 그 권리에 대해서 신중히 말한다. 이것은 전제로서 동시에 사유함에 대한, 즉 전제되어도 좋은 그것을 탐색해야 될 의무이다. 그것의 권리는 사실 그 자체가 스스로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나온다.25
3. 근거들의 대열
우리가 이 근본 전제로부터 문의된 근거를 탐색한다면, 우선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한다. 우리의 구상은 구체적 경험에서 판명된다. 그 안에서는 실제적인 근거들이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발견되는데, 그것들은 어떤 것이 왜 그렇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며, 또 그렇게 발생한 이것이 어디로부터 그렇게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에로 결정되었는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명백해진다.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근거의 발견은 질문하고 탐색하는 사유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성취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되어야 할 사실 자체를 성취한다. 그러나 성취는 두 번째의 근거 발견이다. 그것은 오로지 사유하는 구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서부터 새롭게 출현하고 구상을 확인하는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물학적 연관에서이든 혹은 물리학적 연관에서이든 아니면 그 어떤 연관에서이든 그러한 근거가 발견되면, 새로운 것은 당분간 설명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설명된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명백하고 확고한 것으로 있게 된다.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그것의 논증을 토대로 그것이 그러한 것이어야만 함을 우리는 본다.
우리는 단지 때때로 어떤 근거를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끈기있게 또 계획적으로 탐색하기만 한다면, 명백히 하는 근거를 우리는 규칙적으로 발견한다. 규칙을 보편적 명제로서 예컨대 “일체의 것은 그 이유를 갖고 있다”라는 형식 안에서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규칙적으로 우리는 명백히 해주는 근거들을 발견한다. 그럴 경우에 그것은 인과율적 명제이다. 그것은 구상된 것은 또한 발견된다는 규칙적인 경험에서부터 질문하는 구상을 토대로 생겨난다. 그 명제는 입증된 것이며, 입증된 이론으로서 그것은 예컨대 칼 포퍼가 생각하는 의미로써 그렇게 가장 잘 이해되는 것이다.26
인과율적 명제는 경험과학 전체가 그것에 기초할 정도로 대단히 잘 입증된 것이다. 근거를 기초짓는 것 혹은 원인을 야기시키는 것이 순전히 기능적 연관 (“a 이기만 하면, 또한 b이다”)을 위해 거의 완전히 고려되고 있지 않을 경우라도 그렇다. 물리학의 기초과학에서는 실제로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나타나는 것 전반으로부터, 즉 근거의 전제가 언제나 재차 판명된다는 사실로부터의 방법적으로 유용한 추상일 뿐이다.
이 연관의 규칙성은 “원인-결과-연관” Grund-Folge-Zusammenhang을 미래의 결과들이 그것으로부터 예고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정도로 판명되고 입증되었다.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더 말할 수 있겠다. 사람들이 근거들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그것들은 결과들을 계획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여기에 전체 기술이 의거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 생각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면, 규칙적으로 그것이 결과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든 그러한 견해를 믿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인식된 “원인-결과-관계”가 확고하게 규칙적임은 그렇게 자명하고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시사되는 전체적 활동영역, 즉 경험과학과 그것을 따르는 기술의 영역에서는 “신” 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으며 도 거기에서 나타날 필요도 없다.사람들은 세계와 그것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기술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신이라는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비록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etiam si Deus non daretur27 여전히 세계와 그 과정은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기술적으로 지배될 수 있다. 신은 세계 내에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는 비트겐슈타인의 명제는 이 점에 있어서 확인되었다.28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리고 더 철저하게 질문되는 즉시 사실은 달라진다. 즉,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관찰하는 모든 것에 대해 명백하게 하는 근거를 찾고자 한다면, 이 설명적 근거가 어디로부터 유래하는가를 질문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발견된다. 근거 역시 어떤 근거를 갖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 역시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근거에 대한 물음은 점점 더 연기된다. 일련의 근거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람들은 그와 같이 생겨난 일련의 근거들이 왜 끝나야만 하는가를 우선 통찰할 수 없게 된다. 왜 우리는 이것이냐 라고 언제나 계속해서 질문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또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실제로 과학적 에로스 Eros는 결코 만족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더 이상 능가될 수 없어 보이는 마지막에 도달해서는 재차 계속해 질문되고 또한 재차 계속해 발견된다. 오랫동안 최종적인 구성요소로서 여겨졌던 원자들로부터 소립자에로 나아간 물리학의 행보는 이것을 아주 인상적으로 뚜렷하게 해주었다. 과학은 마치 언제나 계속해 질문되어도 좋고 또 질문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태도를 취한다. 과학은 말하자면 조정적 관념 regulative Idee으로서의 인과율적 대열의 무제한성에 의해서 움직여져 있다. 일반적으로 과학은 무한한 소급 regressus in infinitium이라는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기를 꺼리지만, 이런 생각에 의해서 그 뜻이 명확히 정의되는 관념에 따라서 행위한다.
물론 “계속되는 그 이상의 근거들의 무한한 대열” 이라는 이 생각은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끝까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앎 혹은 기술에 있어서 다만 중간치적으로 설명된 연관들만을 손에 쥘 것이라는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방대한 것일지라도 이 중간적인 것의 전제들을 우리는 결코 정확하고 완전히 알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질문하고 탐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탐구에 의해서 밝혀지고 밝혀질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한 결코 완전히 알지 못할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고 생각될 수 있는 전제들의 어쩌면 무한한 결과에 비해서 이제 하찮은 것처럼 보인다. 파스칼은 이 문제를 처음으로 명확히 보고 간결하게 표현하였다.29 그것은 풀 수 없는 문제이며, 예컨대 칼 포퍼의 과학론에서 변형된 형태로 반복된다.
만일 우리가 언젠가 원인들의 대열의 끝에 도달할 수 있고, 이 대열은 유한한 것이고 따라서 언젠가 첫 번째 부분, 즉 어떤 제일원인으로서 판명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제일원인은 이제 어떤 제일질료 第一質料 혹은 그 무엇이든 그러한 것의 원형식 原形式 혹은 원상태 原狀態 라고 가정하고자 하더라도 사정이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가정적으로 구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도대체 왜 이 원질료 原質料 혹은 이 원상태가 존재하는지 어째서 재차 질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그것은 물론 왜 전체 세계가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을 뜻할 것이다. 그럴 경우 세계는 그러한 원상태의 관점에서 규정된 것으로 생각된 것일 터이다. 그러한 물음은 여기서 계속 질문되어서는 안 되며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구두 口頭 선언들로써 거절될 수는 없다. 그에 대해서 어째서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말아야만 하는가라는 이성의 반대가 언제나 재차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질문할 권리가 있다. 이성은 거듭 되풀이하여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성은 자신의 물음에 대해 언젠가 아무런 대답도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하간 이성이 질문하기를 중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더 이상 질문해서는 안 된다든가, 세계는 결국 단순히 무감각한 사실 Faktum brutum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에서처럼 가정된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물음을 허락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무한한 소급, 계속된 한없는 가능한 물음에로 재차 한없이 도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직면한다.
그래서 무한한 대열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칸트가 간결히 표현하였던 초월적 관념의 첫 번째 모순은 우리들의 숙고들의 영역에서 미해결의 것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안 된다.30 근거들을 전제하고 그것을 묻기를 간단히 그만두는 것도 이성적이지 못하며, 또한 계속해 질문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 질문하는 것도 이성적인 것 같지 않다.
이 사정을 염두에 둔다면, 세계와 그리고 세계 내에서의 우리의 현존재는 절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요구를 벗어난다. 세계는 결국 그리고 궁극적 근거들을 고려할 때에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 과학의 명제들은 그러한 숙고의 테두리 내에서조차 그대로 진실된 것이긴 하다. 앎의 내부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종래와 같이 그대로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내부 영역을 넘어서 전제들, 심지어 최종적 전제들을 묻고, 궁극적으로 지탱해 주는 토대를 질문할 경우에, 대답은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의 내부 영역에 얼마나 잘 정통해 있든 간에 세계가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언제나 계속하여 파악될 수 없는 신비이다.
4. 결정적인 “근거-물음”
점점 더 철저히 불허하는 세계와 현존재의 이 파악될 수 없음에 직면하여 “왜” 라는 물음은 질문된 근거의 여기에 내포된 구상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제기될 법하다. 질문 방향의 이 변경은 질적인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일련의 질문과 대답을 단순히 계속해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약, 그러니까 이 전체 대열을 떠나서 그것과는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하는 비연속적인 한 운동이다.
질문 방향에 있어서 이 전환은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러한 전환은 가능한 것이며, 또한 합리적이기도 하다. 그것이 전혀 자명하지 않고 고작해야 의문스러운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Scehe의 관점에서 보아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이 다름아닌 사유에 대해 의문스러운 것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이성 또는 사유에 대해 합리적이다.
이 방향전환은 질문이 이제부터 세계 안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대상들과 상황들을 벗어난다는 데에 성립한다. 그리고 “존재하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있다” 라는 기초적인 사실 Faktum에로 질문이 향한다는,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데에 그러한 방향전환이 성립한다. 이 기초적인 사실은 세계 내에서의 어떤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 자체와 그 전반의 토대이다. 그것을 사유하게 될 경우 질문의 내용은 그러한 것일 수 있다. “어째서 어떤 무엇이 도대체 존재하는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물음은 외연적 외연적 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내포한다. 왜 바로 이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하는 것이 왜 바로 그렇게 존재하는가? 나는 또 우리는 어째서 존재하는 것일까? 그 물음은 이러한 일체의 물음들을 포괄한다.31
“어째서 어떤 무엇이 도대체 존재하는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물음은 물음으로서 의미 있는 것일까? 물음이 그와 같이 뒤늦게 사유함 안에서 비로소 결정적으로 간결히 표현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의미 없음을 말하지 않는다. 물음이 의미있는 혹은 심지어 불가피한 질문으로서 느껴지는 경우는 비교적 흔치 않을 뿐이라는 사실 역시 내게는 그것이 의미없음을 말하는 것 같지 않다. “아무튼 어떤 무엇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의문스러운, 심지어 가장 의문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본 경험들을 우리는 좀처럼 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그러한 사실이 언제고 한 번 모습을 보이고 또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존재하는 그것은 존재한다” 라는 그것은 “아무튼 어떤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자명한 것이 아니라, 의문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로 안다는 것으로 족하다. 이것이 정말로 파악되고 경험될 수 있으며 또한 파악되고 경험된다는 그 점은 의심될 수 없다. “아무튼 어떤 무엇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자명한 것이 아니라, 극도로 의문스럽다는 것은 그러한 결정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가장 의문스러운 것이 이렇게 “자신을-보임” Sich-Zeigen은 물론 습관 그리고 각기 가깝고 가장 근접한 가시적인 것 혹은 수중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의 일상적 태도에 의해 지속적으로 은폐된다.32
그러나 은폐하는 가운데 의심스러움이 일반적이고 전체적으로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철저하게 사유하고 조급하게 피상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 즉시 의심스러움은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유함의 경험에 맡겨진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점을 고수해도 좋다. “왜 어떤 무엇이 도대체 있는 것이며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은 적어도 물음으로서 의미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의문스러움은 철저한 사유함과 그것의 늘 가능한 경험을 위해 사실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점을 고수하고 따라서 이 물음을 견지할 경우, 우선 물음의 지평들을 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 상세히 말해서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우리가 납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뜻한다. 첫째로 무엇이 이 물음을 의문에 붙이는지 혹은 무엇이 질문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물음에 부응하는 것인지, 그리고 둘째로 이 물음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미 확신할 수 없음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가능한 대답으로서 무엇을 그 물음이 미리 구상하는 것인지.
가) 질문된 것의 보편성
“왜 어떤 무엇이 도대체 있는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은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무튼 존재하는 그것을 묻는 것이며, 그러니까 그것을 의문에 붙이고 있다. 물음은 존재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어떤 무엇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문에 붙이고 있다. 그것은 일체의 존재자에게서 경험된 일체의 존재의 의문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에 의해 표현되고 있는 의문스러움과 관련하여 우리의 물음은 전적으로 보편적인 것으로서 드러난다.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관점에서 보면, 해당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 있을 수 없다. 그런 까닭에 그것이 묻는 것과 관련해서 이 물음은 여하간 어떻게 해서든 제기될 수 있는 일체의 다른 물음들로 확산된다. 왜냐하면 일체의 가능한 개개의 의문스러움은 “아무튼 어떤 무엇이 전반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처한 이 근본적인 의문스러움에 의해 언제나 망라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이 물음에 의해 처음부터 함께 의문에 붙여지지 않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일체와 관계하는 그러한 물음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일체의 다른 가능한 물음들의 질문할 수 있는 일체의 것의 무게와 동시에 이 물음들 자체의 무게(예컨대 전체 경험과학의 무게)를 하나의 저울판에 두고 또 다른 저울판에는 우리가 제기하였던 이 유일한 물음의 무게를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하면 후자의 저울판의 무게가 전자의 저울판에 얼마나 놓여 있든 간에 그것의 무게보다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왜 도대체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물음은 또한 근원적인 것이어서 그것의 의미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전에 토론되었던 알아맞히기 물음, 즉 유한한 원인들의 대열 자체가 유한한 것인가 아니면 무한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개의치 않는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잇는 어느 경우들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일련의 존재자일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거대한 물음의 근원적 특성에 의해 전반적으로 의문에 붙여진 것이다. 무한한 대열을 둘러싼 논쟁은 결코 그것이 해결되고 해명되도록 기여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근원적인 물음을 결코 침해하거나 심지어 방해할 수 없다. 존재자의 유한한 대열의 경우에도 무한한 대열의 경우에도 “도대체 어찌서 어떤 무엇이 존재하는 것이며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전히 질문될 수 잇는 채로 머문다.
질문된 주제 영역과 관련한 우리의 물음의 보편성에는 또 다른 사정도 있다. 물음은 그 의미상 질문하는 자 자신도 포괄한다. 물음은 사람들이 무엇이든 객체세계로서 주체세계와 대조시키는 그곳도 가능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체의 주관성도 동시에 포괄한다. 질문을 제기하고 간결히 표현하는 우리 자신 역시 그 물음에 의해서 함께 관련되는 것이며, 우리가 물음의 현실적 진지함을 받아들이는 한에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한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왜 물음을 제기하고 또 그것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왜 어떤 무엇이 존재하는가? 이 모든 물음들은 단 하나의 물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존재를 격리시킬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격리시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존재 역시 그러한 물음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의문에 붙여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물음의 진지함과 본래적 차원들을 여전히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나) “물어 알게 된 것”으로서의 “비-존재자” 非-存在者
그러나 물음이 알고자 하고 따라서 물어 알게 되는 erfragt 그것의 방향에서 추적될 경우 여러 관점에서 유일무이한 우리의 물음은 더욱더 독특한 것이 된다. 우리의 물음은 무엇을 질문하는 것이며, 그것이 알고자 하는 것은 본래 무엇인가? 그것은 존재자 전반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 즉 존재자 전체를 그 의문스런 상태에서 확정 짓고 그래서 비로소 자신과 일치시키거나 존립케 하는 그것을 우리의 물음은 알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일체의 존재자의 존재의 근거라고 일컬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물음은 어디에서 이 근거를 찾는 것인가? 우리의 물음은 그 근거를 질문하면서 어디로 구상하는가? 그와 같이 범상치 않은 이 물음을 위한 가능한 대답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우리는 우선 아무런 존재자도 아닌 것이라고 부정적으로만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일체의 존재자가 의문에 붙여져 있으며 따라서 일체의 존재자가 의문스럽고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경험되었을 경우에, 이 물음에 대해 그 어떤 존재자를 언급하는 것으로써는 더 이상 의미있게 대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존재자 역시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우리의 물음에 의해서 문제시되고 문의된 것일 터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것은 문의된 것에 속하는 것이지, 묻고자 하는 그것에 속하지는 않을 터이다.
그러므로 물음은 질문하면서 일체의 존재자와는 다른 것 das Andere, 즉 “비-존재자” das Nicht-Seiende를 일체를 지탱할 수 있는 근거로서 구상하는 것이다. “비-존재자” 혹은 “어떤-무엇이_아닌-것” 무 Nichts 라고 일컬어지는 한에서, 사람들은 물음이 일체의 존재자를 넘어서 무 안에도 일체의 존재자의 존재의 근거를 구상한다고 또한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일체의 존재자를 넘어서고 따라서 이 존재자로부터는 연역될 수 없는 이런 지평이 아무튼 사유함에 열려 있다는 데 대해 동시에 놀라워해도 좋다.
여기에 일체의 유한한 것을 넘어서는, 혹은 초월하는 “원인-결과-연관”의 차원이 우선 물음으로서 생겨난다. 이렇게 해서 근거 대열 내에서의 어떤 첫 번째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월하면서 이 전체 대열과 마주해 있는 어떤 근거의 차원이 생긴다.
다름아닌 무, 일체의 존재자와는 완전히 다른 것, 존재하는 일체의 것을 뛰어넘어 한계 없는 심연이 물음의 의미상 일체의 존재자의 존재를 결정짓고 기초 짓지 않으면 안 된다. 그와 같이 우리의 물음은 그것을 구상한다. 존재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는 형태들의 관점에서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 존재자 일반의 타자로서 구상되어 있는 그것 안에서 물음은 질문하면서 보편적이고 탁월하게 적극적인 기능을 구상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무에 직면하여 우리가 의미 물음을 논하였던 앞서의 그 단원에서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본다. 이제 숙고될 “왜-라는-물음” Warum-Frage은 반대 방향에서 그 극단적 형태로, 즉 세계와 현존재가 거기에서부터 유래하는 그곳에 로 진행된다. 그러나 그 물음은 이제 이 방향에서도 마침내 동일한 심연에 도달한다.
물음이 일체의 존재자를 넘어서 “비-존재자”의 심연과 같은 것 안에 로 질문해 들어가는 한에서, 이 사정은 말하자면 역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경험과학과 그것의 논리에 대해 우리의 물음은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 까닭은 우리가 이미 이전에 숙고하였듯이 경험과학들은 극서들의 근본적인 성향으로 말미암아 존재자의 다른 정확성들과의 그 기능적 연관을 이용하여 존재자의 정확성들을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질문되고 이 물음과 더불어 동시에 존재자 그 자체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는 곳에서 과학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끝장이다.
물론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물음이 제기될 수 없으며 사실의 관점에서도 역시 제기될 필요가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여기에 경험과학의 권한 영역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는 결론만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시성의 권한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질문하는 사유함을 위해서는 과학에 의해서 더 이상 도달될 수 없는 제기되어야 할 물음들이 있다. 질문하는 이성은 그것의 경험들을 토대로 물음을 제기하며 그래서 이 물음들은 한 의미를, 즉 경험 안에서의 한 증명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경험은 과학들의 방법적으로 고려하는 그러한 경험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물음의 차원들을 문의된 것, 즉 존재자 그 자체와 관련해서도 물어 알게 된 것, 즉 일체의 존재자를 뛰어넘어 무의 심연 안에서의 존재자의 근거와 관련해서도 그런대로 숙고한 셈이다. 그러나 물음이 대답될 수 있는지 또는 물음의 견지에서 구상된 것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것이 또한 스스로 현실임을 알리는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숙고의 대상이 되어도 좋은 것이다.
5. 결론
“도대체 왜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물음이 “어떤-무엇이-아닌-것” 또는 무를 향하는 한에서, 우리는 이전에 이미 언급되었던 것을33 여기에 새로이 말할 수 있다. 이 무는 단순히 텅 빈 허무한 무이거나 아니면 턴 비고 허무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어떤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감추는 그러한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들을 우선은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공허하고 허무한 무라면 “도대체 왜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닐까?” 라는 물음은 전적으로 다만 무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러나 만일 그러하다면 이것은 “아무튼 어떤 무엇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전적으로 근거 없고 기반 없는 것임을 의미할 터이다. 그럴 경우 일체의 것은 아무런 근거와 기반이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경험하는 일체의 것은, 그것이 우리의 세계이든 혹은 우리 자신이든, 경험하기에는 의문스럽고 그 결과로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임이 입증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재차 일체의 존재자의 존재는 결국 한없이 의심스러운 것인 채로 머문다는 결과를 초래할 터이다. 무엇이든 존재하는 그것의 존재도 또한 존재하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파악과 앎도 한없이 의심스러운 채 있지 않으면 안될 터이다. 일체의 학 學 과 경험은 결국 기반이 결여되고 의심스럽기 그지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터이다.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일체의 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의문에 붙여져 있을 터이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또한 가능한 모든 의심에 내쳐진 것일 터이다. 한없이 의심스러운 것이 어째서 계속 존속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제기한 문제의 경우에서 보면 결코 대답될 수 없는 근원적 물음에 대해 열려져 있으며 미해결인 채로 있는 있는 것이 어째서 그 어느 의심으로부터도 면제되어야만 하는가?
그러나 끝없이 헤아릴 수 없게 열려 있는 물음으로부터 그와 같이 생겨나는, 극한적 형태의 일체의 물음과 의심조차 막을 수 없는 이것이 아무튼 여전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인 의미로 존재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이란 그것이 그 외에 어떻게 일컬어지든 간에 여하간 그것의 존재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확고한 것이고 명백한 것임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사실이 그 경우에는 더 이상 견지될 수 없을 터이다.
그러나 이 생각과는 달리 존재하는 일체의 것의 존재는 그저 확고부동하다. 있는 것은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존립하며 흔들림이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체의 존재자는 다양한 정도로 무상하고 덧없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한에서, 그것은 존재자로서는 그리 지속적인 것이 못 된다. 그렇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한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진실로 머문다. 이 명제는 또한 아무런 내용 없는 유사어의 반복도 아니며 결코 단순히 형식적인 추상도 아니다. 그러한 명제 안에서 오히려 기초적인 한 근본 경험이 표현되고 있다. 그것은 일체의 존재자의 존재의 권세, ,그 확고부동함의 경험이다. 무엇이든 존재하는 것은 세계의 어떤 권세도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것의 존재 안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존재하는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파괴될 수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는 한에서 또 존재하는 동안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은 파괴되거나 아니면 제거될 수는 없다. 우리의 사유함과 관련해서 이것은 진실인 것이 “진실이 아닌 것”이 될 수 없음을 뜻한다. 사람들은 진실을 거부하고 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실인 채로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사유함에 대해 전적으로 결정적인 것으로 머문다.
우리 자신들 역시 우리의 존재 안에서 결정되어 있으며, 이 확고부동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존재하며,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확고부동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마치 전율하듯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생을 회피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젠가 분명 생으로부터 탈취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존재하는 한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것이 나라는 사실을 나는 없앨 수는 없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또한 나 자신을 절대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 사르트르가 말한다면 – 단죄된 것임을 안다.
그러나 이 확고부동함은 일체를 포괄하는 “왜라는-물음”, 즉 일체의 존재자와 존재자에 대한 일체의 판단들이 결국 끝없고 헤아릴 수 없게 의심스러운 것임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것과는 매우 상반된다. 의심스러운 것은 대답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지속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은 불확실한 것이고 미결정적인 채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그것은 확고부동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순은 오로지 이성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 같다.
그 한 가지는 이와 같다. 존재하는 일체의 것은, 특히 나 자신과 그리고 일체의 나와 같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은 결국 끝없이 의문스러운 것임이 명백하다. 그 결과 그것은 “도대체 어째서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헤아릴 길 없는 물음을 가능케 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존재하는 일체의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존재하는 한에서, 그것의 존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임이 드러난다. 존재의 확고부동함이 우리들 자신인 바 그것의 깊은 곳으로부터 와 똑같이 우리의 세계의 존재자로부터도 우리를 부른다. 존재의 확고부동함은 단지 존재적인 것으로서 이해된 실존의 덧없음으로부터 도 또 끝없이 의문스러운 것임이 증명되는 그것, 즉 그것이 그것 자신의 존재인 한에 있어서 존재자의 그 존재로부터도 연역될 수 없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대체 왜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대한 물음이 모색하며 질문해 들어가는 그 영역으로부터 존재의 확고부동함이 유래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사유할 권리를 가진다. 즉, 일체의 어떤 무엇, 헤아릴 길 없는 심연 저편에 신비가 고지 告知 되는 것이다. 즉, 일체의 존재를 지탱하고 결정짓는 그것이, 감추어진 왜 라는 물음에, 침묵하는 출처가, 무조건적인 근거가 고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존재의 무조건 적 확고부동함 안에서, 즉 우리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음을 “도대체 왜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물음에 비추어서 고찰할 경우에 고지된다.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한 근거를 믿을 수 있는 일체의 근거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다.
소리 없이 또 간섭하지 않으면서 일체의 존재자의 존재를 지탱하고 결정하고 보존하는 일체의 존재자를 뛰어넘는 그 한계 없는 권세를 믿을 수 있는 한 근거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전에 고찰되었던 근거에 비해서 새로운 것이다. 따라서 이 관점으로부터도 우리는 무라고 일컬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일체의 존재자를 뛰어넘는 그 무한한 공간 안에 감추어져 있음과 동시에 계시되는 거대한 신비를 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존재자에게 허락되어 있으며 또 그것이 의문스럽고 덧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그대로 보존되어 잇는 일체의 존재자의 존재의 그 진리가 내세우는 무조건적 주장 안에서 이 권세의 무조건성을 감지한다. 그 안에서 일체의 것이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일체의 것이 시작되는 그 거대한 신비로 말미암아 일체의 존재자에게 그와 같이 존재의 진리가 허락되어 있고 계속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믿을 만한 이성적 근거가 한층 더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 근거를 원인이라고 부르고자 한다면, 원인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일체의 여타의 경우에 사용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근원적인-것” Ur-sache은 두 번째 원인가 그 밖의 원인들이 그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로 세계 내적 원인들의 그 대열에 내재하는 한 천 번째 원인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전체 대열을 근거 짓고 지탱하면서도 그 대열을 구성하는 각 원인들과는 또한 완전히 구별되어 그것의 신비의 초월에고 벗어나 머물러 있듯이, 마찬가지로 각 대열 구성원들에 가까이 또 내면적으로 있는 초월적인 어떤 첫 번째의 것이다.
6. 근거로서의 신비
이 숙고를 통해서 신비에 새로운 특성이 나타났는가? 일체의 것에 궁극적 의미를 보존하는 그것은 동시에 또한 일체의 것에 그 존재와 진리의 첫 번째 근거를 부여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둘 다 함께 새로운 것이면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다. 절대자의 신비는 일체의 존재자의 Alpha 와 Omega이며, 시작이요 마침이며 바로 이 이유로 또한 그 중심이다.
이미 처음에 우리의 숙고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 새로이 예리하고 확고하게 나타났다. 즉, 이 신비가 존재자의 영역을, 그러니까 일체의 범주들을 뛰어넘어서 있으며, 그 때문에 본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신을 알리면서 있다는 사실이 새로이 예리하고 확고하게 나타났다. 절재적 신비의 이 초월은 종교의 전 영역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다.
7. 이 생각의 논리
끝으로 제시된 이 사고과정의 논리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우리가 상반된 규정들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여기에 문제되고 있는 것이 재래의 형식논리의 의미로써 모순논리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정은 이렇지 않다.
결정적으로 그 중대한 “왜라는-물음”을 가능하게 하고 정당화하는 경험은 논리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져도 좋은 것이지만,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자유의 도약과 같은 어떤 것을 뜻한다. 우리가 사유와 탐색의 익숙된 방식들 안에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 당연한 듯이 – 유한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규정들을 서로 유한하게 연결시키는 연관들 안에서 움직인다. 이 연관들의 논리적 연결로부터 결과하는 것은 언제나 다만 그 외의 연관들 혹은 같은 질서 안에서 연관 있는 것들뿐이다. 그러나 이 논리적 과정이 계속될 경우 그 결과로서 따라 나오는 것은 결코 “아무튼 어떤 무엇이 있으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의 당연치 않음에 대한 경탄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이 경험과 그것이 표현되는 물음은 유한한 과학들의 유한한 논리를 계속하는 데에 있지 않다.
존재의 절대적 확고부동함에 대한 근본적인 경험 역시 형식논리적으로는 다만 공허한 유사어 반복만을 가져온다. “존재하는 그것은 있는 것이다”라는 것과 같은 문장 안에서 확고부동함의 무조건적 위력이 드러난다는 것은 형식논리적으로는 도대체 파악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경험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문제이다.
존재자의 관점에서 기인하면서 다만 무로서 나타나는 “비-존재자” Nicht-Seiende는 유한한 논리의 관심을 거의 끌 수 없다는 것이 끝으로 언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비-존재자”가 우리의 유한한 사유함에 대해 일체를 지탱하는 절대자의 나타남일 수 있다는 숙고도 마찬가지로 유한한 논리의 관심을 끌 수는 없다. “비-존재자”는 그것의 부정적 특성으로써는 아무런 강제적인 논리적 과정도 근거 짓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보여주고 알린다.
따라서 지금껏 취해졌던 결정적인 조처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에 유한한 논리를 뛰어넘어 움직일지라도, 그 조처들은 아무튼 객관적으로는 정당화된 것이다. 존재하는 일체의 것은 일체의 것을 결정짓고 지탱하는 근거 위에 있다고 믿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당화된 것이다.
확인된 사태들과 연관들이 일체의 것을 위한 가능성들의 근거들이 놓여 있는 그 영역 안에 있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어쨌든 선험적 논리라는 것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을 터이다. 물론 이 표현이 그러한 숙고를 재차 다른 종류의 형식주의로서만 이해하도록 오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결정적인 숙고에 함께했을 경우, 모든 유한한 논리의 가능성을 위한 전제와 근거가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왜냐하면 일체의 것이 근거 없는 공허한 것이고 그 결과 끝없이 의심될 수 있을 것이라면, 유한한 논리 역시 더 이상 의미 있는 것으로서는 가능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한 한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유한한 논리를 넘어서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논리의 가능성들을 지탱해 주고 정초하는 한 영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해도 좋다. 일체의 것을 지탱해 주고 결정짓는 무한한 신비는 또한 일체의 것의 논리도 지탱하고 결정짓는 것이다.
일체의 것을 지탱하는 무한한 신비로서 “어떤-무엇이-아닌-것”이 자체 안에 지니고 있는 언어적 어려움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이미 지난 단원의 마지막에 우리가 할 기회라고 느꼈던 그 숙고들을 여기에서 다시 환기시켜도 좋다. 왜냐하면 “왜”를 되물으면서, 우리는 우선 “무엇 때문에” Wozu라는 물음의 연관 안에서 우리가 만났던 형언할 수 없는 그 동일한 신비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신비를 말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이전의 것을 다시 환기시킬 수 있다.34
마찬가지로 신의 신 神 다움 Göttlichkeit Gottes 에 대한 물음과 관련해서 이전에 언급되었던 것이35 여기에 반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이 순간에도 현상적으로는 충분히 알려진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존재하는 일체의 것을 지탱하고 결정짓는 심원한 근거, 즉 이 점에 있어서 일체의 현실의 현실이라고 일컬어져도 좋은 그 심원한 근거는 알려져 있는 것이다.
7. 이전 시대의 견해들에 비추어본 두 구상들
우리의 시도에서부터 우리는 이 문제, 즉 신의 문제를 다루었던 이전 시대의 견해들을 되돌아볼 것이다. 특히 전승된 신존재 증명들과, 또 그것들에 대한 비판이 여기에 속한다. 예컨대 칸트에 의한 그것들의 비판적 토론과 함께 신존재 증명들의 전승은 우리가 제안한 사유 방법들의 전제들의 일부를 이룬다.
이 회고를 위해 우리는 전승의 성과를 간단명료하게 간추려 표현하는 세 개의 견해군 見解群 을 선택한다. 이 세 개의 견해군들에 비추어 우리는 우리의 착상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지난날의 생각들이 우리 자신의 생각 안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보고자 한다.
전승된 사유 형태들은 여전히 질문하면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들과 논쟁하고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밝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전승된 신존재 증명들의 두 기본 형태들이다. 결과에 의한 원인의 논증 demonstratio per effectum ad causam은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von Aquin의 이른바 오도 五道36에 의해 제시되는 역사적으로 끼친 영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모델의 한 가지 형태이다. 또 다른 형태를 우리는 이른바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에서 만난다. 그것의 고전적 표현 형식을 우리는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Anselm von Caterbury의 Proslogion(호칭)에서 읽는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세 번째 견해군은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이성비판 Kritik der reinen Vernunft>에서 하였듯이 두 가지 종류의 신존재 증명들과의 고전적인 비판적 논쟁이다.
이 견해들에서 무엇이 본래 사고되었으며,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사유하고자 했던 그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1. 토마스 아퀴나스의 결과 논증
2. 캔터베리의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논증
가) 더 큰 것은 생각될 수 없는 그것
나) 이 생각이 어떻게 사유되게 되는지
다) 현실의 입증
3. 신존재 증명에 대한 칸트의 비판
8. 절대적 신비의 인격적 특성
1. 인격적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가) 자아실행 自我實行
나) 시작할 수 있음
다) 통교 通交
라) 세계지평 世界地坪
2. 의미물음과 인격성
3. 존재자의 근거와 인격적 근본구조
4. 초월성 인격성
9. 절대적 신비의 신격 神格
1. 인간적 모델 안에서의 형태와 계시
2. 가능성으로서의 신적 발현
3. 발현적 현상으로서의 거룩한 것
4. 현실로서의 신적 발현
10. 신의 모습의 역사적 변천
1. 계시와 벗어남
2. 모습의 증가
3. 사회적 신원 확인들과 분리들
11. 무신론
우리가 사유하면서 우리의 현존재를 떠받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무한한 신비를 암시할 수 있고, 또 이 사유에 인간 역사의 경험들도 포함되는 한에 있어서, 게다가 –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시도하였듯이 – 신적인 신마저 암시될 수 있다면 무신론 無神論의 현상은 그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요구한다. 따라서 종교철학은 종교의 부정, 즉 무신론 역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충분한 이유를 가진다. 우리의 시대에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더욱더 있다. 왜냐하면 무신론은 이 시대에 전세계적으로 두루 퍼졌기 때문이다. 무신론은 시대의 역사적 세력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류의 전체 역사 안에서 지금까지 결코 이러한 폭과 차원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던 완전히 생소하고 당혹스러운 현상이다.37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 무신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무신론이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무신론이 오늘날 왜 그러한 역사적 위세를 떨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략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될 수 있겠다. 무신론,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38 그 까닭은 무신론이 그때마다 본래 무엇인가라는 것은 결코 두말없이 명백한 것이 아니며, 또한 무신론이 언제나 그리고 도처에서 동일한 것인가라는 것도 명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1. 그 성격상 강요하지 않는 구상들
우선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것들을 이용해 우리가 신을 암시할 수 있고 또 고찰해 보고자 하였던 그 숙고들이 진지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강요하지 않는 숙고들이라는 사실이다. 그것들은 결단하는 인간의 유한한 자유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며, 그래서 예컨대 수학적 논증이나 “경험적-과학적” 실증들 내지 반론들과는 아주 다른 어떤 것이다. 그것들은 자유에 호소함으로써 비록 그것들이 논증된 것일지라도 자유롭게 동행할 수 있거나 동행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간략히 설명되어야 하겠다.
가) 더할 수 없는 질문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최후의 물음들을 제기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왜 어떤 무엇이 무릇 현존재하는 것일까? 그러나 이 질문들은 반드시 제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무의 모호성
다) 윤리적 요청
라) 역사적 회고들
2. 무신론의 가능한 종류들
가) 소극적 무신론
나) 비판적 무신론
다) 적극적 무신론
라) 무신론과 변신론 辯神論의 문제
제3장: 종교의 실행자로서의 인간
들어가는 말
종교철학에서 우리는 우선 신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모든 순수한 종교는 자신이 신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신을 생각하고 신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태도를 취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신에 대해 말하면서 또한 인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종교철학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서론적으로 숙고하였을 때에 이미 그것은 본래 인간의 사유함에 대한 숙고였던 것이다. 신이 언급될 수 있었던 거기에서 인간 역시 반드시 언급될 수 있어야만 했다. 신이 직접적인 관점에서 말해질 수 있는 반면에 인간 역시 우선은 잠정적으로나마 말해졌던 거기에서 인간에 대한 신의 그리고 신에 대한 인간의 전체 관계는 이미 언제나 명백하였다.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즉 인간이 신에 대해 태도를 취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 게다가 직접적인 관점에서조차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까닭은 종교란 인간이 신에 대해 태도를 취하고 신이 인간에게 신호하며 그의 태도를 규정하는 바로 이 전체 연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 언급하는 곳에서 우리는 또한 종교적 인간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이 인간 태도를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자가 되는 거기에서만 우리는 그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 종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신에 대한 생각은 종교의 결정적인 전제이며 토대이다. 그러나 종교의 모습들을 이루는 것은 인간적 신앙, 인간적 기도, 인간적 예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다. 신에 대한 생각이 전제되고 또 신이 인간에게 신호하고 그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부터 다양하게 결과되는 것은 인간적 태도 방식들이다.
그런 까닭에 이하에서 우리는 종교적 인간과 그의 태도 방식들에 대해 언급해야만 한다.
12. 신앙
신에 대한 인간의 근본관계와 그 결과로 종교의 인간적 토대는 신앙이다.
1. 신앙과 지식
여기에서 뜻하는 종교적 의미로서 신앙은 지식, 특히 이 말의 현대적인, 무엇보다도 경험과학들에 의해서 특정 지어진 의미로서의 지식과는 질적으로 구별된다. 우리는 이미 무신론을 논하면서 그것을 지적할 기회를 가졌었다. 신앙은 지식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고수하는 내용들 역시 단연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본질적 내용은 모든 다른 내용들에 비해 완전히 다르고 파악될 수 없는 신이다. 그 결과로 형언할 수 없고 유일무이한 신에 동의하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고수하는 방식은 마찬가지로 지식의 모든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유일무이한 것이기조차 하다.
그러한 방식을 특정 짓는 것은 정확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확성이란 유한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과학 특유의 객관성과 상호주관성에 의해서도 특징지어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객관성과 상호주관성이란 주체가 비교적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관찰행위의 밖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신에 의해 놀라움을 겪게 된 곳에서 그는 신을 신앙하면서 관찰행위의 밖에 머물 수는 없다. 끝으로 그 내용들을 통제하여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으로서의 지식의 확실성 역시 신에 대한 근본태도가 지닌 특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근본 태도와 관계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신앙과 인격적 자유
3. 신앙의 모델들
4. 신뢰함, 긍정, 앞에 내어놓음
5. 신과 모든 것을 신앙함
6. 신에 대한 신앙과 악
7. 신앙과 기적
기도 -들어가는 말
신앙하는 자는 신을 신뢰하고 그를 그와 같이 긍정한다.
이 근본 태도의 결과로 신앙하는 자는 그의 생이 경과하고 진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다시금 신을 향할 것이다. 신에게로 향하여 이루어지는 이 생의 실행을 우리는 기도 祈禱 라고 일컫는다. 신앙하는 인간은 필연적인 결과로 또한 기도하는 인간일 것이다. 신앙이 종교적 생의 뿌리라면, 기도는 그 꽃이다. 신상이 토대라면, 기도는 그 실현이다.
기도는 사실상 매우 상이한 형태들 안에서 나타난다. 이 사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알려면 이 분야에 여전히 기초적인 작품이라 할 하일러의 저작을 대강 읽어보기만 하면 된다. 39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기도의 본질적 형태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비본질적이거나 공허한 형태들과 구분 짓는 일이다.
기도는 그것이 신의 신비에도 – 또한 하나의 신비인 – 인간의 신비에도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될 때에만 본질적인 것이다. 이 적절함에 우리는 유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기도의 다양한 형태들을 몇몇 기본 형태들 에로 환원시키고자 한다. 내가 보기에는 기도의 모든 방식이 정렬되는 그 가장 중요한 기본 형태들은 이것들일지도 모른다: 침묵의 기도, 언어로서의 기도 그리고 예배 Kult로서의 기도. 이것들은 곧 알게 되겠지만, 세 단계의 명확한 표현이다. 침묵의 기도는 가장 적게 표현되며 본래는 전혀 표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배로서의 기도는 가장 많이 표현되면, 언어로서의 기도는 이 두 극단들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 같다. 이 세 단계들이 더 상세히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는 개별적으로 상술해 봄으로써 비로소 알 수 있다.
13. 침묵의 기도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신에게 우선 적절한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신의 형언할 수 없음을, 모든 개념과 이로써 도한 모든 말을 능가하는 그의 소리 없는 위대함을 고려하는 사람은, 인간의 모든 말들이 유한한 것이며 신의 무한성에 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상기하는 사람은 신에게로 향하면서 우선 할말을 잃을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말을 거두어들이어 침묵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임이 그에게 분명해진다. 그런 까닭에 할말을 잃는 침묵은 기도의 첫 번째 형태이다. 왜냐하면 사멸할 인간이 모든 종교의 첫 번째이며 주도적 규정인 신에 대해 가장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거기에서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침묵은 모든 말을 능가하는 신의 위대함에서 직접적으로 따라 나오는 결과이다. 신의 위대함이 그 엄청난 규모로 인간을 접촉하고 움직일 때에는 언제나 인간은 우선 할말을 잃고 침묵할 것이다.
이 결과를 좇아서 우리는 우선 침묵의 기도를 숙고해 보자.
이것은 아마도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극단적인 경우일 것이다. 그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종교성이 펼쳐지는 구체적 삶에서는 오히려 매우 드문 경우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서양의 그리스도교적 전통에서 특히 위대한 신비가들에 의해서 종종 묘사되었다. 가장 위대한 세계종교의 하나인 불교가 실로 침묵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사실은 생각할 거리를 우리에게 준다. 따라서 이 기도가 인간적인 것의 한계라면, 이 한계는 여전히 인간적 가능성들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나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머문다.
침묵의 기도를 특별히 수련하였으며 또한 서술하였던 서양적인 혹은 동양적인 유형의 신비가들은 그 자체로는 “정상적인” 종교적 인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종교의 별난 특수 형태로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종교의 모든 형태들을 이해하는 데에 기초적이고 중요한 종교의 매우 정확하고 적절한 근본 형태를 알려주는데, 이 근본 형태는 구체적 실행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것의 한계선상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시도가 역설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침묵의 기도를 서술해 보고자 한다. 우리의 시도가 역설적임은 아무런 말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 말들이 이 기도의 서술에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1. 침묵의 부정적 특성
침묵의 기도는 일상적 활동과 입에 오르내리는 말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선 부정적인 것이다. 이것은 아무것도 획책하지 않음이며 어떤 것에 의해서도 책동되지 않음이다. 그것은 어떤 것에 관해서도 말하지 않음이며 더 이상 말함의 운동에고 몰아넣어지지 않음이다. 그것은 정신의 고요함이요, 전체 인간의 침묵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침묵하면서 일체의 “어떤 것”, 즉 세계의 모든 사물들과 이름들과 관심사를 파악함 내지 파악하고자 함의 개념으로부터, 말로 나타냄 또는 말하고자 함으로부터 풀어놓을 것이다. 그는 세계를 소유함과 세계에 의해 점령당해 있음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는 욕구들과 그 호기심들이 진정되도록 할 것이다. 그는 아주 평온하고 태연자약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인간이 무와 같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40
2. 잠심 潛心으로서의 침묵의 적극적 특성
그러나 이 침묵 또는 방념 放念 또는 무처럼 됨은 단지 부정적인 것일 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적 분주함과 잡담과는 부정적으로 대조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신의 숨겨진 긍정적 특성을 자체 안에 지니고 있다.
이것은 우선 마음준비 Bereitschaft 라는 긍정적 특성이다. 어떤 것도 듣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듣고자 개방되고 준비되어 있는 순수한 청취와 같다. 혹은 그것은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는 않지만, 모든 것에 대해 열려 있는 바라봄의 순수한 밝음과 같은 것이다.
마음준비로서 침묵의 기도는 또한 완전한 공개이기도 하다. 완전한 공개로서 그것은 잠심 Sammlung이다. 그것은 이러저러한 것에로의 분심 分心 으로부터 모음이다. 분심은 가능한 모든 것 에로 갈라져, 모든 가능한 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데, 그것은 닥치는 대로 매달리어 가능한 다른 모든 것을 단념할 정도이다. 그래서 분심은 세계를 나누고 동시에 분산시킨다. 그리하여 세계는 분할되고 분심된다. 분심은 나뉘어지고 흩어지고 따로따로 되어버린 것 안에서 이리저리 유랑한다.
이에 분해서 분심으로부터 자신을 모은 잠심의 고요함은 이 잠심의 고요함이 갖는 힘으로 세계와 현존재의 전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관계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잠심의 고요함은 그 무엇이든 존재하는 일체의 것을 허용한다. 그것은 아무것도 차단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더 적극적이다. “존재하게-하면서” 그것은 모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며, 그래서 일체의 것과 전체적인 것과 소리 없는 화합을 이룬다. 이렇게 될 수 있음은 다름아니라 그것이 개별적인 어떤 것도 붙들고 매달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심은 세계가 결여된 것이 아니라, 세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즉 프란츠 폰 바아더의 짤막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잠심은 세계에 빠져들지 않은 것이다.41
그래서 종교적 언어에서 통용되는 잠심이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를 얻는다. 침묵하는 마음준비의 고요한 공간 안에 모든 것이 모아져 있으며, 전체 외부세계, 전체 내부세계,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모아져 자유롭게 된다.
그러나 침묵의 잠심은 내부 및 외부세계의 모음 그 이상의 것이다. 그리고 이 여분의 것은 마침내 결정적인 것이다. 침묵의 잠심은 모든 세계를 에워쌈으로써 동시에 모든 세계를 능가하는 순수한 자유와 개방이다. 그것은 그것의 폭 안에 모아진 모든 세계와 더불어 모든 세계를 넘어서 이름없는 심연에 도달한다. 세계가 거기 에로 모아지는 그것은 모든 세계보다 더 크며, 측량할 수 없게 더 크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지탱하고 허락하고 기다리는 신비의 무한함이 지닌 헤아릴 수 없는 넓음이다. 침묵하는 잠심은 모든 세계를 넘어서 소리 없이 모든 것을 감싸는 신성 神性 의 심연에로 열려져 있다.
3. 대월 對越 로서의 침묵의 긍정적 특성
이 점에서 침묵과 잠심에 대한 서론적 규정들에 이어 세 번째이며 결정적인 규정, 대월 Andacht에 대한 규정이 연결된다. 대월 역시 종교언어의 오래된 때로는 진부한 어휘인데, 우리는 이 말에 다시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헤겔의 종교철학에서 이 말은 당연히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한다.42
대월은 사유의 방향을 가리킨다. “An”이라는 음절은 방향을 말해주고, “dacht”라는 음절은 사유 Denken를 발해준다. 그러나 사유 思惟는 우리의 문맥 안에서는 인간의 전체 생동적인 현존재를 위해 사용되어도 좋다. 따라서 대월이라는 어휘는 전반적으로 보아 침묵에로 모아진 현존재의 방향 또는 이행성 移行性 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그와 같이 이해되면 대월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현존재 전반의 조용히 모아진 물결은 자신 안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고요함 안에서 바로 자신으로부터 떠나서 영원한 신성의 소리 없는 신비에로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이 운동의 의미는 “신을 생각한다”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느님이시여, 당신을 생각합니다”라고 표현될 수 있다. 후자의 표현이 더 정확한 이유는 대월에 있어 신은 “어떤 것”으로서 소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월은 일체의 어떤 것 피안에서 “하느님이신 당신께”로 고요하고도 직접적으로 향하면서 고양 高揚 된다. 만약 그것이 말로써 표현될 것이라면, 신은 그것에 대해 호격관계에 있지 목적격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말하지 않는다. 아무런 말도, 심지어 신이라는 말도 거기에 터져 나오지 않는다.
대월 안에서 침묵의 기도는 완성되며, 그 안에서 비로소 그것은 완전히 그리고 충만 된 의미에서 기도이다. 자신으로부터 생동적으로 떠나 영원자에로 넘어감의 이행성 Transitivitat 안에 전체와 극치 極致 가 드러난다.
4. 감사의 회심 回心과 종교의 순환
이 전체와 극치는 자체 안에 또한 회심 回心 을 지닌다. 이 안에서 비로소 이 기도의 전체와 극치가 완성된다.
왜냐하면 내가 침묵하면서 너에게로, 스스로 침묵하는 영원한 너에게로 고양되면, 나는 그 운동이 현재로서는 나에게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더 먼저 또 더 근원적으로는 그것이 이미 내가 열중하고 있는 신비 자체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대월 안에서 나의 정신 집중된 방향전환을 포함해서 먼저 나를 생각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만, 침묵의 기도가 말을 할 것이라면, 그것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나를 나에게 선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기도의 순간에 내가 나를 당신에게 선사한다는 이 사실을 나에게 선사하였습니다.” 이것은 회심이다. 회심 역시 언어 없이 살아가며, 침묵 안에 현재한다. 대월을 하는 종교적 인간은 자신의 대월이 거기에로 자신을 선사하고 가져다 주는 그 신비에 의해 선사되고 떠받쳐져 있음을 안다. 종교적 인간의 대월은 그것보다 이미 언제나 앞선 더 근원적인 한 운동에로의 운동으로서 이해된다. 이 점에서 대월은 단지 주관적인 것만이 아닌 훨씬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자체로 그리고 영원한 너로부터 실행되고 이미 언제나 실행된 것만을 뒤따라서 그리고 더불어 실행한다. 묵상의 이 “순환 구조”를 – 그리고 동시에 종교 일반의 순환 구조를 – 우리는 훨씬 더 자주 만날 것이다.
이것이 헤겔이 대월의 사변적인 것이라고 일컬었던 그것 43 상이한 운동들의 “함께 속함 Ineinsschlag”이기도 하다. 이 생각 안에서 파악되는 것은 내용 없는 형식적인 추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 인간의 실제적 삶과 특히 침묵의 기도를 고려하여 그것을 이해할 경우, 우리는 그것이 생동적인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기도와 그 정점, 즉 대월의 완전한 삶이 그러한 생각에 의해 정확히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14. 언어로서의 기도
1. 언어의 신학적 차이와 부정적 언어
2. 적극적-상징적 언어
3. “마음을 쏟아놓음”
4. 언어의 관계적 특징
5. 대월과 감사
15. 예배로서의 기도 I:
회중, 선포 그리고 회중의 기도
1. 예배회중 禮拜會衆
2. 선포
가) 선포의 신학적 및 인간학적 극점
나) 자아와 신의 동일화 同一化
다) 신의 이름을 부름
라) 위임 委任과 기억
마) 회중과의 언어 공동체
바) 선포의 당혹케 하고 마음을 사로잡는 특성
사) 선포와 회중
3. 회중의 기도
16. 예배로서의 기도 II:
실재 상징적 행위로서의 예배
1. 실재 상징적 행위로서의 언어
2. 실재 상징적 행위로서의 예배언어
3. 예배의 활동 공간으로서의 거룩한 시간들과 장소들
4. 예배언어의 예식화
5. 예식적 예배언어의 긴장과 위기들
6. 예배의 다중적 종합
17. 종교의 폐해 弊害
종교의 폐해 弊害 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가 그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서도 종교의 형태는 유지할 경우 생기는 현상이다. 비본질적인 종교가 종교의 형태를 유지하는 이 독특한 특징 안에서 종교는 종교의 형태마저 벗어버리는 무신론과 구별된다.
1. 폐해가 가능한 이유들
종교의 폐해의 가능성은 세 가지 요인들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생겨난다.
폐해를 가능케 하는 첫 번째 요인은 종교의 내면성과 표현의 차이에 있다. 이 차이는 침묵의 기도에는 없다. 그런 까닭에 이 기도는 다만 본질적인 것뿐일 수 있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탈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를 비판하기 위한 아무런 취약점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어로서의 기도가 나타나고 다시 말하면 종교적 내면성이 표현되는 곳에서는 사정은 다르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은 내적 본질과 그것의 표현을 구별할 수 있다. 이 구별 역시 우리가 보았듯이 종교적 언어가 그것의 원래의 힘 안에서 나타날 경우 취소된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이 차이의 전제조건이다. 언어의 형태는 실행의 내면성과 대조를 이룰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비록 공허한 형태로서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종교의 형태일 수는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미 성서에서 읽듯이 –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마태 15,8: 마르 7,6) – 여기에 종교적 종교비판 역시 등장한다. 이것은 대부분 언어적 표현이 그 탁월한 형태에 도달하는 곳에 서, 즉 예배 안에서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예배는 한편으로는 표현된 종교의 뛰어난 형태이며, 그 안에서 표현은 그 절정과 충만함에 도달한다. 그 때문에 예배는 또한 종교의 가장 커다란 위협이기도 하다. 다름아닌 표현의 충만함은 실행된 본질과 대조를 이룰 수 있음으로 해서 외적이고 공허한 것이 되면서도 종교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표현된 종교의 전개를 예배의 형태들에 이르기까지 숙고해 본 후에 이제 덧붙여 종교와 특히 예배가 “비본질적으로-되어감”에 대해서도 부득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종교비판, 즉 종교적 종교비판 역시 종종 바로 예배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이다. “내가 반기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호세 6,6: 1사무 15,22: 전도 4,17)라고 우리는 종종 성서에서 읽는다.
종교의 폐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와 같이 언제나 외면서와 내면성 사이의 차이이다.
그러나 인간 안에서 폐해를 가져오는 적극적인 경향이 없다면 오로지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종교의 폐해가 생겨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경향에서 이중적 요인이 구별된다. 우선 세계의 표상할 수 있고 포착할 수 있는, 그래서 알 수 잇는 것에로 향한 인간의 경향이 있는데, 토마스에 따르면 이것은 “Conversio ad phantasmata”[* 글자 대로 ‘幻影환영들에로의 전환’ 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표현으로 토마스가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감성적 직관과 지성적 사유가 인식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미 실재 상징적 행위로서의 예배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경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주로 종교의 표상할 수 있고 포착할 수 있는 요소들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모습을 본질과 본질의 실행에서 떼어낼 수 있다. 표면적인 것에고의 경향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서 종교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가능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면에 드러난 요인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저 혼자만으로는 종교를 그것의 외형 안에서 유지하려는 그 폐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터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이상의 요인과 인간 안에 있는 또 다른 더 깊이 잠복해 있는 경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대부분 감추어져 있고 이따금씩 돌출하기도 하는 무한하고 절대적으로 “존재하려는-원의 Sein-Wollen”, 지식과 권력과 행복에 있어서 무한하고 절대적이고자 하는 원의가 여기에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 안에는 가장 깊숙히 이 경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일체의 지식과 권력과 행복을 그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깊은 경향과 힘들과 결부되어 무한하고 절대적인 것을 신으로 말미암아 약속하는 종교 역시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인간은 그의 이 가장 심오하고 내면적인 일에 있어서 그 자신을 별로 확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깊은 경향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
그런 까닭에 인간이 종교를 포기하려고 할 경우에라도 그가 실상 종교를 포기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의 본질을 이미 떠났거나 배신하였을 경우에라도, 그것의 외형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종교의 폐해를 가능케 하는 이 세 요인들의 결합으로부터 종교의 폐해의 상이한 형태들이 결과한다. 그것은 내면성과 표현의 차이, 포착할 수 있는 것에로의 표면적 경향 그리고 그 자신을 별로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신과 비슷하고자 하는 잠복해 있는 경향의 세 요인들이다.
2. 공허한 확대 재생산
3. 이데올로기로서의 종교
4. 종교적 광신
5. 종교의 혼합된 현실
맺는 말: 끝없는 끝맺음
역자 후기
이 책의 번역 대본은 Bernhard Welte, Religionsphilosophie. Freiburg i. Br. 1980년도 제3판이다. 다른 언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데에 따른 어려움이란 새삼스러운 사실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소개되는 작품과 관련하여 옮긴이는 이러한 사실을 개인적으로 깊이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깊은 생각이 독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전달될 수 있기를 옮긴이는 기대해 본다.
소개되는 작품의 주제는 종교철학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종교는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가? 점차 과학화되고 합리화되어 가는 현대세계 안에서 종교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성의 광장” 앞에서 종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무신론적 종교비판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아마도 니체일 것이다. 그것은 니체 자신이 가장 예리한 종교비판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비판이 가져올 결과를 스스로의 삶에서 누구보다 예리하게 예감하였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종교비판은 다음과 같은 간결한 표현 안에서 집약적으로 예고되고 있다. “가장 커다란 최근의 사건 – ‘신은 죽었다’, 그리스도교적 신에 대한 신앙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첫 번째 그림자를 유럽에 드리우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들의 근거와 이상으로 여겨지던 신이 실은 “생과는 대립된 것”으로 이해되었다면 이 신을 신봉하는 종교는 니체의 주장대로 분명 “허무주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역사적 필연성”이 되어버린 허무주의란 사실 신 자신이 인간의 생을 억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그의 생을 소외시킨 결과가 아닐지? 이러한 의구심이 점차 그 확실성을 더해만 가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오늘날 도처에서 발견된다. 지난날 “신비”의 이름으로 인간의 권리가 부당하게 억압되었다면, 오늘날 그에 대한 단순 대응논리, 다양한 형태의 “신비의 해체 시도”가 빚어낸 스스로 감당해 낼 수 없는 결과들에 우리들은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 통일된 개념을 획득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성”의 상실이 우리 시대에 무엇보다도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듯하다. 거대한 우주 안에서 한없이 왜소하기만 한 인류가 자연을 향해 오래 전에 내디뎠던 대장정의 역사가 이제 그 무한한 잠재력의 첫 모습을 내 비추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의 문턱에서 사람들은 그에 못지않게 점점 알 수 없는 것이 되어만 가는 자신에 대해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본래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두려움이란 흔히 우리가 어떤 사실을 직시할 수 없는, 또는 더 정확히 말해 직시하고자 하지 않는 곳에서 그 위세를 떨치게 마련이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에게서 자신을 직시할 용기를 빼앗는 것일까? 그 숨겨진 이유는 어쩌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였듯이 “공감적 혐오감”과 “혐오적 공감”이라는 인간 실존의 근원적 불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인간은 “그의 마음의 모든 정열을 기울여 진리와 행복의 무조건적인 것을” 소유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결코 파악할 수 없고 그 때문에 그에게 때로는 “무” 처럼 나타나는 그 무조건적인 것에 완전히 귀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무와 같은 무조건적인 것이, 불확실성 자체가 그를 압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하자면 무의 “거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보기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겨나는 긴장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적극적으로, 즉 키에르케고르가 지적하였듯이 도약의 방식으로 – 신앙의 결단 아니면 그 반대로 신앙의 거절로서 – 그 해결이 모색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자신에 대한 무관심 안에서 억압되고 회피된다. 하지만 무관심이야말로 문제 해결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교묘한 거절일 것이다. 그래서 지난날의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여러 종류의 종교비판 이론들로부터 오늘날 만연되어가는 종교 무관심에 이르기까지 종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태도들은 단순히 신에 대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 대한 인간의 태도 표명의 또 다른 형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들의 배후에는 물론 언제나 신에 대한 여러 가지 굴절되고 왜곡된 오해들이 숨겨져 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이 한때 “인간의 삶을 간섭하기만 하던” 것으로 느껴졌다면, 이제 그것은 “인간의 삶에 더 이상 아무런 근본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고작해야 인간 삶의 채울 수 없는 한 빈틈, 불안 속에 여전히 비집고 들어선 “액세서리화된” 존재를 관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신 자신이 이와 같이 “생과는 대립된 것”으로 이해되는 곳에서는 종교비판은 분명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을 억압하고 그에게서 생의 춤만을, 실존의 영예를 빼앗는 그러한 신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신, 더구나 그리스도교적 의미의 신일까? 신을 신앙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본래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들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현대인의 의식에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하는 바로 그 허무주의적 태도 안에서 신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신에 대한 깊은 열망을 감지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배후에서 “약속된” 충만을 어떠한 형태로이든 이미 예감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있어 공허와 환멸이란 도대체 가능하지 않을 터이기 때문이다.
세속화와 비신성 非神性 이 삶의 토양이 되어버린 오늘의 종교 현실 안에서 저자는 신앙할 수 있는 이유와 그 정당성을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은 숙고들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앙이 인간에게 삶을 위한 진정한 기쁨과 힘이 될 수 있음을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저자와 함께 사색하는 가운데 이 신앙의 기쁨과 힘이 우리 안에도 되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경 사항이 번역 과정에서 있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에는 없는 “” 기호를 번역 본문에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본문의 장절(기호)의 일부 내용 (예컨대 원문에서 $12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기도”부분)을 그 내용에 따라 원문의 배열과는 달리 ($13에로) 배치하였다. 이에 따란 각주 번호도 재조정되었다. 또 번역본으로 삼은 독일어 원본 제3판의 $11의 각주 번호 11은 원문에 누락되어 있어 우리말 번역문에서는 생략하였다. 끝으로 독일어 원문에는 미주로 처리된 각주를 우리말 번역본에서는 각주로 처리하였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역자의 각주는 본문 해당되는 곳 하단에 별표(*)로 표기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도출판사의 강순건 사장 신부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998년 2월 25일 사순절, 재의 수요일
옮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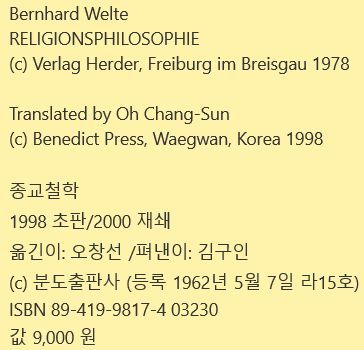
** 지금도 ‘필사 筆寫’ 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Disclaimer: 여기에 실린 글은 copyright가 된 책, 기사를 ‘발췌, 전재’를 한 것입니다. 모두 한 개인이 manual typing을 한 것이고, 의도는 절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fair use의 정신을 100% 살린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적인 제한, 독자층의 제한’을 염두에 두었고, 목적은 단 한 가지 입니다. 즉 목적을 가진 소수 group (church study group, bible group, book club) 에게 share가 되었습니다. password protected가 되었는데, 만일 이것이 실패를 하면 가능한 시간 내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러한 생각을 근거로 할 때에, 그 외에는 흥미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철학적 체계 안에서의 종교철학의 위치에 대한 S. 홀름의 그 견해는 내게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S. Holm, Religionsphilosophie (Stuttgard 1960) 11-63. ↩
- 이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을 알려면 M. Muller, Sein und Geist (Tubingen 1940)을, 그리고 최근의 것으로는 K. Hemmerle, Thesen zu einer trinitarischdn Ontologie (Einsiedeln 1976)을 참조하라. ↩
-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려면 M. Heidergger, Sein und Zeit (Halle 1927) 7. Die phanomenologische Methode der Untersuchung, 27-39; 재인쇄, <전집> 제2권. F. -W. von Hermann 간행 (Frankfurt a.M. 1977) 36-52를 참조하라. ↩
- Boethius, De consolatione philosophiae, PL 63. ↩
- Phaidros 278d ↩
- Metaphysik A 2, 982b 28ff. ↩
- H. Dumery, Phenomenologie et religion (Paris 1958) 99 참조 ↩
- 이에 대해서 저자는 다음의 저서들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Heilsverstandnis. Philosophische Untersuchugn einiger Voraussetzungen zum Verstandnis des Christentums (Freiburg i.Br. 1966) etc.. ↩
- V. Gardavsky, Gott ist nicht ganz tot (Munchen 1968). ↩
- P. Tillich, Reglionsphilosophie, <전집> 제1권. 간행: R. Albrech (Stuttgart 1959), “종교와 문화”의 주제에 대해서는 329-331을 참조하라. ↩
- 더 상세한 것을 알려면 Grenzsragen desGlaubens. Theologische Grundfragen als Grenzprobleme, Ch. Hoergl/F. Rauh 편찬을 참조하라. ↩
- L. Wittgenstein,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를 보라. 처음 1921년 런던에서 출간되었고, 현재 저작집 1권 (프랑크푸르트 1960) 7-83에 실려있다. 이하 <논고>로서 인용된다. ↩
- L. Wittgenstein,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유작)을 보라. 처음 1953년 옥스포드에서 출간되었고, 현재 저작집 1권 (프랑크푸르트 1960) 279-544에 실려 있다. ↩
- 참조: Traktat, 명제 4: “생각은 의미 있는 명제이다.” ↩
- Traktat, 명제 4.023 ↩
- Traktat, 명제 4.1. ↩
- Traktat, 명제 2. ↩
-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B 641/A 613참조 ↩
- 이에 대해서는 “quod deus non sit in aliquo genere”, 즉 “신은 존재자의 어떤 범주들로써도 파악될 수 없다”라는 명제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상술을 참조하라. 이 명제는 토마스 에게 있어서 <신학대전>에서도 <이교도 비판 대전>에서도 결정적 자리에서 전개되고 있다 ↩
- Die onto-theo-logische Verfassung der Mataphysik,상게서. 70. ↩
- 예컨대 P. Tillich, Die Uberwindung des Religionsbegriffs in der Religionsphilosophie,수록: 같은 이, <전집> 제1권, 상게서, 365-388 ↩
- P. Tillich, Das religiose Fundament des moralischen Handelns, 수록 <전집> 제3권. R. Albrecht 간행 (Stuttgart 1965) 24. ↩
- Kritik der reinen Vernunft, A 426ff. 참조. ↩
- 상게서(Albert)를 보라. ↩
- H. E. Hengstenberg, Zur Frange nach dem Ursprung des Kausalbergriffs, 수록: Zeitschrift für philosophishe Forschung, 제27권 (1973) 237-245 참조. ↩
- K. R. Popper, Logik der Forschung (Tübingen 1966 제2판) 31ff. 참조. ↩
- Hugo Grotius, De Jure Belli ae pacts, 서문 II. 이것은 그 모든 생의 영역에서 전체 삶을 지배하는 곳에서 마침내 신의 문제를 도대체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근대과학의 방법적 단초이다. 이에 대해서는 B. Casper의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Die Unfähigkeit zur Gottesfrage im positivistischen Bewustsein, 상게서. ↩
- L Wittgenstein,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상게서. 명제 6.432. ↩
- 예를 들면 Pascal, Pensées, Brunschvicg 간행, 단편 72를 보라. ↩
- Kritik der reinen Vernunft, A 426ff. 참조. ↩
- 라이프니츠는 나의 앎의 이러한 물음을 처음으로 In der Vernunft begründete Prinzipien der Natur und Gnade 안에서 표현하였다. 수록: Gottfried Wilhelm Leibniz, Philosophishe Schriften, H. H. Holz 간행 및 번역. 제1권: Kleine Schriften zur Metaphysik (Darmstadt 1965) 414-439, 특히 427. 이 물음은 쉘링에 의해 그의 Philosophie der Offtenbarung 에로 재차 수용되었다. 수록: Schellings Werke. 보완 제6권. 상게서. 7. 최근에 그 물음은 하이데거에 의해서 역시 재차 수용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상가들은 저마다 자신의 방향에서 물음을 제기하였으며, 지은이 역시 이렇게 한다. 라이프니츠에 대해서는 또한 Anna Theresa Tymieniecka, Leibniz’ Cosmological Synthesis (Assen Holland 1964)를 보아라. ↩
- “존재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의 자명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강조한다면, 즉 질문의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에 상응하는 방식과 발언권에 대해서도 강조한다면, 우리는 예컨대 바아더 Franz von Baader에게서 생을 통한 그리고 생 안에서의 봄과 경험을 위한 전우 戰友를 만난다. 특히 칸트의 실천이성의 연역과 실천이성의 절대적 맹목성에 대해서 부록을 보라. 부록, 수록: <전집> F. Hoffmann 간행. 제1권(Aalen, 1963)(Leipzig1851년도 판의 신판). 22.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왜냐하면 생은 결코 그것의 권리를 빼앗아 논쟁으로 소진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이 그것의 진화의 어떤 단계에서 또한 본다는 것은 극서의 값진 권리들의 하나임은 물론이다!” ↩
- <5.2.다> ‘무의 모호성’을 참조하라. ↩
- <5.5.나> 이하 참조 ↩
- <5.5.나> 이하 참조 ↩
- Thomas von Aquin, S. th. 1,2,3. ↩
- 이에 대해서 나는 다음의 책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다: Die Wurde des Menschen und die Religion. Anfrage an die Kirche in unserer Gesellschaft (Frankfurt 1977). ↩
- 이에 대해서는 F. Ulrich, Atheismus und Menschewerdung (Einsiedein 1966); J. C. Murray, Das Gottesproblem gestern und heute (Freiburg i.Br. 1965); B. Welte, Die philophishe Gotteserkenntnis und ide Moglichkeit des Atheismus, in: Zeit und Geheimnis, 상게서, 109-23 참조. ↩
- F Heiler, Das Gebet, Munchen 1923, 제5판. ↩
- Meister Eckhart, Die deutchen und lateinischen Werke, Die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의 위임에 의한 발행. Die deutschen Werke. 간행 및 번역: J. Quint, I. Bd. (Stuttgart 1958) 107. ↩
- Franz von Baader는 자연, 공간 및 시간의 연관 안에서 그러한 구별들을 한다. 예컨대 간결한 예로서 Fermenta Cognitionis, 4. Heft, 13을 보라. 수록: Samtliche Werke, Bd. 2, 상게서, 295f. ↩
- G. W. F. Hegel, Vorlesungen uber die Philosophie der Religion. 간행: G. Lasson, I. Bd, Halbband I (Hamburg 1966), 특히 235, 238, 240을 보라. ↩
- 상게서, 240쪽을 참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