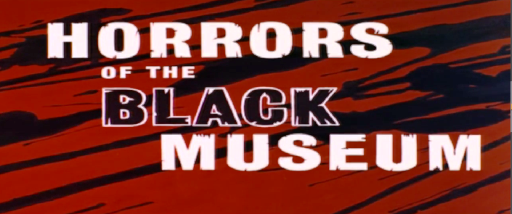싸~늘~ 한 5월 초, 성모의 밤
¶ 싸늘한, 아니 아예, 이른 봄의 꽃 시샘 추위를 연상하게 하는 싱그러운 5월 달 첫 토요일 아침. 지난 밤에는 급히 ‘강제로’ 70도에 hold했던 2층 thermostat로 말미암아 central heating 이 밤새도록 ‘겨울의 소음’을 내며 돌아갔다. 웬만하면 bed blanket warmer로 견디면 되겠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2층 small bedroom 구석에서 3주 째 젖을 먹으며 자라고 있는 5마리의 kittens들이 신경이 쓰였던 것이다. 분명히 이런 ‘추위’는 처음일 것이라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
지나간 주일들, 초여름의 끈끈함을 느끼게 하는 ‘무더위’의 맛을 보여 주더니 역시 자연은 공평한 것인가.. 기억 속의 5월, 언젠가는 이렇게 unseasonable 한 음산한 추위를 꼭 보여 주었다. 역시 한치도 어김없이 싱그러운 성모성월의 벽두에 이렇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폭우가 하루 종일 내리며 ‘5월의 추위’ 까지 찾아온 것이다.
지난 주에 그렇게도 덥게 느껴지던 날 올 처음으로 아래층 마루 아래 crawlspace에 들어갔다가 central furnace의 pilot light를 아예 꺼버리고 나온 것이 조금은 후회가 되었다. 이제는 아래층의 central heating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속단을 한 것이다. 당시에는 ‘설마 다시 추위 질까?’ 하며 그렇게 한 것인데 오늘 아래층에 내려가니 이건 완전히 냉장고로 변해 있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kitchen에 남겨둔 toy같은 space heater 덕분에 ‘동사’는 면했다. 그러면서 생각에.. 아마도 이번의 싸늘함이 올 여름 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추위’가 아닐까.. 이제부터는 cooling system에 온통 신경이 쓰일 계절이 아닌가? 아~ 이제는 우리의 ‘고철’ a/c (air conditioner)가 올해는 무사히 견디어 줄까.. 하는, 혹시 무슨 일이.. 하는 자괴감에 젖는다.
¶ 레지오 피정, 성모의 밤: 2017년 아틀란타 순교자 성당 레지오 주관 2일간의 ‘연’ 피정이 숨가쁘게 바쁜 스케줄로 피곤한 우리를 맞이했다. 한 동안(1~2 년간?) 피정이란 곳에 못 가보아서 생소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했지만 반갑기도 했다. 지난 4~5년 동안의 내가 가보았던 레지오 피정의 느낌들이 만족스럽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가본 것들은 대부분 ‘집을 떠난, 진짜 피정’ 들이었지만 이번은 본당에서 하는 ‘편하지만.. 느낌이 덜 한’ 그런 것이고 이틀 째 날의 스케줄은 조금은 아찔한 것. 아침부터 밤 9시를 넘어가는 숨이 찬 하루였다.
피정 둘째 날의 그 바쁜 스케줄은 사실 피정과 상관없이 본당의 다른 행사인 ‘성모의 밤’ 이 저녁 늦게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그것은 꼭 참가하고 싶은 것이어서 비교적 긴 시간을 성당에서 보내야 했다.
대한민국 안동교구 정희욱 ‘원로사제’ 신부님이 주도한 피정 자체는 첫날밤의 slow start로 조금 실망감을 떨칠 수가 없었지만, 끝 마무리가 활기에 찬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grade B+ 정도는 될 것이다. 내가 본 이번 피정 강론의 문제는 이것이다. 성모신심을 ‘체험’으로 강조한 것은 만족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너무나 일반적이고 깊이가 결여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성모신심이 생소하거나 거부감이 있는 일반 가톨릭 신자나 개신교인들에게는 잘 맞는 정도의 message였다. 하지만, 우리 같은 레지오 단원들은 이미 이런 정도의 신심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다.
피곤한 긴 하루를 마감했던 ‘성모의 밤’.. 이것 때문에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올해 아틀란타 순교자 성당 성모의 밤.. 작년 같이 성모동산 앞 주차장에서 ‘어두운 밤을 밝히는’ 멋진 모습을 상상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실내인 대 성당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다행이었다. 그렇게 화창하던 날씨가 일기예보가 정확히 예고한 대로 부슬비가 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랜 만에 들어보는 ‘생음악’, Gounod 의 Ave Maria, violin 연주(piano와 duet) 는 성모님의 청순함을 아낌없이 느끼게 하는 그런 연주였는데 그 violin 자매님, violin연주의 ‘백미 白眉’를 들려준 것 같아서 고맙기까지 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이재욱 요한 본당신부님의 모습도 좋았고, 성모님께 바치는 ‘시적인 글’도 너무나 좋았다. 남녀노소가 골고루 참여하여 우렁차게 바친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는 평소에 하던 때의 느낌을 훨씬 넘는 그런 장엄했던 것. 레지오 연피정 주제인 ‘성모신심’의 절정을 보여주는 듯한 성모의 밤,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피조물, 성모 마리아’는 과연 지난 7년 동안 어떤 의미였을까.. 죽을 때까지 음미하여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