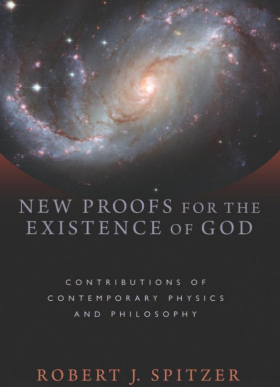1960년 대 Hermes typewriter
Georgia 10, 굴림 10: 얼마나 멋진 type shape인가? 하지만 그것보다 더 멋진 것은.. 아~~ 그립다, 태곳적 太古的 둔탁하지만 경쾌한 typewriter의 잔잔한 소음들.. 지금은 원시적인 얼굴의 mono type Pica, 그들은 이제 모두 어디로 갔는가? 아~~ 그 예전에 ‘학문적, 지적 정보’의 총아 寵兒 였던 mechanical typewriter 의 멋진 추억들이여!
나와 typewriter의 첫 만남은 1960년대 초쯤이었다. 서울 중앙중학교 1, 2학년 쯤이었나.. 나의 경기고교생 가정교사였던 김용기 형, 나이에 비해서 조숙했던 그 형이 나의 typewriter에 대한 꿈을 며칠 동안 이루어 주었다. 나의 꿈은 그 것을 직접 만져보고 쳐보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괴물처럼 무겁게 보였던 Underwood typewriter를 들고 나타난 것이다. 내가 하도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기에 그 형이 어디선가 며칠간 ‘빌려온’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것, Underwood typewriter는 ‘고철’이었다. 크고, 무거운 쇠 덩어리로 보였던 것이다. 어린 애는 들기도 힘들 정도였다. 당시 중학교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였고 학생전용 영어 신문도 학교에서 가끔 볼 수도 있었는데 typewriter는 집에서 활자체로 인쇄물을 찍어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완전히 그것의 위력에 매료되기도 했다. 영자신문 비슷한 것을 찍어보기도 하며 즐거워한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의 typewriter는 물론 거의 모두 ‘중고’, 아마도 미8군 부대를 통해서 흘러나왔을 것이고 그 값은 만만치 않은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그것은 가질 수 없는 물건이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며 그것을 집에 가진 사람은 거의 못 보았다. 당시에 이미 한글타자기(공병우 3벌식)도 나와 있었지만 아마도 대부분 기업체에서나 쓸 정도고 학생들은 그것을 쓸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언제 그랬나 할 정도로 당시는 거의 모든 학교 공부, 강의 시간에 손으로 받아 쓰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Typewriter가 나에게 가까이 온 것은 대학교 4학년 당시의 겨울방학 때였다. ‘무위도식의 극치’를 실행하던 당시 나는 한강 남쪽 ‘변두리’에 속했던 숭실대학이 있었던 상도동 종점 부근에 살았는데 무슨 구실로든가 시내 그러니까 종로, 명동 등지로 나와야 했다. 그래서 찾은 것이 타자학원이었다. 왜 타자학원을 골랐는지 지금은 기억이 희미하다. 좌우지간,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하거나 유학 같은 것을 가려면 타자기를 칠 수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단순한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루에 한번 씩 종로거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주목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배우려고 한 것이라 열심히 배우긴 했다.
타자학원에 가서 놀란 것은 이것이다. 학생들이 ‘모조리’ 여자, 그것도 아주 젊은 여자들이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은 그 ‘기술’로 취직을 하려 했기에 나와는 목적이 전혀 달랐다. 그들은 심각한 자세였고 청일점인 나에게는 관심조차 없었다. 학원 강사는 남자였는데, 나의 출현에 꽤 놀란 눈치였고 아주 반가운 모습이었다. 강의가 끝나면 그는 나와 사무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우리들이 그곳에서 유일한 남자들이었다.
집에 타자기가 없었던 관계로 학원에서 배우는 것은 비교적 값싼 방법이었고, 종로2가에 학원이 있어서 나는 매일 종로거리로 나올 수 있었기에 그것은 지루한 겨울방학을 보내는데 안성맞춤이었다. 나의 타자 실력이 얼마였는지 생각이 안 나지만 그것은 나에게 큰 관심사는 아니었다. 최소한 touch typing만 알면 나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니까..
그 이후 미국유학을 준비할 때 나는 ‘중고’ 아주 portable 한 typewriter, swiss 제 Hermes란 것을 살 수 있었다. 싼 것은 아니었어도 미국에 가면 필요할 것 같아 미리 투자를 한 것이다. 유학을 떠날 때까지 나는 이것으로 심심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왜 그렇게 그 타자 소리가 나에게는 멋지게 들렸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른다. 당시 그것을 치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들, 그것도 회사의 비서급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간혹 남편이 논문 같은 것을 쓰게 되면 그의 아내들이 그것을 돕느라 타자를 치곤 했다. 남자가 손수 타자를 치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결국 남자들은 나중에 쓰지 못할지도 모를 기술 touch typing을 미리 배운 셈이 된 것이다.
미국에 와서 사실 내가 직접 typewriter를 쳐야 할 기회는 별로 찾아오지 않았는데, 당시만 해도 학교에서 꼭 typewriter로 쳐서 내는 숙제는 별로 없었다. 쓰려면 도서관에 가면 되기에 꼭 나의 것을 사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나의 눈을 끈 것이 있었다. 바로 electric typewriter, 바로 그것이었다. electric! 보통 typewriter는 완전히 수동, manual, 온 손끝의 힘으로 치는 것이지만 electric은 조금만 touch를 하면 electric striker가 이어받은 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는 그것을 사고 말았다. 비록 큰 돈이었어도 당시만 해도 100% 자유스러운 ‘총각’시절.. 마음만 먹으면 아무 것이나 가능하던 그 자유스러운 시절..
비록 멋으로 샀지만 실제로는 방 구석에서 놀고 있었는데, 결국은 시간은 찾아왔다. 70년대 중반 쯤 나는 West Virginia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course들 중에 typewriter를 써야 하는 것들이 꽤 있었다.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나는 이제 그 옛날 ‘타자학원’에서 배웠던 기술, 철저히 쓸 기회가 온 것이다. 그 때 보니까 나의 typing 속도는 꽤 빨랐고 제출해야 할 것들은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 나중에는 그 소문을 듣고 나에게 typing을 부탁하는 classmate들도 등장했다. 여자들 같으면 돈을 받고 쳐 주곤 했지만 나는 ‘취미’로 생각했기에 모두 무료로 service해 주곤 했다.
Electric typewriter의 위력은 나중에 Ohio State University에서 논문을 쓸 때 절정을 이루었다. 남들은 모두 professional typist를 찾는 고역을 치렀지만 나는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내가 모두 치곤 했다. 그 때 나는 상당한 분량의 논문을 typing했는데, 나중에 ‘책’으로 나온 그 논문집을 도서관에서 찾아보니.. 역시.. professional이 typing한 것과 비교하니.. 완전히 아마츄어 냄새가 났다.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손수 만든 것이라고 나를 위로하기도 했다.
그 이후 typing의 필요는 사라지는 듯 했다. 가끔 영어로 쓰는 서류, 편지들 이외에는 그것이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누가 예상을 했으랴.. digital computer의 출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처음에는 ‘집채만한’ mainframe ‘monster’ (e.g., IBM S/360), 다음에는 minicomputer (e.g., PDP11) 이것들은 거의 모두 keypunch input으로 결국은 typing기술이 필요한 것, 나중에 나온 personal (micro)computer들 (e.g., Apple II, IBM PC) 모조리 앞 모양은 거의 typewriter의 모습을 갖춘 것이었다. 본격적으로 touch typing 의 위력이 돋보이는 세월이 도래한 것이다. Touch typing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나는 그때 비로소 느꼈다.. 무언가 배워서 절대로 손해를 볼 수가 없다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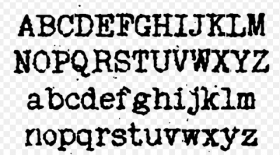 Engineer들의 필수 portable ‘analog calculator’ 였던 slide rule (계산척)은 1970년대 초에 ‘갑자기’ 등장한 ‘digital’ calculator로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향수에 젖은 ‘mechanical’ typewriter는 personal computer/printer의 등장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리운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것들, 가끔 그리울 때가 있다. 갑자기 무언가 쓰고 간단히 ‘하~얀’ 종이 한 장에 까~만 typeset의 짧은 문장을 쓰고 싶을 때… 그것이 그립다. computer로 쓰면 고치는 것 떡 먹기지만 한 장 정도 print 할 때 얼마나 overhead가 많은가.. 귀찮고.. 그립다.. 그립다.
Engineer들의 필수 portable ‘analog calculator’ 였던 slide rule (계산척)은 1970년대 초에 ‘갑자기’ 등장한 ‘digital’ calculator로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향수에 젖은 ‘mechanical’ typewriter는 personal computer/printer의 등장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리운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것들, 가끔 그리울 때가 있다. 갑자기 무언가 쓰고 간단히 ‘하~얀’ 종이 한 장에 까~만 typeset의 짧은 문장을 쓰고 싶을 때… 그것이 그립다. computer로 쓰면 고치는 것 떡 먹기지만 한 장 정도 print 할 때 얼마나 overhead가 많은가.. 귀찮고.. 그립다.. 그립다.
그 지겹게 공해로 찌들었던 서울의 겨울 하늘아래서 꽤죄죄한 타자학원을 다녔던, 비록 동기는 뚜렷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꽤 쓸만한 겨울방학을 보냈던 것이다. 그 touch typing 기술은 현재까지도 두고 두고 나를 도왔다. 특히 빠른 typing이 필요했던 때, 나는 1960년대 말 서울 종로에 있었던 ‘xx 타자학원’을 떠올리곤 하며 빙그레 웃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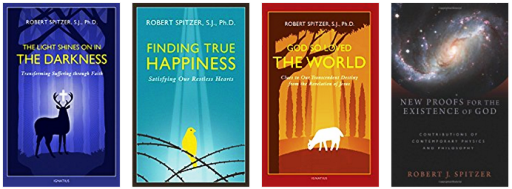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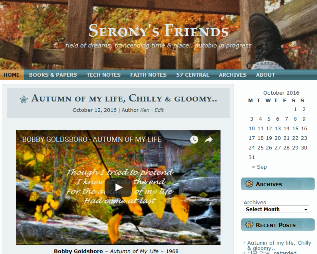 오늘 blog site의 front page의 그림이 가을 것으로 바뀌었다. Tobey와 깊은 가을 산책길에 떨어지는 낙엽을 올려다 보면 찍은 사진.. 오래 전 Ohio와 Wisconsin의 기나긴 겨울과 아주 짧은 봄, 가을의 날씨들에 비해서 이곳은 4계절이 너무나 뚜렷하다. 특히 봄과 가을이 북쪽에 비해서 긴 편이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올해의 가을은 어떻게 보면 ‘가을의 진수’를 한껏 맛볼 것 같은 희망도 든다. 파랗다 못해 검푸른 깊고 높은 하늘, 주변이 하늘처럼 높은 고목들에 둘러 쌓인 그 멋진 모습이 사진에도 많이 담겼다. 비록 ‘가을비 우산 속‘ 의 낭만은 없지만 이것은 다른 맛의 낭만이 아닐까? 언제까지 이 모습을 유지할 것인가?
오늘 blog site의 front page의 그림이 가을 것으로 바뀌었다. Tobey와 깊은 가을 산책길에 떨어지는 낙엽을 올려다 보면 찍은 사진.. 오래 전 Ohio와 Wisconsin의 기나긴 겨울과 아주 짧은 봄, 가을의 날씨들에 비해서 이곳은 4계절이 너무나 뚜렷하다. 특히 봄과 가을이 북쪽에 비해서 긴 편이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올해의 가을은 어떻게 보면 ‘가을의 진수’를 한껏 맛볼 것 같은 희망도 든다. 파랗다 못해 검푸른 깊고 높은 하늘, 주변이 하늘처럼 높은 고목들에 둘러 쌓인 그 멋진 모습이 사진에도 많이 담겼다. 비록 ‘가을비 우산 속‘ 의 낭만은 없지만 이것은 다른 맛의 낭만이 아닐까? 언제까지 이 모습을 유지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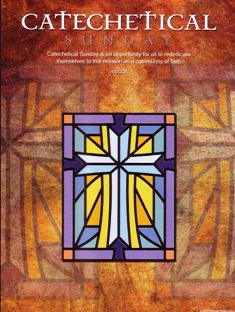

 ¶ Nine Eleven 2016, 9/11/2016…
¶ Nine Eleven 2016, 9/11/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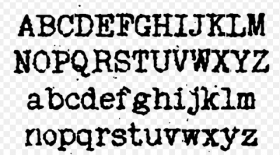 Engineer들의 필수 portable ‘analog calculator’ 였던 slide rule (계산척)은 1970년대 초에 ‘갑자기’ 등장한 ‘digital’ calculator로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향수에 젖은 ‘mechanical’ typewriter는 personal computer/printer의 등장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리운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것들, 가끔 그리울 때가 있다. 갑자기 무언가 쓰고 간단히 ‘하~얀’ 종이 한 장에 까~만 typeset의 짧은 문장을 쓰고 싶을 때… 그것이 그립다. computer로 쓰면 고치는 것 떡 먹기지만 한 장 정도 print 할 때 얼마나 overhead가 많은가.. 귀찮고.. 그립다.. 그립다.
Engineer들의 필수 portable ‘analog calculator’ 였던 slide rule (계산척)은 1970년대 초에 ‘갑자기’ 등장한 ‘digital’ calculator로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향수에 젖은 ‘mechanical’ typewriter는 personal computer/printer의 등장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리운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것들, 가끔 그리울 때가 있다. 갑자기 무언가 쓰고 간단히 ‘하~얀’ 종이 한 장에 까~만 typeset의 짧은 문장을 쓰고 싶을 때… 그것이 그립다. computer로 쓰면 고치는 것 떡 먹기지만 한 장 정도 print 할 때 얼마나 overhead가 많은가.. 귀찮고.. 그립다..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