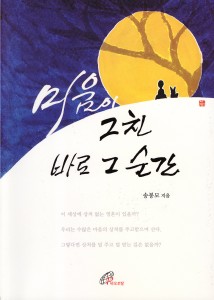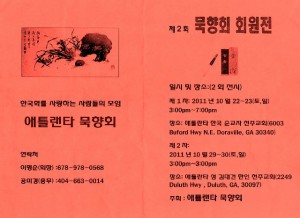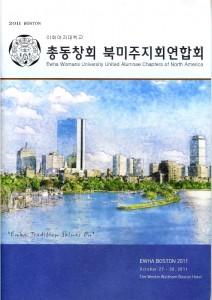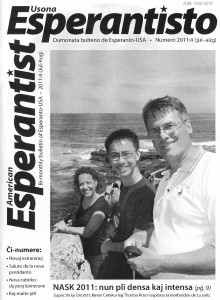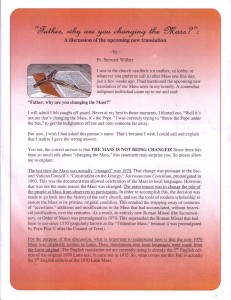나는 白手란 말을 참으로 싫어했다. 누가 좋아하겠는가? 놀고 먹는다는 뜻일 것이고, 대부분 이런 부류 중에는 ‘여자에게 빌붙어 사는’ 남자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는 白手란 말 조차 해당되지 않는다. 놀고 먹는 여자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그런 것은 듣지 못했다. 전통적인 의미의 白手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자의건 타의건 간에 조직적인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경제활동 하는 것을 떠난 남자들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밖에서 일을 했던 것이 남자들이고, 그들이 그런 일을 안 하고 산다면 그날로 白手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언젠가부터 白手가 된 것이다. 그런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이 나는 역시 白手인 것이다. 아마도 집에서 ‘작은’ 경제적인 활동을 계속해 왔다고 해도 역시 그는 白手라고 불릴 것이다. 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은 크게 상관이 없다. 간단히 말해서 남자가 ‘낮에 집에 있을 수 있으면’ 우선 그는 白手인 것이다.
과연 요새 白手들은 무엇을 하며 하루를 소일할까? 이것 또한 사람들의 성격만큼 다양할 것 같다. 서울에 계신 처남을 보면, 직장에서 일할 때보다 더 바쁘다고 한다. 거의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산엘 가고, 집에 돌아올 때 술을 마신다. 직장 다닐 때도 술을 마시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일이 끝나고 올 때가 아니고 ‘놀다가’ 올 때 마시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고, 각종 ‘회포를 푸는’ 모임에는 다 나간다. 어떻게 보면 부럽게 들리기도 한다. 하기야 이런 것들은 직장시절 그렇게도 기대하고 기다리던 이상적, 환상적인 생활 들이 아니었을까? 문제는, 이것이 거의 변함없이 매일 계속될 때도 그렇게 즐거울까? 아마도, 아닐 것 같다.
내가 사는 이곳 아틀란타 지역의,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중에는 白手가 의외로 드물다. 가깝게 지내는 친지 중에는 현재 한 사람 정도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업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그것은 정말 체력과 의지만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그들이 참 부럽다.
비록 그들은 육체적으로 고달플 때도 많고,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지만, 우선 돈, 그러니까 현금의 자유가 내가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많고, 이렇게 ‘정년퇴직’ 이나, ‘명퇴’같은 음산한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리고 하루아침에 직장이 없어지거나 하는 traumatic한 것도 없고.. 그저 단점은 사업에는 항상 기복이 있으니까, 그것이 조금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그렇게 여유 있게 돈을 번 후에 白手가 된 사람들은 위에 말한 것처럼 정말 바쁘게 산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그곳의 사람들과 어울린다. 선교여행(성지순례), cruise여행, 골프, 각종 악기 배우기 요리 배우기, .. 열거하려면 한도 없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간과 건강, 돈이 없으면 곤란한 것들이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들인가? 이것에 정답이 있을 수 없다. 개개인마다 여건들이 조금씩 다를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나에게 매력적인 일거리를 고르라면 글쎄, 신앙적인 것과 지적인 것들이 balance를 이루는 그런 것들이다. 예를 들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 컴퓨터를 위시한 매초 변하는 digital technology 그리고 자기를 포함한 ‘개개인들의 역사’ 탐구 등등이 있다. 하지만 白手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시대에 따라서 무슨 흐름과 변천이 있었을까?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세대마다 겪었던 시대적 문화가 있고, 경제적인 제약, 여유 같은 것들이 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전쟁을 몸으로 겪었고, 비록 민주적이지만, 보수적이고, 경제적으로는 항상 모자란, 그런 시대에서 사셨다. 그들에게는 白手가 될 여유조차 없었다. 그러니 대부분 혼신의 힘으로 키웠던 자식세대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자존심을 접는’ 조용한 여생을 보낸다.
손주로부터 위안을 얻고, 경로당에서 친지들과 어울릴 수 밖에 없는 것이 거의 남은 삶을 사는 방식이었다. 지금에 비해서 평균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시절이고 보니, 白手로 산 기간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계속 길어지는 평균수명이다. 白手가 되는 절정기인 60대가 이제는 길어진 평균 수명에 덕분에 비교적 ‘젊어’ 진 것이다. 번듯하고 의미 있는 ‘경제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면 제일 바람 직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악의 세계적 불경기가 기약도 없이 계속된다. 지금 나의 세대, 60대가 그런 변화의 최전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바람 직할까?
이때 나는 고국의 친지들을 부러워 하게 된다. 비록 세대는 많이 흘렀어도 이곳 미국에 비해서 그곳은 아직도 끈끈한 정으로 모두들 얽히어 산다. 학연, 혈연, 지연..등등 오래 동안 형성되어온 ‘인연’이 이 나이에는 완숙이 되어서 사는데 큰 활력소가 될 듯하다. ‘철저한 개인’의 나라 미국에 사는 한 그런 것은 완전한 희망적인 것일 뿐이다. 비교적 교민들끼리 모여 산다는 이곳에서도 큰 차이는 없다. 완전히 ‘99.9% 한국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살려면, 아예 고국에 가서 사람들에 둘러싸여 사는 것이 나을 테니까.
이런 때에, 최근 20년간 급성장한 인터넷의 보급은 이렇게 ‘고립되어’ 사는 우리들에게 조금 희망적인 발전일 수 있다. 지독히도 개인적 자유와 간섭 받기 싫어하는 미국인들이 Facebook, Twitter같은 social networking에 열광하는 것도 인간의 사회적 본성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적 공간, virtual space‘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face-to-face: 얼굴을 마주보며 만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인터넷에 의한 매체의 역할은 독특한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시간, 공간을 손쉽게 뛰어넘어,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가 하는 ‘기술의 정도’는 우리세대를 무참히 도 차별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현재 인터넷의 발전 정도로는 아직까지도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제일 큰 장애물이다. 그래도 지금은 10년 전이나 그 이전보다 훨씬 쓰기가 수월해졌다. 컴퓨터처럼 보이지 않는 기기들 (embedded devices)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mobile devices, GPS, smart phone, HD-TV, car, audio system 등등인데, 이런 추세는 가속되고 있다. 본인도 모르게 인터넷을 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기들은 특별한 목적에 맞춘 것이고, desktop pc의 ‘널찍하고, 화려한 화면’ 에 나타나는 ‘화려한’ 인터넷의 효과에는 아직도 미칠 수가 없다.
인터넷 이전에는 컴퓨터 없이 살아도 조금 자존심은 상해도 그런대로 살 수 있었다. 멋지게 프린트 해낸 편지 같은 문서들, 재미있게 ‘조작’한 사진 만들기, cd-rom등으로 백과사전 보기.. 계산을 다 해주는 가계부, 이런 것들은 생활하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컴퓨터를 살 필요까지는 없었다. 하지만 인터넷은 다르다. 인터넷을 못쓰거나 안 쓰면 이제는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이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사서 써야 하는 실정이 된 것이다.
주변의 아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추세를 실감한다. 그들도 ‘싫지만’ 이것을 써야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는 편리할 정도로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되었다. 값싼 물건을 찾아내고, 이메일을 쓰고, 옛날에 헤어진 사람들을 찾아내고, 집에 앉아서 고국에 있는 ‘고수’들과 바둑을 두게 되고, ‘공짜’로 영화, 드라마 같은 것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런대로 인터넷을 쓰는 우리 동료세대들의 특징은, 이들 대부분은 인터넷의 ‘소비자’ (net consumers) 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보거나, 받거나’ 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에서 ‘생산자‘ 적인 (net producer) 입장으로 능동적으로 쓰는 사람은 아직도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예는 이메일을 보면 알 수 있다. 의외로 직접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영어로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세대에선 말도 안 되고, 어차피 감정이 통하는 한글로 써야 하는데, 오랜만에 ‘한글문장’을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우선 키보드에 글자를 넣는 데서 부터 고전을 면치 못한다. 이것이 현재 ‘능동적’으로 인터넷을 쓰는데 최대의 장애물인 것이다. 물론 ‘말하는 것’ 보다 ‘글을 쓰는 것’이 훨씬 힘 들기도 하다.
내가 아는 우리 또래들도 ‘대부분’이 인터넷 소비자에 속하는, Internet radar 아래에 ‘숨어있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진정한 인터넷 세대는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맞는 그런 부류들일 것이다. 이곳에서 오랜 동안 살며 보아왔지만, 우리 세대(boomer)의 미국인들은 느릿느릿하지만 꾸준히 인터넷 문화에 동화하는 노력으로 이제는 ‘대부분’이 큰 문제없이 인터넷을 ‘능동적’으로 쓰게 되었다.
이메일은 그들에게도 거의 ‘필수’가 되었고, social networking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인터넷 shopping도 다른 세대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그에 대응한 한인들은 비록 느낌이지만, 훨씬 뒤 떨어진다. ‘쓰면서’ 경험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선 pc조차도 쓰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인 것이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너무나 바쁘게 사는 현실을 감안하면 아마도 하루 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듯 싶다. 조금 더 빠른, 그러니까 현재의 3G, 4G정도보다 훨씬 빠른 mobile-based Internet으로 발전을 하면 아마도 mobile device들이 desktop PC보다 더 쉽게 쓸 수 있게 (예를 들면, keyboarding대신 voice recording, recognition, dictation같은) 될 것이다.
하지만 단점은 역시 우리 세대의 특징인 ‘떨어지는 시력‘ 이다. Mobile device들은 글자 그대로 ‘가볍고, 작은’ 것이라서 젊을 때보다 훨씬 ‘조작’하기도 불편하고, ‘보기도’ 불편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희망은 ‘보는 것’ 대신에 말하고, 듣게 하면 될 것인데 그쪽의 발전 속도는 생각보다 느려서, 과연 우리 세대들이 그것의 혜택을 본격적으로 받게 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 우리세대는 과장된 표현으로 ‘문화적 격변기’를 때 늦게 맞고 있다. 역사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기술에 의해 사회, 문화적 기반이 영향을 받은 적은 18세기 이후의 산업혁명 이후 처음일 것이고 질적, 양적으로 그때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모든 것들이 어중간한 우리 boomer세대들, 특히 白手들, 과연 어떻게 이 격변기를 ‘안전하게’ 보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