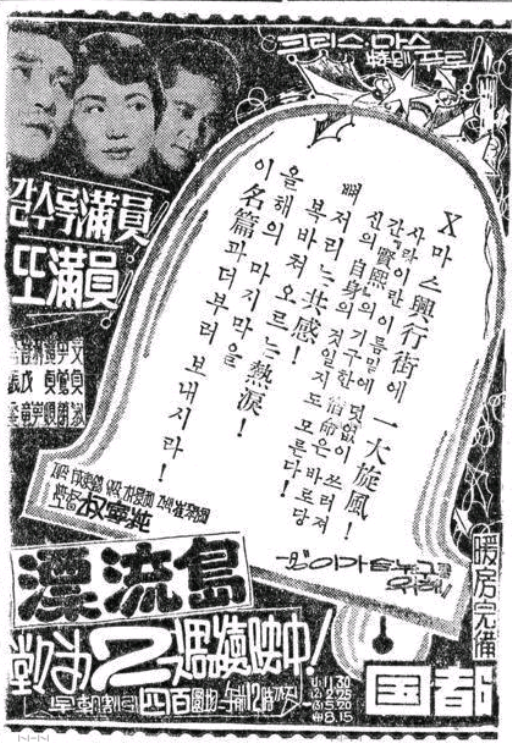영화 동심초 신문광고, 1959년 7월 22일자 동아일보
며칠 전 오랜만에 열어본 KoreanFilm@youtube 에서 머리를 띵~ 하게 만든 영화 제목을 보게 되었다. 다름이 아닌 1959년 멜로드라마 최은희, 김진규 주연 신상옥 감독 영화 ‘동심초 同心草’ 였다. 이 동심초 영화는 당시 대한민국의 유일한 ‘라디오’ 방송 KBS의 ‘초 인기’ 일요 드라마 (당시에는 ‘방송극’이라고 했던) 를 영화화한 것이고, 당시에 어린 나도 ‘누나, 아줌마들’ 옆에 끼어서 같이 들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 방송으로 기억을 한다.
그 당시 국민학교(서울 재동 齋洞) 6학년이었던 내가 그런 ‘어른들’ 순정드라마를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 당시 자세한 내용은 잘 몰랐지만 항상 흘러나오던 주제곡만은 녹음기처럼 기억을 한다. 당시 최고 인기가수 권혜경씨가 불렀던 그 주제곡이 나는 원로 김성태씨의 가곡인 것을 잘 몰랐다. 아니.. 지금까지도 그 곡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가곡인 것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니까.. 가곡이 먼저인가, 주제곡이 먼저인가.. 나의 무식의 소치였던 것이다.
이 영화를 거의 surreal한 기분으로 보는 느낌은.. 1959년 당시의 대한민국, 특히 서울을 감싸고 있던 ‘공기, 분위기’ 같은 것이 ‘어른들의 사랑’보다 더 관심이 갔다. 그 당시의 분위기, 공기는.. 어떤 것들일까?
당시에 TV가 없었던 때, 유일한 것이 그저 ‘듣기만 하는 라디오’.. 가 전부였다. ‘책보다 읽기 쉬운’ 라디오는 서울에서는 거의 모든 가정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듣게 되는 ‘드라마’는 참 매력적인 연예 프로그램이었기에 어린 우리들까지 ‘꼽사리’를 끼어서 듣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대부분 여자들 (누나들, 식모 누나들, 아줌마들이 거의 전부) 틈에 끼어서 들었던 기억이 너무나 즐겁기만 했다. 기억나는 것들.. ‘산 너머 바다 건너’, ‘청실 홍실’, ‘동심초’, ‘현해탄은 알고 있다’, 기독교 방송국의 ‘수정탑’, 그 후에 ‘현해탄은 알고 있다’, ‘장희빈’ 등등.. 이 당시의 성우들은 당시 영화배우에 버금가는 최고의 연예인, idol, celebrity에 속했다.
나의 1950년대 향수 nostalgia를 너무나도 자극하는 이런 오래 된 영화들을 다시 보게 된다는 사실 자체에 나는 전율을 할 정도다. 비록 동심초 영화는 처음 보는 것이고, 그 내용의 ‘순진함, 단순함’에 코웃음이 나오지만.. 그것은 내가 인생을 그만큼 오래 살아서 그럴 것이다. 1959년, 내가 재동국민학교 6학년 시절.. 박양신 담임선생의 ‘입시지옥’ 열차를 한창 타며 고생하던 시절이다. 4.19혁명을 향한 이승만 대통령의 최후의 정권유지 안간 힘을 쓰던 시절이었다.
이 영화와 비슷한 시대적 배경을 가진 다른 영화 ‘표류도’, 이 영화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근래에 인터넷으로 여러 번 본 기억으로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진다. 당시의 신문을 보면 역시 1960년 12월 25일 성탄절 때 을지로 국도극장에서 개봉된 영화광고를 볼 수 있었다. 시대적으로 ‘표류도’는 4.19학생 혁명 후, 5.16 군사혁명 전 장면 내각시절인 1960년 말에 나온 것으로 동심초와 거의 비슷한 때에 나온 것이지만 동심초 처럼 라디오 방송 드라마에 근거한 것이 아닌 ‘박경리’ 여사의 소설을 영화화 한 것이 다르다고 할까.. 아니면 이것도 방송극으로 먼저 소개가 된 것이었을까.. 확실할 것은 나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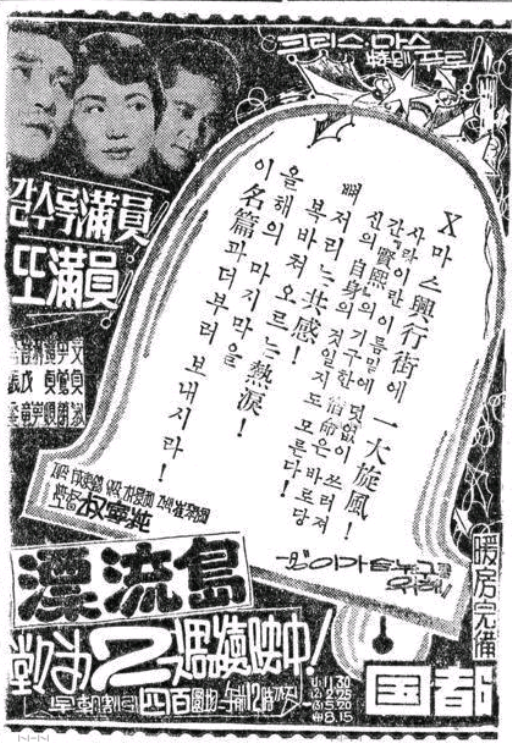
영화 표류도 신문광고, 1960년 12월 25일자 동아일보
나에게 이 두 영화가 일깨워 준 사실은, 그 동안 잊고 살아온 자질구레한 시대적 역사보다 더 의미가 있었던 것도 있었다. 당시, 육이오 전쟁이 휴전으로 끝났던 사회적인 배경으로 이 두 영화의 ‘주인공’들, 특히 여성 protagonist들의 모습들이다. 동심초의 최은희, 표류도의 문정숙 씨들이 연기한 그 주인공들의 처지나 배경들은 모두 대학출신의 고등교육을 받은 인텔리 여성들로서, 거의 완전히 나의 어머니의 것,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이 두 영화를 나는 더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전쟁 미망인.. 당시 전쟁으로 남편을 잃었던 여인들이 불리던 이름이었다. 대부분 군인으로 전사를 했던 case였지만 그 이외의 case도 부지기수.. 우리 어머님의 case는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그러니까 납북(당시에는 납치라고 했다) 된 어처구니 없는 시대였다.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있었던 그 여인들.. 전쟁으로 황폐된 땅에서 어떤 도움을 정부로부터 기대를 하겠는가? 친척들의 도움이 아니면 길거리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을 것이다. 영화 동심초에서 최은희, 표류도의 문정숙 모두 그래도 버젓이 자기집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을 떠나 살벌한 사회에 뛰어들었던 것인데.. 우리 집의 경우, 그것은 사치였다고 할까.. 자기 집이 없었기에 어린 남매를 데리고 셋집을 전전해야 했던 어머니..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을까?
거의 모든 것을 가장, 남편에게 의지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다 전쟁 후의 파탄 직전의 경제 상황.. 그런 것들을 느끼기에 너무나 어렸던 나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피부로 조금 실감하게 되었다. 지금은 ‘상상’으로나마 나의 것으로 실감할 수 있다. 동심초의 주인공 최은희는 경제적 해결을 위하여 양장점을 경영하다가 실패로 빚을 지고 결국은 집까지 팔고 시골의 집으로 내려간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김진규와 사랑을 하는 사이가 되지만 그것조차 미망인과 총각 사이가 주는 사회적인 파장 때문에 실패를 한다. 영화 표류도에서는, 법적인 결혼 전에 아기를 낳고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후, ‘용감하게’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어 다방을 경영하는 고급 인텔리 여성 문정숙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사생아라는 낙인이 찍힌 딸 전영선을 데리고 ‘철 없는’ 어머니를 모신 ‘가장’이 된 문정숙, 물장수를 한다고 멸시를 주는 대학동창생들.. 그녀를 동정하다가 사랑하게 되는 동창생 남편 김진규, 당시의 사회적 윤리 도덕을 느끼며 망설이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해서 감옥엘 가고, 병보석으로 출감 후에 기적적으로 김진규와 결혼, 낙도에서 일생처음으로 행복을 맛 보지만.. 병의 악화로 세상을 떠난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이야기.. 나에게는 하나도 낯 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이다.
이 두 영화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식이 있는 여자가 혼자 살기가 쉽지 않고, 가장 家長 그러니까 남자주인인 남편이 가정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지만 그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회적인 여건도 남자 주인이 필요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혼자 된 여자가 다시 남편을 만다 산다는 것은 힘들고 모험이기도 했다. 우리 집의 경우,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셔서 우리 가정을 지켰지만 그 30대 초의 꽃다운 나이에 ‘청혼’이 없었을까? 우리들이 너무 어려서 실감은 못했지만, 재혼의 유혹은 항상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한 가지의 ‘일’은 내가 어른이 된 나중에야 다시 깨달은 것도 있었다. 영달이 아저씨.. 경주출신으로 학교 선생님이었던, 잘 생겼던 아저씨였는데, 몇 번인가 우리 집에 그 아저씨의 친구와 같이 ‘초대’된 것을 기억한다. 어떻게 알게 된 아저씨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아마도 재혼까지 생각이 된 관계는 아니었을까.. 훗날 어머니는 ‘우리남매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하신 말씀을 남기셨다. 당시의 사회적, 윤리적인 상황이 그랬다. 아마도 그때 다른 쪽으로 ‘재가’를 하셨다면 나와 우리 누나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곡선을 탔을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 이후 반세기가 훨씬 넘어가는 지금은 어떤가? 가련한 남편들이 늘어가는 요즈음, 가련한 여인들이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고전 중의 고전’으로 그야말로 ‘옛 이야기’일 것이고 나 자신도 그 중에 하나..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어데 까지 변할 것인가?
영화 동심초, 1959년
6ㆍ25때 남편을 여읜지 8년. 이숙희(최은희)는 양장점을 하다가 빚을 지고, 출판사 전무 김상규(김진규)가 빚 청산을 도와주면서 둘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상규는 사장 딸 옥주(도금봉)과 약혼한 사이고 누이(주증녀)는 그의 출세를 위해 이 결혼을 서두른다. 숙희의 장성한 딸 경희(엄앵란)는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상규와의 재가를 권유하지만, 숙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관습과 윤리적 도덕관 때문에 갈등한다. 숙희와 상규는 진실로 사랑하지만, 숙희는 헤어지는 길을 택하고 서울 집을 팔아 고향으로 떠난다. 몸 져 누워있던 상규는 이 소식을 듣고 서울역으로 나가 이 여사가 탄 기차를 바라보며 괴로워한다.
영화 표류도 1960년
사생아인 딸(전영선)과 어머니(황정순)를 부양하며 살고 있는 여인 강현희(문정숙)는 `마돈나’라는 다방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한다. 현희는 생활고에 시달리지만 자존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그녀가 사생아를 낳고 다방을 경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하려 한다. 강현희는 손님 중의 한 명인 신문사 논설위원 이상현(김진규)과 사랑에 빠지지만 그는 그녀의 대학동창과 결혼한 몸이다. 한편 `마돈나’의 단골손님인 젊은 시인 민우(최무룡)는 현희를 좋아하지만 현희가 받아주지 않자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 민우를 좋아하는 다방종업원 광희(엄앵란)는 민우와 하룻밤을 지내고 민우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자 절망하여 현희의 도움도 거절하며 거리에서 몸을 팔다가 정신을 잃고 자살한다.
현희는 사랑과 윤리 사이에서 고민하면서도 상현과의 사랑을 키워나간다. 그러나 상현이 출장 차 미국으로 떠난 어느 날, 손님 중의 한 명인 통역자 최영철(허장강)이 외국인에게 자신을 팔아 넘기는 대화를 듣고 분노하여 우발적으로 화병을 던져 영철을 죽인다. 감옥에 수감되어 병을 앓던 현희는 병 보석으로 풀려나 상현과 함께 외딴 섬으로 내려가 살게 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병으로 죽음을 맞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