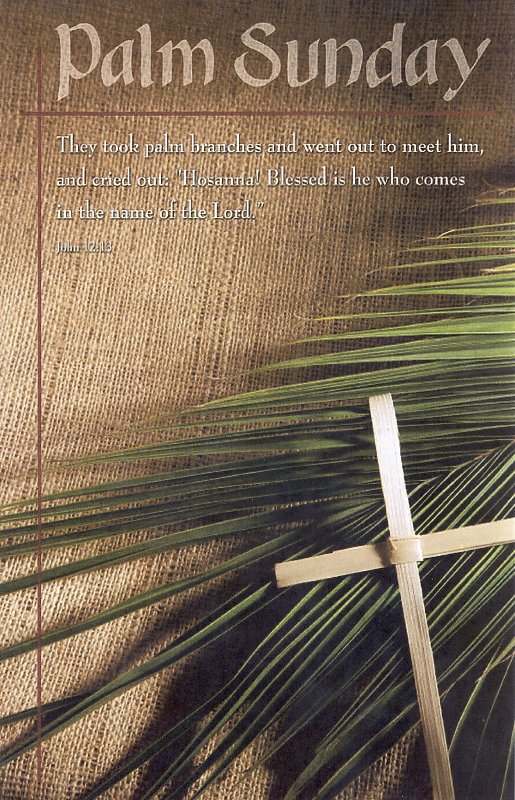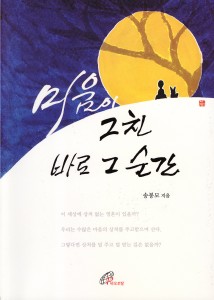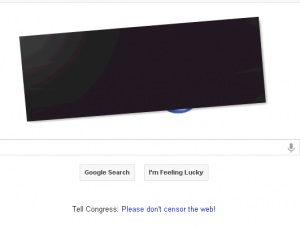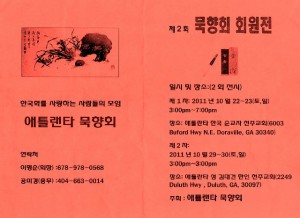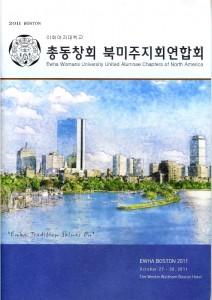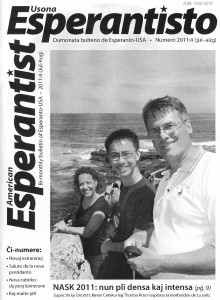4월 단상
¶ 4월은 미국태생 영국 거장 시인 T.S. Eliot 에 따르면 ‘잔인한 달, April is the cruelest month‘, 그리고 대한민국의 작곡가 박순애 교수의 가곡 classic ‘사월의 노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달이다. 사월의 노래를 생각하면 특별히 1963년 4월이 생각난다. 그때에 나는 서울 중앙고교 1년 재학 중이었고, 사월의 노래는 담임 선생님 김대붕 음악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노래였다. 작곡자가 이화여대 음대 김순애 교수라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 당시 그 이유는 몰랐지만, 혹시 김선생님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 후에 들곤 했다.
1963년이면 그 전 해에 일어난 5.16 군사혁명으로 모든 것들이 ‘재건’의 구호 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때였고, 사실 ‘느끼기에’ 비록 경제적으로 가난은 했어도 앞날이 희망적인 시절이어서 그 해 4월의 유난히 더 청명하던 계절과 함께 기억하고 싶은 때였다. 이곳 아틀란타 지역은 3월에 거의 ‘여름’같은 맛을 일주일 이상 보여 주더니 4월로 접어 들면서 완전히 2월 달 같이 거의 겨울 같은 날씨로 돌아섰다. 며칠 전에는 거의 섭씨 5도까지 떨어질 정도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new normal의 하나라고 푸념을 하던데.. 확실히 무언가 변한 것 같다.
4월의 노래
김소월 시, 김순애 곡
¶ 올해의 부활절에 이르는 기간은 정말 우리 부부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각가지 기록을 깨면서 보낸 정말 ‘은총’을 받은 듯한 기분으로 보냈다. 비록 나는 판공성사를 거르는 심각한 잘못을 하긴 했어도 다른 것들로 많이 보완을 했다고 믿는다. 그 중에서 지금은 거의 습관이 된, 매일미사 참례가 그 중에 가장 큰 보람이 되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매일 우리의 미국본당 Holy Family Catholic Church에서 아침 9시의 미사를 본 것이다.
이것은 사실 연숙이 이번에 시도한 ‘33일 봉헌‘이라는 사순절 행사에 ‘도전’을 하면서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33일 봉헌이라는 것에는 매일 미사 참례를 ‘적극적’으로 권하기 때문이었다. 연숙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이라서 나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도 같이 갔는데.. 이것도 Never say Never 의 한 예가 아닐까 할 정도로 내가 미리 생각했던 것과 결과적 느낌이 아주 달랐다. 하루를 이 미사로 시작한 것이 너무나 하루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듯 싶었다.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되었고, 하루 한번 꼭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나에게 보이지 않는 힘을 주었던 것이다.
나는 ‘절대로’ 며칠 못 견딜 것이라 ‘단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였다. 이래서 매일 미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구나 하는 생각 뿐이었다. 이것이 올해 사순절, 부활주일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었고, 성3일도 빠지지 않아서 판공성사만 빼고는 거의 완벽한 성주간을 보낸 셈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 부부나 가정에 어떠한 영향이나 도움을 줄지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신앙이란 것,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야말로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 아틀란타 혼또니 입빠이 제 2탄 믿을 수 없다. 정말 정말.. 혼또니 혼또니.. 이것이 바로 요새 유행어로 New Normal인가, New Frontier인가? 이곳 아틀란타의 ‘악명’을 하나 더 높일 사건에 우리들은 놀라기만 했다. 또 다른 한인 일가족 ‘총기 살인, 자살’ 사건이 터진 것이고,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아는 사람이 관련이 되어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못했다.
이 사건들의 공통분모는 역시 ‘총’이란 것에 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으면, 누가 알까.. 일본 같았으면 ‘칼’을 썼을 것이고, 오랜 전 같았으면 아마도 대판 주먹질을 하며 싸울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것도 New Normal 중의 하나로, 완전히 서부개척시대를 연상시킬 정도가 되었다. 불륜에서 비롯된 이런 사건은 사실 흔한 것이지만 이렇게 분에 못 이겨 그것도 여자가 총으로 분을 풀고 자살하는 case는 사실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닌데.. 그것도 한인들이었고, 불륜의 주인공이 한때 우리가 잠시 알았던 50대 초반의 ‘아줌마’였으니.. 놀라지 않겠는가?
일명 ‘나래 엄마’.. 그 나래라는 여자 아이는 1990년대 초에 연숙의 한국학교 유치반에 있었고, 그 ‘나래 엄마’는 나도 그 당시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어서 알고 있던 한 젊은 엄마였다. 그 엄마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기에 한 가정의 가장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을까? 역시, 올바른 인생은 못 살았을 것이다. 나래 엄마와 ‘공공연히 자기 앞에서’ 바람을 피운 남편이 얼마나 증오스러웠으면 그 가해자인 아내는 남편과 나래엄마를 총으로 쏘고 자기도 쏘았을까?
결과적으로 그 부부는 사망을 했지만, 나래 엄마라는 여자는 죽지는 않았다. 그 여자는 어떻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지.. 상상이 가지를 않는다. 참 무서운 세상이여..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쓰는 사람이 죽이는 것이라는 기가 막힌 궤변이 잘 통하는 이곳 .. 실증이 나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