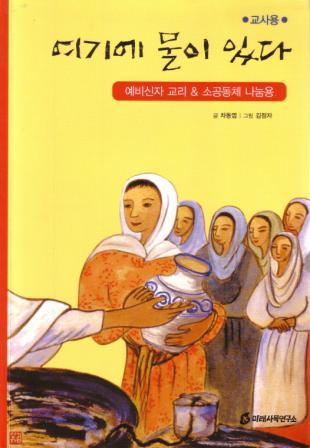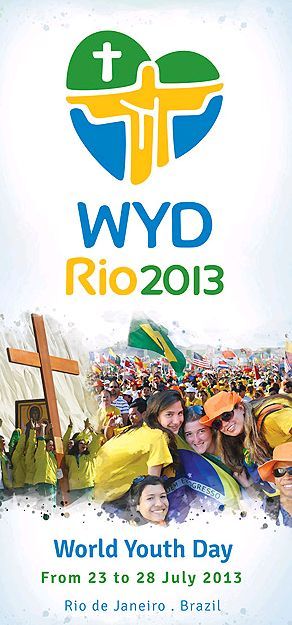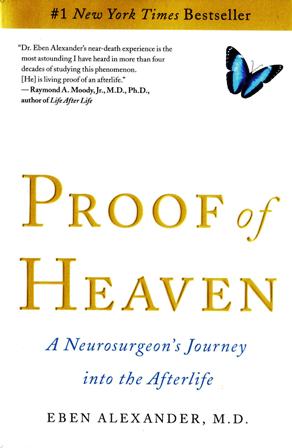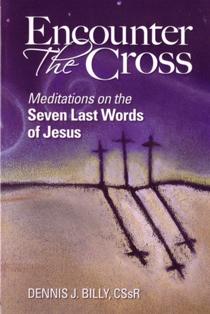돌아온 새로니.. 제목이 그럴 듯하다. 영화제목 ‘돌아온 장고‘ 처럼.. 우리 집의 큰딸, 새로니가 거의 6년 만에 ‘일단’ 정든 집으로 돌아와 우리와 같이 살게 되었다. 물론 그 전에 잠깐 머문 적은 많았지만 자기의 살림살이 짐을 ‘완전히’ 우리 집으로 옮기고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래 지독한 경제불황의 여파로 Y 세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비교적 젊은 축 X 세대들까지 자기가 자라던 집, 그러니까 부모의 집으로 ‘퇴각하는 것’이 요새 많이 보이는 현상중의 하나라는 보도도 심심치 않은 이때, 큰딸 새로니가 집으로 들어온 것은 그런 보도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듯 느껴진다.
젊은 ‘애’들이 ‘지독한 불경기’를 못 견디고 집으로 ‘퇴각’하는 것과 새로니는 조금 사정이 다르지만 ‘무섭게 예리한 경제감각을 가진 요새 애들, 특히 여자애들’ 중의 하나인 새로니에게도 경제적인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니에게는 그다지 신나는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새로 career의 방향이 바뀐 후 처음으로 맞는 불경기 하의 job market에 대한 불안 감도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일단 우리의 혈육이 자기가 자란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반가운 일이다. 조금은 경제적으로도 새로니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오랜만에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 압박감 없이 자유스럽게 ‘옛날 같은’ 기분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조금 비약적인 희망일 것이지만.
위의 메모는 작년, 그러니까 2012년 4월경에 남겨둔 것이고 ‘미완성’의 글로 남았었다. 그것을 오늘 다시 본다. 집을 떠난 지 6년 만에 같이 산 것이 이제 거의 1년이 되어간다. 6년 떨어져 산 돌아온 ‘아이’를 옆에서 보며 참 많은 것을 느꼈다. 우리가 난 ‘아이’가 돌아온 것은 물론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긴 하지만, 당혹한 순간들도 한 두 번이 아니었고, 괴로운 시간도 적지 않았다. 그와 더불어 과연 ‘혈육, 가족’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새삼스레, 아주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기도 했다. 가장 놀란 것이 있다면 그 동안 내가 심각하게 가족관계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 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행복어 사전>으로 번역이 된 일본에서 나온 수필집을 보면 역시 ‘머리가 큰’ 자식과 한 지붕 밑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가를 보여준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다른 지붕’ 아래서 사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을 읽을 당시에는 정말 실감을 못했지만 요새는 그 책 저자의 의도와 생각에 150% 동감을 하게 되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왜 그럴까? 지난 일년 새로니와 같이 살면서 나는 그런 질문만 계속하며 살았다. 왜 그렇게 어려울까? 왜 어렸을 때와 같이 살 수는 없는 것일까?
답은 간단할 지도 모른다. 어느 누구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모두 그 동안 ‘변한’ 것이다. 부모인 우리도 ‘나이에 따른’ 고집과 경륜이 쌓였고, 성장한 아이도 혼자 살아도 되는 독립된 어엿한 사회인으로 그 애 만의 독특한 경험과 주관이 생긴 것이다. 예전 같으면 특별한 ‘배려 없이’ 의견이 모아지던 것이 이제는 ‘협상’이 필요한 때도 많이 생기는 것이다. 그것을 옛날의 ‘즐거운’ 때만 생각하며 ‘쉽게’ 생각하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집을 떠난 6년 동안 그 애만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배운 습관들.. 역시 옛날의 것에 비교하면 무리가 있다. 나는 그저 그런 모든 ‘조그만 문제’들은 가족의 사랑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확신’을 하며 살았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역시 모자랐다.
하느님은 공평하신가.. 괴로운 때와 즐거운 때의 비율이 반반 정도라고 하면 조금 과장 된 것일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즐거운 순간들이 기가 막히게도 괴로운 순간들을 ‘중화’시키며 살아가게 해 준다. 하지만 역시 결론은 각각 독립적으로 살려면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불경기 속에서 job을 용케 찾았고, 안정된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자마자 새로니는 ‘결사적‘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되었다.
우리의 희망은 결혼을 하면 더 안정될 것 같지만, 세상은 참으로 많이 변했다. 요새 젊은 여성들의 생각은 우리의 희망과는 전혀 무관하게 흐르고 있었다. 인생에서 결혼의 우선순위는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 하물며 자식을 낳은 다는 것은 그 보다 더 낮은 곳에 있었다.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다지 급할 것도 없고 중요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다. 남의 간섭을 덜 받고, 편하게 살려는 일종의 ‘쾌락주의‘라고나 할까. 간혹 행운적으로 예외는 있지만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일 수록 더 그런 경향이 심하다. 그런 것을 알면서 push한 다는 것은 더욱 큰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는가?
결국, 옛날 우리의 즐거움이었던 큰 딸 새로니는 우리의 품을 ‘완전히’ 떠나기로 하고, 불경기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부동산 경기를 의식하며 혼자 몇 년은 살 수 있는 1 bed-room condo를 사게 되었다. 처음에는 거의 혼자서 직장시간을 쪼개어서 집을 찾고 보고 하더니 너무나 피곤한지 realtor를 구하게 되었다. 미국인 realtor만 상대하더니 나중에는 아무나 상관이 없는 듯해서 우리 한인성당에서 알게 된 Emily Kim 자매님을 연숙이 소개해 주었고, 조금 씩 오르기 시작하는 집값을 의식하며 거의 3개월 동안 이곳 저곳을 찾아 다니다가 결국 Atlanta mid-town에 있는 condo를 찾게 되었다.
그 property는 비교적 싸게 나온 것으로 역시 지독한 불경기 속에 foreclosure된 것으로 bank소유였고 소위 말하는 short sale되는 그런 곳이었다. 한창 부동산 거품일 적 그곳은 아마도 $100,000이상에 거래 되던 곳이었을 것이 거품이 빠지면서 거의 $85,000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원래 주인은 아마도 mortgage를 낼 수가 없어서 그냥 집을 떠났던 그런.. 지난 5년 동안 이런 ‘비극’은 미국 전역에서 수없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런 곳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조금씩 팔리게 된 것이다. 그뿐이랴.. Mortgage interest rate가 옛날 우리가 듣고 보던 것의 반도 채 안 되는 저렴한 것과, 지역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정부 레벨’에서 각가지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까지 생겨서 그런 정보들만 잘 찾아내면 더 싸게 살 수도 있게 되었다.
악착같이 새로니는 그런 것을 찾아내어서 거의 $15,000을 절약하게 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보조해 주는 것인 모양인데, 조건은 집을 처음으로 사는 것과, 그 집에서 5년은 살아야 하는 것, 지역도 Atlanta 시내 인 것 등으로 새로니에게는 아무 하자가 없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조건이고 역시 관건은 ‘구비 서류’에 있었는데 그것을 그 애는 정말 꼼꼼히도 챙기며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 혜택을 받아내었다. 그것을 보고 우리부부는 입만 벌리기만 했는데, 우리보고 하라면 ‘절대로’ 못할 서류들이었기 때문이다.
Bank loan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우리가 20년 전 집을 살 때와는 정말로 sea change였다. ‘무섭게, 까다롭게, 시간을 질질 끄는’ 그런 식.. 어찌 안 그렇겠는가? 지난 부동산 거품이 그런 것을 너무나 해이하게 하였기에 생겼던 것이 아닌가? 하지만 군소리를 못 할 것이 그렇게 해야 다시는 전과 같은 ‘거품’이 생기지 않기에 말이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2주 전에 드디어 closing이 성사가 되었는데, 그때 새로니의 기쁨은 우리가 옆에서 보아도 큰 듯 했다. 거의 ‘혼자서’ 한 것이다. 아니 100% 혼자서 한 것이다. 우리는 가끔 집을 같이 보았던 것.. 그것 뿐이니까. 그런 날이 우리 집에서는 Lemon Grass moment 라고 불려져서 모처럼 단출한 4식구가 ‘모두’ 모여서 외식을 하고 ‘꼬마’ 집주인이 된 새로니의 ‘독립’을 축하해 주었다.
그저께 드디어 moving truck이 와서 많지 않은 짐을 mid-town으로 날랐다. 동생 나라니 집에서 언니에게 주는 used couch도 날라와서 그런대로 살만한 환경으로 변하고, 새로 페인트를 칠하며 ‘혼자 사는’ 꿈을 꾸는 듯.. 옆에서 보는 우리의 심경은 조금 mixed라고나 할까.. 어찌 안 그렇겠는가.. 우리 가족의 변천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막상, 마지막 이삿짐이 나가면서 우리는 정말 착잡한 심경을 맛 보았다. 같이 있을 때, 조금 더 친절하게 해 줄 수는 없었을까.. 역시 우리는 후회를 만들며 살고 있는 것이다. 속으로 계속, “새로니, 서로 섭섭하게 한 것들이 있으면 빨리 잊자, 우리는 가족이니까” 라고 되뇐다.
생각한다. 아주 오래 전, 1960년 영화 ‘로맨스 빠빠‘ 에서 보는 것처럼, 고향 서울 커다란 한옥 줄줄이 이어지는 사랑방에서 각자 기거하며 ‘오순도순’ 살던 대가족들, 비록 가난했지만 절대로 외롭지는 않았다. 이제 우리는 4명 밖에 안 되는 ‘형편’에 그것도 떨어져 살아야 마음이 편하게 느껴진다는 그런 사실이 슬프게 하는 것이다. 시대는 변하고 시간은 흐르고, 사는 방식도 변한다. 이제는 절대로 옛날 식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일까. 역시 슬픈 심정을 떨칠 수 없는 시간들이다.

Blind가 아직 없는 창문으로 보이는 mid-town view, 정말 오랜만에
urban feeling을 회상하게 하는 광경이었다.

아틀란타 midtown, 기대 보다 훨씬 깨끗하고 젊게 느껴진다
얼마 전에 일본 TV 연속 드라마 ‘후리타 집을 사다(フリ-タ-、家を買う)‘라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 후리타는 freeter의 일본식 표기 발음이고, ‘공짜로 부모 집에’ 얹혀 사는 young adult children을 말한다. 대부분 ‘바이또’ (아르바이트)를 하며 ‘독립할’ 날만 손꼽는 자녀들,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사는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런 현상이 있는 모양. 하지만 그 드라마는 아주 ‘착실한 후리타’를 잘도 그려냈다.
열심하고 건실하게 사는 애 띤 청년이 삼류대학 출신이라 대기업 직장을 못 구하고 조그만 토목회사에 ‘아르바이트’ 로 들어가 일을 하지만 우울증에 걸린 엄마를 위해서 좀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일념으로 각가지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참 눈물겹게도 그려냈다. 끝이 정말로 흐뭇한 것으로 결국 집을 사게 되는 것이다. 가족관계가 경제성장으로 많이 해이해진 일본, 연로해가는 부모를, 자기 희생까지 하며 돕는 이런 드라마는 아마도 현재 일본의 개인적 사회 현상에 ‘경고, 충고’를 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 본다.

후리타 집을사다, 인기 일본 TV 연속 드라마

후리타 집을사다, 주연배우, 왼쪽
 집에는 큰 북이 없어서 이렇게 ‘장난감’ 북과 북채로 연습을 한다
집에는 큰 북이 없어서 이렇게 ‘장난감’ 북과 북채로 연습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