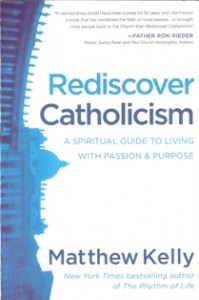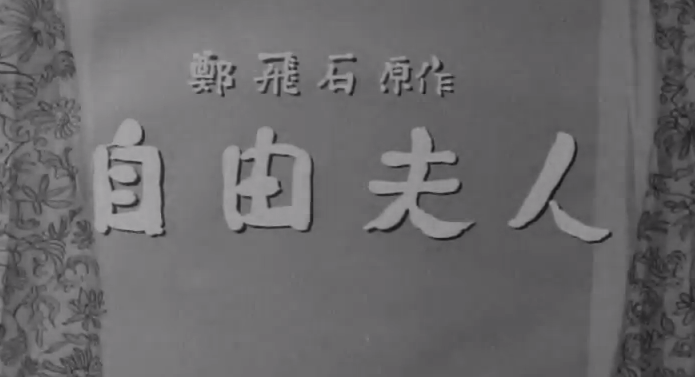Great Ubuntu Hope

내가 Ubuntu[표준 한글 표기는, 우분투 쯤 될까?]를 알게 된 것이 언제였던가? 생각보다 그리 오래 전은 아닐 듯하다. 아마도 2008년 경이었을까?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것이 일반에게 공개, 배포된 것은 2005년 경이었다고 한다. 이 Ubuntu란 것은 물론 Open & Free computer operating system인 Linux의 한 ‘종류’이다.
Linux의 ‘핵심(kernel)’은 ‘한가지’이지만 그것 이외 부수적인 것들은 무수히 많다. 그것이 Free & Open system의 특징일 것이다.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조금씩 바꾸어서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Free & Open‘ 철학은 정말 처음 나올 당시에는 ‘혁명’적인 idea였다. 특허로 꽁꽁 묶어 놓거나, copy-protection으로 방어하며 ‘고가’로 팔아야만 했던 computer software (OS 포함, Windows, Apple OS, etc)를 ‘공짜로’ 주겠다는 것은 사실 얼듯 듣기에 ‘미친’ 생각으로 들렸던 때.. 참.. 지금은 많이 많이 변했다.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Microsoft Windows 급인 Linux(리눅스)인데, 물론 이것은 ‘처음부터’ 그런 Free & Open 철학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 ‘철학’만은 굳세게 유지되고 있다. 그들의 철학은 computer software는 모든 사람이 ‘무료’로 쓸 권리가 있고, 더욱 그것을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도 있다는 것인데, 역시 이런 idea는 Microsoft나 Apple 같은 business model과는 180도 다른, 정반대의 model임이 틀림이 없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이익추구’ 성질을 어찌하랴.. 기어코 이런 free & open model에다가 profit을 가미한 model도 만들어 내서 의외로 잘 운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Red Hat 이나 IBM 같은 큰 회사들 인데, 이들은 ‘공짜’ linux를 만들어 대기업에 service를 팔아서 돈을 번다. 그러니까 ‘물건’은 공짜지만 그것을 유지, 수리하는 것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의외로 이것이 그렇게 큰 business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이런 새로운 business model은 이제 아주 튼튼한 자리를 잡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위의 예들은 ‘일반대중’과는 거리가 있는 대기업의 server system들인 반면 일반 대중들이 쓰는 PC desktop system은 Microsoft 의 Windows나 ‘머리는 조금 아둔하지만 돈은 많은’ 사람들이 쓰는 overpriced Apple computer 가 든든하게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비싼 Apple Mac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Windows가 거의 ‘거저’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것이 최근 2~3년 안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그 원인 중에는 mobile system(smart phone, tablet)의 폭발적 보급과 오늘의 화제인 Ubuntu system같은 open & free software 의 일취월장하는 성능의 향상.. 등이 있을 것이다. Mobile system에서는 역시 stupid but rich 를 봉처럼 생각하는Apple의 iPhone 같은 iXXX가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했었지만, 현재는 Google의 Android 가 시장의 거의 3/4를 차지하게 되었다. 여기서도 역시 open system인 Android가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지금은 computing system history로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 듯하다. 소위 말해서 post-PC era를 모두 예견하고 있는데 그 때의 ‘패자’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다. ‘철학적’으로 봐도 ‘지독히도 이기적’인 Apple model은 그들이 ‘아무리 쌓아둔 돈’이 많다고 해도 장기간 sustain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 그들의 철학은 그 옛날 ‘고철‘ mode IBM을 연상시킨다. 모든 것을 ‘우리가 발명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mindset은 이제 한 물이 갔기 때문이다. 현재 Apple이 바로 같은 mindset, 아니 더 심하게 고립적이고 독선적으로 ‘돈을 긁어 모으고’ 있다. 또한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오랜 기간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거의 monopoly로 monster가 되어버린 Microsoft는 이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지경이 되어가고 있다.
개인 적으로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 처럼 Microsoft customer로 오래 있었는데, 그것은 corporation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지금과 같은 credible한 competition도 없었기에 한마디로 choice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corporation을 떠나게 되면서 나는 그런 무상 혜택의 제한이 없어지고, 내가 고를 수 있으면 아무 것이나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Linux가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었고 나의 ‘구세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자유’로운 Linux는 사람들의 구미에 따라 많은 flavor로 분열이 되어서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혼란’의 상태가 뒤 따라서, 각종 flavor마다 독특한 맛이 다르고, 새로 배워야 하는 짜증도 따른다. 강력한 ‘통제체제’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바로 free & open system의 특징이라서 이것을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는데, 결국은 최근 들어서 서서히 Ubuntu system이 ‘de facto‘ winner로 군림을 하게 되고, 많은 노력 끝에, 그것을 더욱 더 일반 대중이 쉽게 쓸 수 있게 ‘매끈하게’ 보이는 데 ‘거의’ 성공을 하는 것 같다.
특히 최근 version인 12.x는 어떤 feature들은 Windows를 능가하는 것들도 등장하고 있다. 나도 그 동안 virtual system으로 ‘가끔’쓰곤 하다가 현재는 거의 정기적으로 쓰고 있다. Windows를 쓰다가 이것을 쓰면 당장 문제가 소위 말해서 business-standard인 Microsoft Office가 없다는 어찌 보면 ‘치명적인 듯’ 한 결점이 있는데, 쓰고 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그것과 거의 맞먹는 Libre Office 란 것이 있고 Microsoft Office과 ‘호환성’이 아주 좋기 때문이다. 누가 ‘꼭’ MS Office file을 원하지 않는 한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Ubuntu all the way! Mark Shuttleworth
그러다가 결국은 Ubuntu의 ‘장기적’인 development model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결국은 앞으로는 Microsoft의 Windows desktop system를 적수로 삼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독자적인 ‘미래형’ system으로 가겠다는 정말 ‘대담한’ idea의 출현인 것이다. 이곳에 있는 Youtube video를 보면 알 수 있듯이, Ubuntu 하나로 smart-phone, tablet, desktop 전역을 ‘매끈’하게 해결하겠다는 아주 야심적인 계획.. 이것을 정열적으로 거의 맨손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Ubuntu 창시자 Mark Shuttleworth (a South African), 그는 억만장자에다가 idea가 많은 사람이고 그야말로 ‘좋은 쪽의’ visionary에 속하는 사람이다. Ubuntu란 뜻, ‘humanity toward others‘처럼, 그는 Steve Jobs같은 egomania, megalomania가 아니며, 그의 passion처럼 모든 일이 풀려나간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명의 혜택’을 골고루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