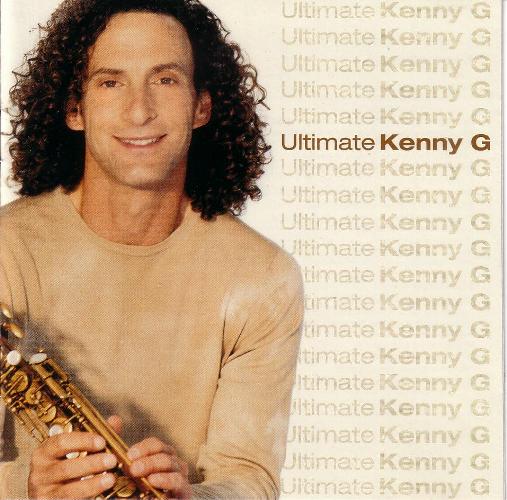Thanksgiving prayers, 2013

Thanksgiving prayer.. 추수감사절 기도..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이날을 맞곤 했지만 만찬 식사 table에서 가족 ‘기도’에 관한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명색이 가톨릭 크리스천이었지만 나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 turkey를 앞에 놓고 한 마디도 못하곤 했다. 언젠가 ‘가장’으로 기도를 하라는 연숙의 말에 깜짝 놀라 한마디 했지만 그것은 지금 생각해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어불성설’ 같은 넋두리였고, 아이들도 속으로 웃는 것처럼 들렸다.
가톨릭 신앙인으로 내가 가톨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는 ‘자유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은’ 묘한 전통에 있었다. 최소한 개신교인 들에 비해서 그렇다. 그들, 개신교인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도’ 잘하고 길게도 한다. 몇 년 전 동창회 모임에서 어떤 개신교 자매님의 식사 전 기도가 거의 30분을 끈 것을 보고 나는 그런 확신이 생겼다. 개신교인들은 자유 기도의 귀재 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 주님’ 하며 남들이 보이게 지나치게 긴 통성기도를 하는 그들을 보면 성경에서 그런 모습의 바리사이 Pharisees 를 질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도 한다. 물론 모든 개신교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지만 비과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천주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의 기도 ‘실력’의 1%도 미치지 못할 듯 하다.
나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도를 말로 하건 속으로 마음으로 하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남에게 들리는 기도를 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또다시 강조하지만, 개신교 형제, 자매들은 ‘기도와 성경’의 실력에서 99% ‘본 고향’인 천주교를 완전히 앞지른다. 의식과 전통을 경시하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사실 성경과 기도일 것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한다.
올해, 오늘 추수감사절 식사는 단촐 하기만 한 우리 식구만 모여서 지난 일년의 ‘은총과 은혜’를 감사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모이기 전에 연숙이 나보고 꼭 식사 전 ‘가장’ 기도를 하라고 귀 띰을 한다. 또 우물거리며 넘기려던 나의 희망은 사라졌지만 올해는 조금 예년과 다르게.. 이것 이것.. 한번 도전해 보자 라는 오기가 조금 생겼다. 이것도 근래 3년간 겪고 있는 나의 faith renaissance 중에 하나인지는 모르지만 작년과 다르게 나의 머리가 굴러가고 있었다. 시간은 2시간.. 어떻게 ‘작문’을 할 것인가.. 차츰 머리가 굳어짐을 느꼈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러다가 머리가 번쩍! 하였다. 아하! 우리 천주교에는 주옥과도 같은 ‘염경念經’ 기도문들이 즐비하지 않은가?
예전 같으면 이런 ‘알려진 기도문’은 책에서 찾아야겠지만 요새는 internet이 있어서 쉽게 ‘감사기도문’을 찾을 수 있었다.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오로의 서간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1테살 5, 18) 로 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자유기도에서 성경을 인용하기는 조금 무리였다. Thanksgiving Day 에 하기 알맞은 것을 찾아내었다.
Thank you Father, for having created us and given us in all our joys and sorrows, for your comfort in our sadness, your companionship in our loneliness.
Thank you for yesterday, today, tomorrow and for the whole of our lives.
Thank you for friends, for health and for grace.
May we live this and every day conscious of all that has been given to us.
We pray through Christ our Lord, Amen. +
하지만 우리 가족은 절대로 bilingual은 아니기에 우리들이 태어났을 때 얻었던 우리 말로 하는 기도도 필요하였다. 짧고 단순하고 유치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내가 ‘만든’ 것이다.
주님, 올해도 저희 가족들에게 건강과 평화를 주심에 저희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옆에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에게도 같은 은총을 주신 것, 감사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