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 유감 有感
 깡패.. 흠.. 참 더럽고 싫은 말 중에 하나다. 귀여운 깡패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에게는 99.99999% ‘증오의 대상’ 중에 하나다. 이 말이 주는 ‘더러운’ 느낌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요새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참 잘 만들어진 단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어원은 무엇일까? 깡+패.. 그러니까 ‘깡, 오기’를 부리는 ‘패, 거리’ 정도 아니었을까? 소리지르고 깡만 부리면 통한다고 생각하는 불쌍한 쓰레기들인가.. 상관없다. 싫고 증오스러운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깡패.. 흠.. 참 더럽고 싫은 말 중에 하나다. 귀여운 깡패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에게는 99.99999% ‘증오의 대상’ 중에 하나다. 이 말이 주는 ‘더러운’ 느낌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요새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참 잘 만들어진 단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어원은 무엇일까? 깡+패.. 그러니까 ‘깡, 오기’를 부리는 ‘패, 거리’ 정도 아니었을까? 소리지르고 깡만 부리면 통한다고 생각하는 불쌍한 쓰레기들인가.. 상관없다. 싫고 증오스러운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나의 blog에서 ‘회고록 류’ 그러니까 memoir 는 가장 쓰기 힘든 것이지만, 그만큼 쓰는 보람은 그에 비례해서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회고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인가.. 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정은 참 다르다. 그러니까 즐거운 추억이나 개인 역사를 더 잊기 전에 더 쓰고 남기고 싶었고, 나의 blog에서도 대부분 아련한, 즐거운, 포근한 그런 추억들을 주로 쓰곤 했다.
반대로 기억하기 괴로운 것들은 어쩔 것인가? 당연히 요리조리 피하며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그 중에서 ‘깡패의 추억’은 가히 괴로운 것 중에 괴로운 것, 잊고 싶은 것이다. 어떤 ‘개인적 사건들’은 가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잊고 싶었던 것들인데 분명히 나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버젓이 살아 있어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나의 나이가 70에 육박하면서, 조만간 早晩間 에 나는 이것을 정리하여야 한다는 강박감은 항상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사실 불편한 것이어서 성당에서 고해성사 告解聖事하는 기분으로 깡패의 추억들을 다 ‘정리 해고’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것, 숨어있는 ‘이글거리는’ 증오심도 나의 dark side의 일부가 되었다면 나는 이것을 가끔 하는 고해성사에 포함시켰어야 되었을 것이지만 그만한 값어치 조차도 나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싫었다.
깡패, 깡패들.. 내가 말하는 깡패는 100% 소위 말하는 ‘조무래기, 피래미 급’으로 이들의 특징은 철저히 ‘약육강식’의 쓰레기 철학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의 불만과 욕구를 철저히 채우려는 한마디로 ‘불쌍한 쓰레기’급 인간들이다. 문제는 그들의 연령층인데.. 유감스럽게도 내가 말하는 인간들은 모두 미성년이거나 지독히 젊었던 깡패들이어서 이것은 지금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떠한 환경이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었을까 하는 사실이다. 그 ‘쓰레기’들이 과연 자기들이 하는 짓이 옳은 것인가..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고 한 것이었을까.. 집단심리에 의한 불우하거나 불행한 자기 환경의 산물이었을까.. 하는 것이다.
내가 자라던 6.25 이후의 역사적인 환경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깡패들을 무수히 배출하여야만 했던 암울하고 가난하고, 법 이전에 주먹이 훨씬 효과적이었던 그런 시절이긴 했다. 게다가 급수가 아주 높았던 ‘정치깡패’들이 판을 치던 그런 시절도 겪었다. 한마디로 ‘법치국가’란 것은 말 뿐이던 ‘폭력의 사회’ 가 생활의 일부가 되었던 6.25 전쟁 후의 대한민국 실정.. 나는 그런 ‘남자들의 험악한’ 환경에서 알맞게 적응을 못했던 것이었을까? 특히 가부장제가 굳건하였던 그 시절 아버지 없었던 집의 내성적인 남자아이가 사회적으로 겪었던 것은 남들보다 더 심각한 경험들이었다.
이번에 더 미루지 못하고 ‘깡패의 추억’을 논하게 된 마지막 계기는, 얼마 전 같은 성당구역의 교우형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다. 그 형제님 왈 曰.. 자기가 “깡패였다”고 서슴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도 주저함이나 부끄러움이 그 태도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나이 탓인지 예전에 보던 그런 ‘나쁜 깡패’의 인상을 풍기지도 않았다. 모두들 오래 전의 아련한 추억 정도로 무협영화를 보는 정도로 들은 듯 하였지만 나는 복잡한 생각 뿐이었고, 이렇게 ‘정리해고’를 더 미룰 수는 없다.. 는 생각을 굳힌 것이다. 옛날 옛적의 ‘나쁜 놈들’ 이들을 용서할 것인가, 죽을 때까지 증오할 것인가?
내가 반세기도 넘는 옛날 옛적 70년대 초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느낀 것도 깡패에 관한 것이었다. 이 나라 이 땅에는 주변에 추악한 깡패들이 안 보였던 것이다! 최소한 나의 눈앞에 그 놈의 ‘쌍판’들이 보이지 않았다. 아하! 내가 살 곳은 바로 이곳이로구나.. 쾌재를 불렀고 그 이후에도 나의 주변에는 깡패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다.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이렇게 같은 지구 위에서 사는 곳이 다른가? 경제적인 요인이 제일 먼저 떠 오르고 다음은 사회, 문화적인 것 등이 있지만 결과는 모두 ‘종합판’일 것이다. 복합적인 것들..
미국에도 bully 정도의 ‘순한 깡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경험했던 ‘한국판 bully’와는 game이 안될 정도다. 욕을 하는 정도가 하늘과 땅의 차이고, 폭력의 정도도 마찬가지다. 모든 ‘불운과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며 남을 괴롭혔던 대한민국 조무라기 깡패들, 한마디로 ‘쓰레기 중의 쓰레기’였다. 내가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정말 무서웠던 사실은 ‘맞아서 아프고 수치심을 느끼고’ 하는 것 보다는 ‘꿈에라도 기관총으로 이들을 모조리..’ 하는 생각이 들 때였다. 상상이지만.. 이것이 상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상상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나의 괴로운 추억들도 나이가 들면서 다 수그러지고 조금씩은 ‘자비’의 심정으로 그 쓰레기들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게 되었다. 내가 그들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반전 scenario’도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역시 ‘나는 절대로 그런 쓰레기가 될 수가 없다’.. 였다. 그 쓰레기들.. 환갑을 넘기고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기들의 과거를 어떻게 회상을 하며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해 줄까.. 재미있는 상상도 꼬리를 문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깡패였고, 누구누구를 매일 패 주었다’ 고 자랑을 할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괴롭힘을 당한 애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심정이 들었다면 괜찮은 노후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꿈 속에 ‘기관총으로 모조리..’ 라는 표현을 생각하며 나는 다시 한번 놀란다. 미국은 근래에 들어서 ‘깡패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아이’들이 실제로 ‘기관총 급의 무기’로 깡패들은 물론 옆에 있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mass shooting이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나는 100% 그 ‘정신병자, 피해자’를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mindset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 모두 극단적인 case이지만.. 원인을 따져보면 ‘쓰레기급 깡패’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정말로 나의 마음 속 깊이 수십 년간 눌려있었던 나쁜 추억, 잠재의식, 분노..등을 ‘정리해고’할 때가 왔다. 나를 괴롭혔던 ‘쓰레기’들.. 용서하고 싶고 그들도 진정한 회개를 하며 노후를 맞이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용서하려는, 하는 나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혼자의 힘으로 안 되면 ‘높은 곳’의 도움을 청하고 싶다.
Sam the Sham & Pharaohs – Wooly Bully –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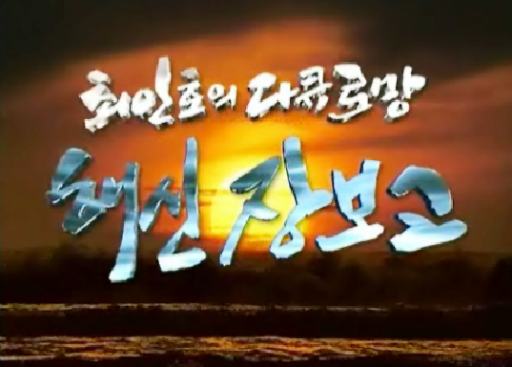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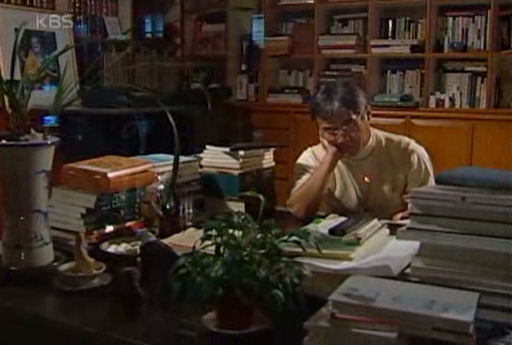



 이 cute한 사진을 보고 안 웃을 수 있을까? 자유롭고 ‘유치’한 어린아이의 큰 웃음과 파안대소 교황님 프란체스코의 만남.. CNN의 제목은 ‘우울한 암울한 뉴스’에 치어 죽을만한 이 시기에 이런 웃음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일까? 희망은 있다.. 대림절의 뜻과 부합하는 희망이 솟구친다.
이 cute한 사진을 보고 안 웃을 수 있을까? 자유롭고 ‘유치’한 어린아이의 큰 웃음과 파안대소 교황님 프란체스코의 만남.. CNN의 제목은 ‘우울한 암울한 뉴스’에 치어 죽을만한 이 시기에 이런 웃음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일까? 희망은 있다.. 대림절의 뜻과 부합하는 희망이 솟구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