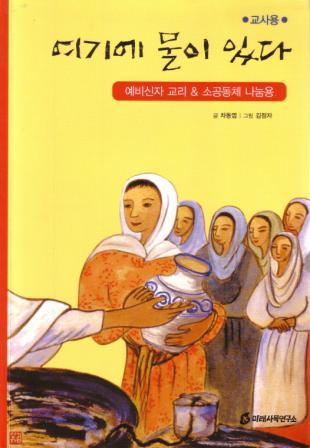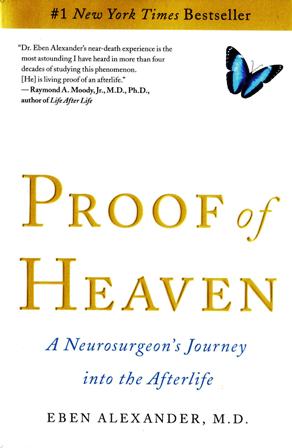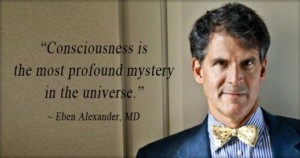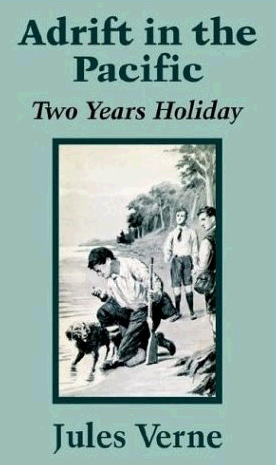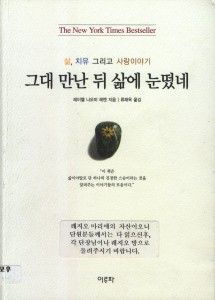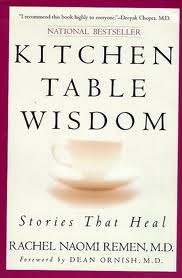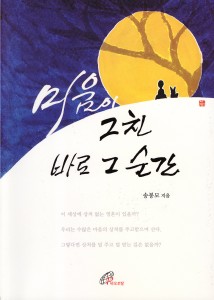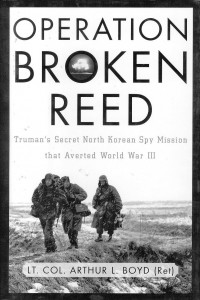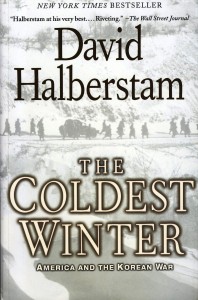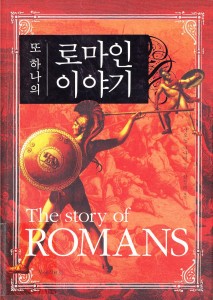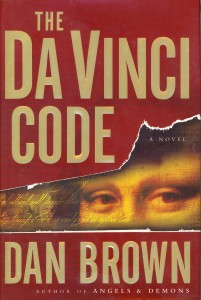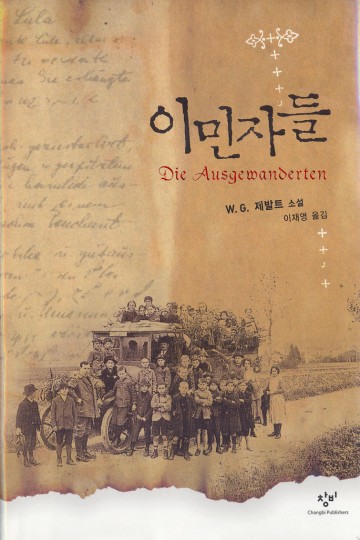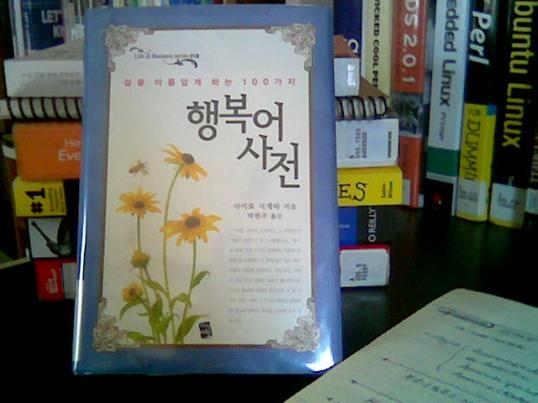extreme multitasking, 친전, sad vindication…
¶ Extreme multitasking
끈적거리는 올해의 여름이 끝나가던 무렵부터 나는 ‘본의 아니게’ 갑자기 시간이 황금같이 느껴지게 바빠짐을 느낀다. 우리의 일상적인 routine을 제외한 예외적인 ‘일’들이 하나 둘씩 더해지더니 급기야 과장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게 된 것이다. 내가 ‘좋아서’ 만든 일들은 결코 아니다. 급하거나 꼭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생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큰 불평은 없다. 이것이 내가 사실은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보다, 두 가지, 두 가지보다 세 가지… 등등으로 나는 많을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훨씬 ‘즐겁고 능률적’으로 느껴지고 실제로 결과도 나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일의 성질이 ‘비슷한 것’이면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된다. 한마디로 adrenaline이 샘 솟듯 솟구치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현재 나는
- 일생 일대 ‘가장 중요한 서류’를 찾는 일,
- 나의 서재가 될 아래층 거실의 flooring을 교체하는 일,
- front door의 ‘무너지는 듯 한’ structure를 고치는 일,
- backyard vegetable garden의 완전 ‘자동화’ , drip watering irrigation works,
- garage major cleanup..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연숙은 이런 나를 의아스러운 눈으로 보는 듯하다. 자기는 한가지를 ‘완전히’ 끝내야 다음 일에 착수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런 extreme multitasking을 하는 것은 아주 정연한 내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다. 과학적인 것은 물론 아니지만 나에게는 과학적인 것이다. 나는 분명히 믿는다. 이런 방식이 전체적인 시간을 ‘훨씬’ 줄여 준다는 사실을.
 ¶ 친전 親傳 김수환 추기경의 친전… 친전이란 말은 ‘아마도’ 한자로 親傳을 말 할 것이다. ‘친히 전한다’는 말이니까, 이 친전의 글을 읽으면 김 추기경이 바로 나의 옆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뜻이 아닐까? 이것은 얼마 전 연세대 이원선(도밍고) 동문의 부인 이 베로니카 자매가 연숙에게 빌려 준 것을 내가 다시 빌려서 읽어 보게 된 책의 제목이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것이라 문득 내가 알고 있는 추기경님은 어떤 분일까 생각을 해 보았다. 별로 자세히 아는 것이 없었다. 그저 기억에 나는 것으로는 내가 대학을 다닐 시절에 대한민국에 첫 추기경이 나왔고 그분의 이름은 김수환 신부였다 정도다. 그 당시 추기경이란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 길이 없었고 사실은 관심도 없었다. 나와 천주교는 너무나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천주교는 고사하고 종교, 신앙에 전혀 눈이 뜨이지 않았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뉴스에 나온 것이다.
¶ 친전 親傳 김수환 추기경의 친전… 친전이란 말은 ‘아마도’ 한자로 親傳을 말 할 것이다. ‘친히 전한다’는 말이니까, 이 친전의 글을 읽으면 김 추기경이 바로 나의 옆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뜻이 아닐까? 이것은 얼마 전 연세대 이원선(도밍고) 동문의 부인 이 베로니카 자매가 연숙에게 빌려 준 것을 내가 다시 빌려서 읽어 보게 된 책의 제목이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것이라 문득 내가 알고 있는 추기경님은 어떤 분일까 생각을 해 보았다. 별로 자세히 아는 것이 없었다. 그저 기억에 나는 것으로는 내가 대학을 다닐 시절에 대한민국에 첫 추기경이 나왔고 그분의 이름은 김수환 신부였다 정도다. 그 당시 추기경이란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 길이 없었고 사실은 관심도 없었다. 나와 천주교는 너무나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천주교는 고사하고 종교, 신앙에 전혀 눈이 뜨이지 않았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뉴스에 나온 것이다.
그 이후 미국에 살며 더욱 더 잊고 살다가 ‘간신히’ 내가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면서 추기경의 뜻도 가깝게 느껴지게 되고 김수환 이란 이름도 친숙하게 나에게 다가왔다. 그것이 전부랄까.. 그저 반정부 데모 때에 데모 학생, 군중을 지지하는 ‘민중의 편’에 섰던 천주교를 초월한 민중의 지도자라는 것도 뉴스를 통해 간간히 듣게 되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선종’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죽음은 ‘전 국민의 슬픔’이었다는 것도 알았다. 비교적 객관적인 ‘김수환 론’은 한글 Wikipedia에 잘 나와있는데, 조금 읽기 거북한 ‘반 김수환 평’이 균형을 맞추려 실렸는데.. 참 비신자도 아니고.. 신앙인을 이끄는 사목자라고 하는 이름도 비꼬인듯한 ‘함세웅‘이란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답답함을 떨칠 수가 없었다. 시대적 사상이 인간 기본적인 가치를 넘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시대착오적인 사제가 ‘원로’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는 사실 철저한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친전’ 책을 통해서 생생한 그분의 ‘육성’을 대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그분의 인간적인 면모, 추기경 재직의 역사적 의미, 신앙적인 측면, 인간애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게 되었다. 비록 철저하게 천주교에 근거한 신앙관, 도덕관, 정치, 세계관으로 삶을 살려고 했지만 그가 산 시대는 그를 만성 불면증으로 시달리게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한 그의 삶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주위에서 본 그의 인간상이 적나라하게 적혀있는 것이다. copyright에 구애 없이 나는 또 reading by typing으로 나 이외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그의 삶을 보여주고자 이곳에 남겨 두었다. 시간 날 때마다 한 구절 한 단락,한 페이지씩 읽으면 매일 묵상거리로도 좋을 듯 하다.
¶ Sad Vindication
며칠 전 아주 오랜만에 아틀란타 순교자 성당의 구역 미사를 보았다.(미사를 ‘보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렇게들 쓰는 것 같고 영어에서는 미사를 ‘말한다, say mass’ 라고 하니.. 무슨 차이일까?) 우리가 속한 구역은 아틀란타 Metro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주로 Civil war에 관련된) Cobb county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에타 2구역’ 이다. 역사적인 전통은 그렇다지만 사실 살기에 편한 곳이라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은 ‘덜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곳이다. 다른 쪽으로 말 하면 family를 키우기에는 조금 더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계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거의 ‘bedroom community’ 로 ‘전락’한 느낌도 든다.
이곳의 유일한 매력은 아직도 ‘학군’의 가치에 있는 듯하지만 우리는 1992년 이사올 당시 이 지역의 ‘학군’이 그렇게 좋은 것을 모른 채 ‘나의 새 직장의 위치’때문에 이사를 왔었다. 하지만 아틀란타 올림픽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한인들이 99% 우리가 사는 곳의 ‘반대쪽’으로 정착을 하면서 이곳의 몇 안 남았던 business를 모두 그곳으로 흡수하게끔 만들어서 지금은 ‘무언가 하려면’ 거의 30 miles drive해서 Korea town으로 가야 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 ‘불편’함은 확실히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 살다 보니 ‘지나치게 밀집된 minority들’ 이 없는 이곳의 장점도 적지 않다.
우리는 3년 전부터 내가 레지오 마리애에 입단 하면서 구역모임에는 거의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실은 항상 우리를 우울하게 한 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간단히 말하면 ‘안 나가는 것이 편하다’라는 사실 하나였다. 우리가 구역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 2006년경이었고 한 동안은 그런대로 참가를 해서 몇몇 친근한 교우들도 생겼지만.. 차츰 차츰 구역모임의 성질이 변질하는 듯 하더니.. 급기야 이곳 저곳에서 이상한 말들을 들렸다.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지나친 socializing 에는 항상 위험한 요소가 있는 법이다. 특히 순교자 성당에 소속된 한 구역이라는 정체성(과 제한성)을 벗어나는 것은 더욱 그렇다. 솔직히 우리는 그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예를 다른 구역에서 듣기도 했지만 설마 ‘조용하게만 보이는’ 우리구역에서 그런 잡음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우리의 우려대로 모든 것은 최악의 상태로 치달은 듯 보였고 피할 수 없는 ‘희생자’까지 발생한 듯 했다.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구역미사에 참가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눈으로 목격을 하고 실감할 수 있었다. 항상 그곳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안 보였던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우리는 vindication이란 말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그것도 때 늦은 sad vindication이라는 사실이.. 씁쓸하기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