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bey가 잠자고 있는 낙엽에 덥힌 뒷마당에 늦가을비가 세차게..
¶ 비 쏟아지는 월요일: 하루 종일 어두운 하늘에서 싸늘한 비가 줄기차게 내린다. 비를 좋아하는 나에게는 물론 반가운 선물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flood warning이 나올 정도가 되면 선물의 정도를 넘은 것이다. 게다가 가끔 물이 새는 2층 지붕도 신경이 쓰인다. 그래도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도 이것은 역시 ‘가을비’가 아닌가? 각가지 감상적 생각들이 머리를 꽉 채운다. 물론 대부분 추억에 얽힌 생각들이다. 게다가 이런 을씨년스러운 가을비에 나의 영원한 친구 Tobey가 내 옆에 없다는 새로운 사실이 가슴에 걸린다. 이런 때면 나의 무릎에서 편하게, 평화스럽게 코를 골며 자던 그 녀석.. 비록 육신은 뒤뜰 땅속에 묻혔어도 녀석의 느낌은 아마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다닐 듯하다.


Saybrook Court에 아직도 남은 가을 낙엽들, 과연 언제까지 버틸까..
월요일에 내리는 비, 70년대 초 (1971년) The Carpenters의 classic oldie, Rainy Days and Mondays가 문득 떠오른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다시 없는 목소리’ Karen Carpenter의 잔잔하지만 깊은 목소리가 귓전을 맴돈다. 그렇다.. 1970년 초.. 미지의 세계를 향한 꿈을 꾸던 멋진 시절에 들었던 ‘비 오는 월요일’은 큰 의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의 가사처럼 ‘모조리 우울한 것’들이었다. 그런 감정이 반세기 뒤에 완전히 뒤바뀌어 이제는 반대로 즐기는 ‘선물’이 된 것이다. 세월의 조화가 아닐까?

이렇게 세차게, 힘차게 쏟아지는 비는 나의 혼탁한 머리 속을 씻어주는데..

이런 때면 문지방에 편하게 엎드려 하염 없이 비를 바라보던 Tobey는 이제..
요새 갑자기 ‘기분과 몸’이 훨씬 나아진 연숙 덕분에 다시 규칙적인 정상적 생활을 찾기 시작해서 오늘 아침도 예의 daily morning mass, adoration chapel, Sonata cafe, 그리고 YMCA workout의 routine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역시 예외는 예외다. 갑자기 연숙에게 ‘감기 기운’이 덮친 모양, 열이 나고 목이 잠기고 기운이 빠지고.. 나 같으면 그런 것 참거나 숨기거나 하겠지만 사람은 다 다르니까..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Bishop Robert Barron이 즐겨 강조하는 prudence 란 것이다. 나도 그의 말에 동감이다. 때와 장소에 따른 각가지 ‘덕목’들이 항상 같지 않고, 지혜롭게 ‘조절’을 해야 한다는 wisdom. 그저 참고 해야 할 것을 다 끝내느냐, 아니면 내일을 생각해서 할 것을 포기하느냐.. 결국은 내일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일은 일주일에 제일 중요한 레지오 주회합이 있는 화요일 ‘Legio’ Tuesday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날인 것이다.
Rainy Days and Mondays – The Carpenter – 1971
¶ ‘기타귀재’ 심재흥, 50년 전: 어제 중앙고, 연세대, 연호회 친구, 이윤기와 뜻밖으로 KakaoTalk 에 연결이 되어서 감회 깊은 이야기(texting)를 나누었다. 본지가 50년도 넘은 사람과 어제 헤어진 듯한 느낌으로 대화하는 것, 솔직히 이것이 바로 surreal 한 느낌이 아닌지.. surreal, surreal.. 한마디로 실감이 안 나는 것이다.
얼마 전 같은 그룹친구 양건주의 주도로 우리들 4명 (나, 양건주, 이윤기, 윤인송)이 기적적으로 단체 카톡방에서 몇 마디나마 서로의 숨결을 느끼게 되었다. 언제고 이 친구들의 최소한의 안부 정도는 알 수 있겠다는 안도감마저 들었다. 모두 친한 친구들이었고 특히 윤기는 헤어진 이후 거의 연락을 못하고 살아서 궁금한 것들이 더 많았지만 ‘거리와 세월의 횡포’ 의 희생자로 일생을 보낸 셈이다.
이 친구가 video하나를 올렸는데.. 1960년대 일본에서 활약했던 그 유명한 The Ventures를 ‘흉내’낸 electric guitar group의 공연이었다.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심재흥‘이란 이름을 떠 올렸다. 50년 전의 그 이름이 이윤기란 친구의 기억과 겹치며 떠오른 것이다. 연세대 전기과 동문들.. 그 중에 ‘기타귀재’라고 불리던 친구, 그가 심재흥이었다. 1969년의 회고담을 쓰려고 하던 참이라서 참 timing이 절묘하다고 할까..

그 당시 일제 electric guitar, 심재흥의 도움으로 샀고 역시 그의 도움으로 팔았던 기억..
그 당시 나는 이 ‘귀재’로부터 기타(특히 electric guitar)의 매력을 배웠다. 자세한 테크닉을 배운 것은 아니었어도 그가 연주하는 것을 보며 넋을 잃고 바라보기도 한 것, 나중에, 아니 지금까지 (통)기타를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했던, 엄청난 영향을 준 것,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심재흥’이란 이름을 언급하니 놀랍게도 이번에 보낸 ‘벤쳐스’ 동영상’이 바로 그 친구가 보낸 것이라는 것이 아닌가? 얼마 후에 연세대 전기과 동문들이 모이는데 그 친구도 만난다는 얘기에 나는 솔직히 꿈을 꾸는 듯한 느낌조차 들었다. ‘세월과 거리의 횡포’.. 도 이렇게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구나…
The Ventures – Wipeout live in Japan 1966
¶ 사랑의 기다림: 지난 토요일 모처럼 우리는 ‘자매 성당’인 둘루스 Duluth, GA 에 있는 김대건 성당엘 갔다. 이날 그곳에서 ‘추계 일일 침묵피정’이 거의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집에서 거의 30마일이나 떨어진 곳을 아침 8시에 집을 떠나야 하는 것 물론 귀찮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나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가라, 가라, 무조건 참석해라’ 라는 무언가를 거역할 수 없었다. 가만히 보니 근래 나는 이 ‘가슴 속 깊은 곳의 무엇’을 조금씩 느끼며 사는 듯하다. 그것이 거창하게 ‘성령’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유행하는 과학적 표현으로 아마도 quantum message 정도는 아닐까?
4년 전에 이곳으로 같은 피정에 온 기억이 남아있지만 매번 지도신부가 다르니까 피정의 결과는 매번 다를 것이다. 아침 점심 식사를 포함해서 각각 두 번의 신부님 강의와 침묵 묵상이 번갈아 가며 오후까지 계속되고 마지막에 미사로 끝을 맺는다. 이번의 지도 신부님은 우리의 도라빌 본당 보좌신부인 ‘김형철 시메온’ 신부님으로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비교적 젊은 신부다. ‘사랑의 기다림’이란 포근한 주제로 ‘전혀 지루하지 않고, 졸리지 않는’ presentation을 했다.
요사이 신부님들의 강론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분들 ‘과학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요새 신학교가 지나간 반세기 동안 급변하고 있는 과학문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 ‘갈릴레오 사건’으로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가톨릭 전통을 상기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이날 김 시메온 신부님의 강론 서두가 이것을 말해준다. ‘거시적 우주론, Cosmology’ 으로 주제를 이끌었던 것이다. 아마도 더 기다리면 아마도 상대성이론, Quantum Mechanics, String Theory 까지도 거론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런 추세를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철학적, 신화적’ 접근을 좋아하는 일반 신자, 대부분 여성들에게 이것이 크게 appeal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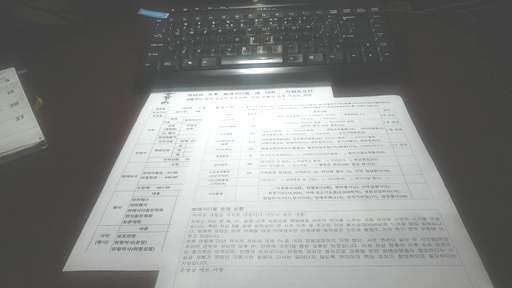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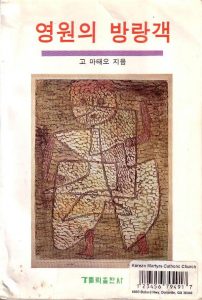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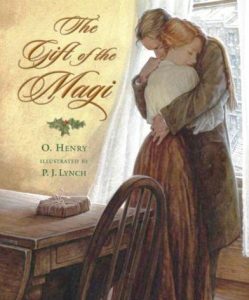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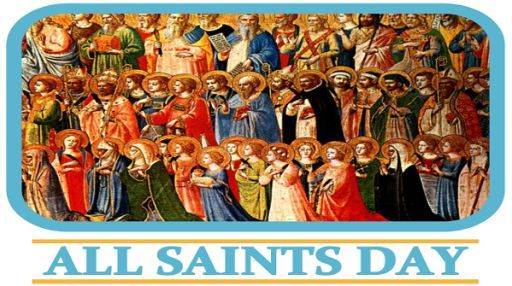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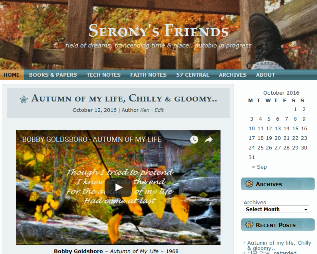 오늘 blog site의 front page의 그림이 가을 것으로 바뀌었다. Tobey와 깊은 가을 산책길에 떨어지는 낙엽을 올려다 보면 찍은 사진.. 오래 전 Ohio와 Wisconsin의 기나긴 겨울과 아주 짧은 봄, 가을의 날씨들에 비해서 이곳은 4계절이 너무나 뚜렷하다. 특히 봄과 가을이 북쪽에 비해서 긴 편이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올해의 가을은 어떻게 보면 ‘가을의 진수’를 한껏 맛볼 것 같은 희망도 든다. 파랗다 못해 검푸른 깊고 높은 하늘, 주변이 하늘처럼 높은 고목들에 둘러 쌓인 그 멋진 모습이 사진에도 많이 담겼다. 비록 ‘가을비 우산 속‘ 의 낭만은 없지만 이것은 다른 맛의 낭만이 아닐까? 언제까지 이 모습을 유지할 것인가?
오늘 blog site의 front page의 그림이 가을 것으로 바뀌었다. Tobey와 깊은 가을 산책길에 떨어지는 낙엽을 올려다 보면 찍은 사진.. 오래 전 Ohio와 Wisconsin의 기나긴 겨울과 아주 짧은 봄, 가을의 날씨들에 비해서 이곳은 4계절이 너무나 뚜렷하다. 특히 봄과 가을이 북쪽에 비해서 긴 편이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올해의 가을은 어떻게 보면 ‘가을의 진수’를 한껏 맛볼 것 같은 희망도 든다. 파랗다 못해 검푸른 깊고 높은 하늘, 주변이 하늘처럼 높은 고목들에 둘러 쌓인 그 멋진 모습이 사진에도 많이 담겼다. 비록 ‘가을비 우산 속‘ 의 낭만은 없지만 이것은 다른 맛의 낭만이 아닐까? 언제까지 이 모습을 유지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