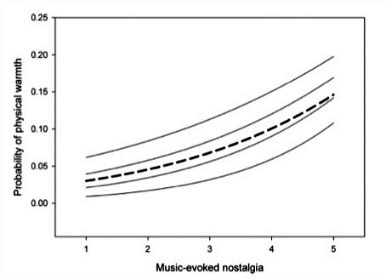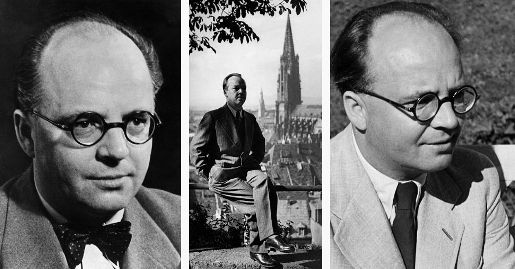끈끈한 유월 초순에..
지난 밤 자다가 갑자기 끈끈함을 느끼며 서서히 정신이 너무나 말똥거리고 그 ‘덕분’에 주위의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지는 가운데 불면증의 괴로운 밤을 보냈다. Ceiling fan의 도움으로 조금 끈끈함은 물리칠 수 있어서 새벽녘에 조금 잠을 잤는데.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결과적, 공식적으로 나는 밤잠을 자긴 잔 것이다. 갑자기 습도가 뛰어오른 것인데, 아마도 shower를 안 하고 잔 것 때문에 더 끈끈하게 느꼈던 것 같다. 솔직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type의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일찍 온 것인가… 옛날 고국에서 7월 초부터 느꼈던 ‘장마성’ 기후와 비슷한 것이다.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Pandemic 이후, 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나의 머리 속을 조금 현재와 다른 것으로 청소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문제다. 며칠 집을 떠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임은 알지만 지금 여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stupid한 것이다. 설사 여행이 자유스럽다고 해도 우리는 둘 다 집을 떠나는 것은 고생으로 느끼기 때문에 역시 Home Sweet Home 안에서 여행을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의 머리를 청소할 수 있을 것인가?
어제는 순교자 성당의 공개된 주일 미사가 있었지만 우리는 65세 권고를 받아들여 집에서 온라인 미사를 보았다. 작은 놀라움은, 예상을 뒤엎고 교우들의 숫자가 공개미사 첫날보다 적었다는 사실이었다. 신부님도 꽤 실망을 한 듯한 표정. 또한 참석한 대부분이 ‘고정멤버’들인 듯 보였는데 그들의 나이도 만만치 않아서, 도대체 비교적 젊은 층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인가? 각자의 사정이 다 있겠지만 아주 젊은 세대가 주로 오는 토요일 특전미사는 아예 당분간 중지한다는 발표까지 있었다. 아마도 모두들 아직까지 조심들 하는 것이겠지만 참 어려운 문제다. 불현듯 모든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우리도 평상시처럼 가볼까 하는 충동까지 들었다.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현명한 결과가 안 나올지도…
삼위일체 대축일 주일미사 강론 – 이영석 세계자 요한 주임 신부님
이날 오후에는 김계환 안토니오 형제님의 가족장례미사가 있었을 것이다. 호스피스로 옮긴지 불과 하루 만에 선종하신 것인데, 이분에 대한 기억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소리없이, 조용히’ 봉사하신 분도 드물어서 애석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연도, 장례미사에 가 본지 도대체 얼마나 되었는지, 정말 그런 연령 행사가 고인과 유족들은 물론이고 함께 한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위안을 주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나의 blog post 가 드디어 1,000을 넘었다. 십 년 전부터 post 했던 ‘원래’ blog에 덧붙여 그 이전 것을 조금 더했기 때문에 1,000의 의미는 조금 퇴색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조그만 이정표 역할을 한다. 1,000… 에다가 10년이 넘었다는 사실은 나도 놀란다. 나는 이렇게 오래 끈기 있게 했던 것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모두 이런 ‘좋은’ 습성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지는 솔직히 나도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변할 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posting하는 작업 자체는 나를 하루하루 ‘제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됨은 분명하다.
아~ 청옥산… 얼마 전부터 자꾸만 ‘청옥산 靑玉山’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마도 백두대간 중에 청옥산이 있음을 알고부터였다. 나의 추억으로 알았던 ‘청악산’이 사실은 청옥산이었음은 오래 전에 알았다. 왜 이때의 생각이? 아마도 나의 잠재적인 ‘현실도피’의 표현이 아닐까? 눈이 쌓였던 산봉우리, 화전민 집의 아가씨, 풍경소리 은은하던 사찰의 진흙 벽 방… 모든 것이 꿈처럼 아름답고 그립기도 하다. 이것에 대한 ‘회상기’를 한번 블로그로 써보는 것도 기분 전환을 하는데 도움이 될 지도…
청옥산을 googling하면서 새로운 사실은 대한민국에 청옥산이란 이름은 3곳이나 있다는 사실이고, 이중에 두 곳의 청옥산은 모두 강원도에 있고 다른 곳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음도 밝혀졌다. 게다가 백두대간 중의 하나인 1,400m의 청옥산은 내가 갔던 곳이 아님을 알고 조금은 실망을 하게 되었다. 내가 간 곳은 삼척시 부근이 아닌 평창군 (미탄면) 부근의 산이었음도 확인을 하였다. 문제는 그 산이 Google map에 아직까지 안 보인다는 사실이다.
Deep Cleaning, 어제 무려 15년 만에 main bathroom tile grout에 깊숙이 스며든 곰팡이 자국들을 모조리 긁어내었다. 15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게으르게 살았는가? 누구를 탓하지 말자… 유혹은 강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 뿐이다. 골치를 썩히던 shower door frame 문지방을 최신의 design으로 바꾸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metal work이었다. $23 을 아끼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하고 싶었다. 결국은 해 내었다. 이것이 이번 일의 보람 중의 하나가 되었다. 갈고 닦아 모든 것이 반짝거리지만… 언제까지 그 맑음을 간직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일은 모든 끝났지만, 생각을 한다. 이런 일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니 10년이 아니라 1년에 한번씩 대청소를 하면 이렇게까지 힘과 시간이 들지는 않을 듯해서 앞으로는 일년에 두 번 정도 간단히 하기로 생각을 맞추었다.


거의 완전히 복원 된 main bath tub shower closet
새로니의 Vegetable Container, 지난 토요일 첫 손자 Ronan의 백일축하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Sandy Spring에 있는 새로니 집엘 잠시 들려서 백일음식을 전해주었다. 새로니는 완전히 방학이 되어서 stress가 많았던 online class 가르치는 것이 피곤한지 요새는 거의 완전히 gardener, 그것도 vegetable gardening에 심취를 하고 있었다. 엄마의 영향을 받기도 했겠지만 요새 아이들 모든 것을 science & technology의 시각으로 각종 야채들을 그 좁은 deck에서 잘도 기르고 있었다. 오랜만에 Tobey를 보는 듯한 Ozzie를 다시 보니 눈물이 날 정도였다. 그 녀석도 우리를 보고 깡충깡충 뛰며 오줌까지 흘릴 정도였다. 다시 나는 2년 전 6월 19일 날 세상을 떠난 나의 Tobey 모습과 이 녀석의 모습이 함께 어울림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