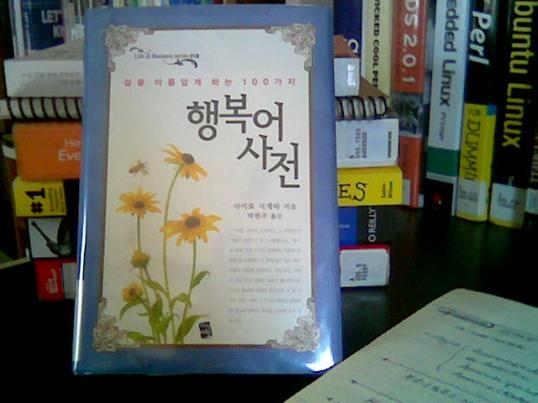행복어 사전
우연히 도서관에서 “삶을 아름답게 하는 100가지” 라는 작은 제목이 붙은 행복어 사전이란 책을 보게 되었다. 이곳의 bookstore 에서는 아마도 SELF HELP section쯤에 속하는 책일까… 이 책이 왜 금방 눈에 띄었는가 하면 같은 제목의 책이 전에 있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의 기억이 옳다면 아마도 <이병주> 라는 저자의 소설 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제목이 조금 특이해서 읽게 되었음을 기억한다. 처음에는 non-fiction인줄 알고 읽고 보니 그야말로 소설이었다.
하지만 이번의 행복어사전은 글자 그대로 행복어사전 이었다. 진짜 사전은 아니지만 행복으로 가게 하는 저자의 90세 경험에서 우러나온 경험적 글들의 모음 정도라고 해야 할까. Subtitle에 의하면 100가지라고 분명히 개수까지 밝히고 있다. 오늘 아침 크리스마스 다음날 일찍이 도서관에 나와서 읽게 되었는데 이건 내가 생각해도 나답지 않다고나 할까? 예전에는 사실 그냥 나의 서재에 앉아서 진한 아침 커피를 즐기며 있었을 시간이 아닐까? 이래서 인생은 꼭 예측대로만 진행되지를 않기에 조금은 재미있는 게 아닐까?
최근 거의 3년간 ‘다시 알게 되는 일본‘ 의 나만의 ‘공부’ 덕분에 조금은 일본인 저자가 생소하지 않고 일본의 이름들도 이제는 조금 친숙한 편이다. 그렇다. 이 책의 저자는 사이토 시게타라는 90세의 일본인이다. 90세라는 나이의 느낌도 이제는 나에게는 30세라는 나이보다 덜 생소하다. 나의 나이가 60세를 넘어서 그런가.. 30세라는 나이는 이미 내가 살아 본 나이라 덜 흥미롭지만 90세라는 나이는 내가 혹시라도 가보게 될지도 모르는 ‘미지’의 나이라 그런지도 모른다.
이 책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저자가 60세 이후의 ‘막내 늙은이’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평균적으로 직장생활이 60세 전후에서 끝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저자의 경험상 그런 것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책을 더 깊이 읽게 되면 더 알게 되지를 않을까? 현재까지 읽은 것에서 공감이 바로 가는 것 중에는 “고민거리 도 마감날짜를 만들어 두자” 가 있다. 처음에는 조금 우습게도 들렸는데.. 가령 “여보시오,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된단 말이요?” 하고 곧바로 반문을 하면 뭐라고 저자는 말을 할까? 굳이 따지자면 시간을 질질 끌면서 고민하지 말자는 뜻 정도가 아닐까? 하지만 저자는 말한다. 저자 자신이 아주 ‘효과’를 본 방법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민의 정도에 따라서 작은 고민은 10분에 고민을 끝내고 그 다음은 30분, 또는 최대 한 시간.. 등등.. 으로 개인에 맞게 시간을 정한다는 것이다. 조금은 너무나 현실적인 게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도움이 되는 테크닉이 아닐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을 끝을 생각하며 일을 하라는 뜻일 듯하다. 나의 style과 아주 정반대라고 생각도 된다. 나는 그 과정을 더 즐기는 타입이라 그런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