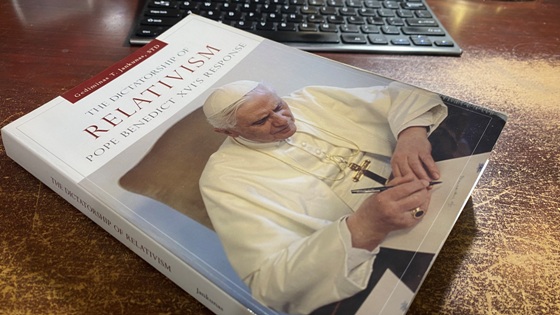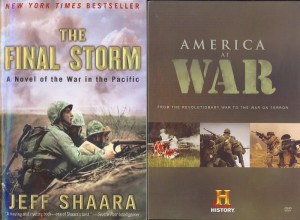2023년 9월 1일은 나에게 어떤…
9월 1일, 올해 느끼는 9월이란 글자, ‘반갑지 않은 10월’이 불과 한달 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 이것은 70여 년 전 1960년 4.19 혁명이 났던 그 당시, 서울 중앙중학교 1학년 시절 ‘주번週番1‘이란 글자가 아침에 등교하는 나를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있다는 stressful한 느낌이 주던 그 당시를 연상케 하는 착각에 빠진다. 요즈음 나는 그야말로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아동 심리적 상태란 말인가? 하지만 그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내가 만든 감정의 늪으로 하루 하루 빠져드는 연극 같은 한 달이 예상이 되는 것, 조금은 스트레스와 불편함인가…
일어나자마자 먼저 신경이 쓰인 것이… ‘녀석’이 어제 dry food를 먹은 후의 뒷모습이다. 혹시 ‘토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제 한때 잘 먹는 모습이 너무나 신나서 wet & dry 모두 주었더니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역시 섞어서 주는 것은 절대 금물, 많이 주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은 다시 wet으로 조금만 주어서 큰 문제없이 먹는다. 아~ 이렇게 신경을 써서야 어찌 pet의 즐거움이겠는가,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그저 그저 희망은… dry 를 완강히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10월 한달 food dispenser를 사용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기에… 그저 희망 사항이지만…
아~ Labor Day weekend, 우리에게도 labor는 아직도 따라다닌다. 아이들 손주들 돌보아 주는 것,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하고, 즐겁기도, 괴롭기도… 모두 엉킨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특권인가.. 우리 엄마 옛날 새로니를 뒤에서 덥석 안고 ‘아이고, 내 새끼’를 하시던 심정이 그렇게도 그리운데, 나도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사니.. 이 정도나마 고마워하고 만족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머님, 미안해요, 증손주들 증손주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왔는데 엄마는 그곳에서나 볼 수 있으니.. 나중에 결국은 모두 모두 그곳에서 재회할 거니까 그것으로 조금 위안을 삼습니다.
생일날 새로니 식구가 ‘몰려’왔다. 나의 생일이 아니지만 내가 ‘너무’ 좋아하는 gourmet doughnut 도 잊지 않고… 새로니 부부가 며칠 동안 식구들을 우리 집에 맡기고 여행을 간다고.. 참, 부럽다, 부러워… Ozzie는 그렇다 치고 유나를 재우며 보아주는 것은 한마디로 아직도 도전이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흐뭇하고 즐거운 것이었기에 은근히 기대도 한다.
비록 연숙의 생일이었지만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유나와 보내는 시간에 할애가 된 날이 되었다. 연숙에게는 조금 미안한 감도 없지 않지만 timing이 절대로 생일에 관심을 쓸 수가 없게 되었으니,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다행히 날씨가 놀랍게도 초가을의 맛을 보여주는 날이어서 그런대로 ‘행복한 시간’을 유나와 보낼 수 있어서 그것이 커다란 수확이 아닐지.. 특히 나와 유나가 예상을 뒤엎고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으니, 다른 것들은 크게 상관치 않기로 하고 싶다. 이제야 진정한 ‘손주’의 기쁨을 맛보는 듯 하기도 하다.
또한 화창한 날씨의 덕으로 Ozzie와 편안하게 오랜만에 녀석의 trail을 따라서 짧지 않은 산책을 할 수 있었다. 도대체 마지막으로 녀석과 산책을 했던 때가 언제인지 전혀 짐작을 할 수가 없으니.. 오래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우려하는 기억력 감퇴 때문인지.. [찾아보니… 녀석과 마지막 우리 동네 산책이 7월 14일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USCCB [미국주교회의]의 daily gospel email service로 ‘매일복음말씀’을 받아보았다. 연숙이 지난 10년 동안 매일 보내주던 ‘한글 매일복음말씀과 신부님 묵상글’에서 완전히 영어권으로 돌아온 것으로 읽으니 감회도 감회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글 문화권에서 긴 세월 동안 무섭게 잊혀져 가던 ‘한글의 체취’를 복음과 묵상글을 통해서 남들 못지않게 한글권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니 나에게는 아주 유익한 10년이었다. 그것이, 이제 다시 영어권으로 돌아오니 오히려 그것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며 참 사람의 언언 감각은 이리도 쉽게 변하는 것이구나, 은근히 놀라기도… 덕분에 지난 세월 잊혀지기 시작했던 가톨릭 영어 표현들이 조금씩 살아나오리라 믿는다.
이 복음 말씀은 Lectionary에서 그대로 copy한 것이지만 이것과 연관되어서 받아보는 Bishop Barron의 강론, 묵상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보물 중의 보물이다. 주로 ‘신학적 측면’이 많이 보이지만 그분 말씀대로 강론, 묵상도 오래 전처럼 dumb down된 것에서 벗어나 ‘지식적, 학문적’인 더 강조하는 신세대를 겨냥한 듯한 것이라서 주일본당의 분위기와 알맞은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서 나에게는 너무나 잘 된 ‘변화’가 되었다.

SparkFun에서 받아본 email newsletter, 주로 신제품 선전이긴 하지만 나에게는 남다른 도움을 주기도 한다. 지난 15년 동안 거의 주 관심 밖으로 밀려난 나의 전공분야 [computer, network, embedded systems etc]가 어떤 때는 그리워지기도 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런 광고성 newsletter service도 계속 받아본다. 어떤 때, 이곳에서 그야말로 Spark Fun! 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오늘 관심을 끈 것은 weather station system kit의 그림이었다. 아직도 아직도 나의 피를 끓게 하는 것 중에 electronics kit는 변함없는 것이다. 국민학교 4~5학년 때부터 시작된 이런 ‘조립의 기쁨’의 잔영은 아직도 인생의 황혼에도 큰 변함없이 느끼는 것이다. Local 중의 local 인 우리 집 주변의 실시간 기상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보는 것보다 흥미로운 ‘소일거리’가 아닐까? 이 SparkFun kit는 아이들 장난감의 수준을 훨씬 벗어난 hobbyist 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격이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
다음 문제는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말해보거라~’ 의 단계, 아~ $125 라면 나의 budget 에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아니 무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인가… 이 순간에서 머뭇거리면 이것이 바로 impulse buying으로 후회가 되기도 하니…
드디어 9월의 시작, 이 한 달을 조금이라도 늦게, 천천히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나의 모습을 본다. 어찌 시간을 늦추랴마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10월로의 행군은 천천히 천천히 가고 싶은 나의 심정, 누가 도대체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으랴? 10월이 완전히 지나면 나는 어떻게 지금 겪고 있는 경험들을 다시 재해석을 하게 될 수 있는지, 사실 궁금한 정도를 넘어서 은근히 기다리고 있다. 10월 이후의 나의 심경, 생각의 변화.. .과연 어떤 것일까? 40 여년 동안 고였던 거센 감정의 격류를 어떻게 나는 소화, 처리, 해석, 남길 수 있을까? 하루 속히 이 피하고 싶은 시간들이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이후의 남은 11월, 12월을 생각만 해도 빨리 그곳에 도착하고 싶구나….
- 당시 중고교생들은 일주일 6일 동안 학급봉사를 담당하는 의무, 주번제도가 있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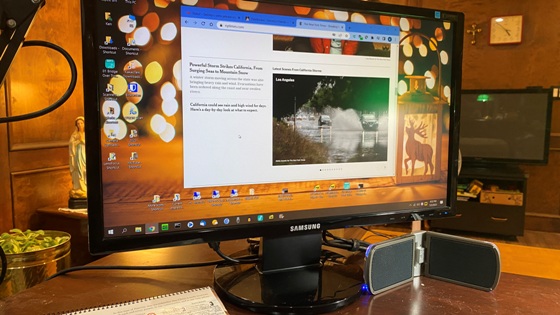 얼마 전 새로니 집에
얼마 전 새로니 집에